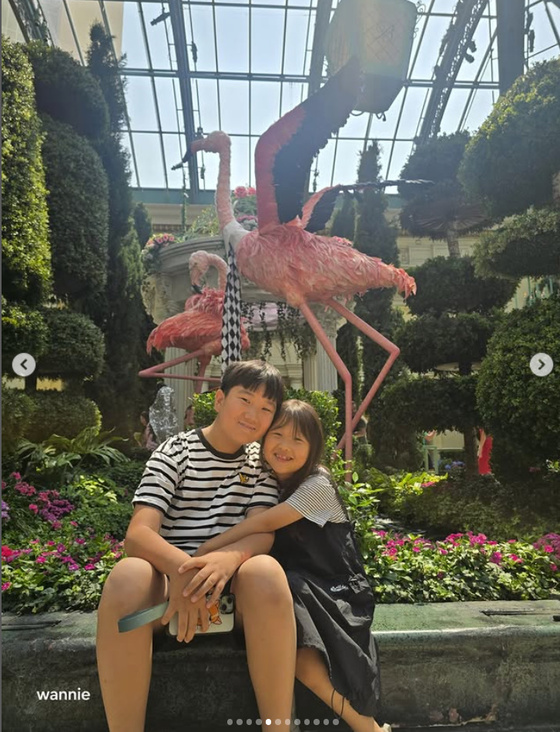16일 오전,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에 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 대책위원회가 설치한 비석이 설치돼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인구 5만명의 작은 농어촌 전북 부안 읍내엔 조그만 기념비 하나가 서 있다. 도로 옆에 놓인 이 비석은 얼핏 보면 경계석으로 착각할 만큼 작고 소박하다. 글씨도 희미하다. 하지만 이 작은 돌 하나에는 20년 전 한국 사회를 뒤흔든 '기후 갈등의 역사'가 응축돼 있다.
부안에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건 2003년 7월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흥분이 채 가시지 않았던 시기였다.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종규 당시 부안군수의 방폐장 유치신청을 받아들여 전북 부안 위도를 원전수거물관리센터 후보지로 최종결정했다. 주민이나 의회 의견 수렴은 없었다.
윤진식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부안을 찾아 현금 보상을 내세웠지만, 핵시설이 전혀 없던 지역에 고준위·중준위 폐기물이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가 군민에게 혼란이었다.
현금성 보상이 보류되자 반발은 봇물 터지듯 나왔다. 어민과 농민, 종교계, 여성회, 학생까지 거리로 나왔다. 정부에서는 수천 명의 경찰 테러진압부대원 병력을 투입했다. 양측이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정치권에서는 정균환 전 민주당 의원과 이종걸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부안 방폐장 반대에 적극 나섰고,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도 해법을 촉구했다.
비판은 정책 내용보다 '절차'에 집중됐다. 주민들이 말한 건 거창한 반핵 이념이 아니라 '왜 지역 당사자인 군민이 모르는 상황에서 일이 진행됐으며, 보상 방안은 왜 계속 바뀌느냐'는 항의였다.
결국 2004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위도 유치계획을 백지화했다. 부안 주민들은 그 시기를 '몸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 식당 주인은 '혼란스러웠느냐'는 질문에 "부안 읍내에서 원자력의 이응, 핵의 히읗도 꺼내지 말라"며 치를 떨었다.
읍내에 '핵 없는 세상, 생명·평화의 부안'이라는 문구의 검은 돌이 세워진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이던 2023년, 김성환 당시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20년이나 지난 일을 떠올리는 것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원전 불가피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 장관 후보자는 "석탄·화력발전 퇴출이 시급하다"며 원전 확대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원전은 기저 전원으로, 재생에너지를 보완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대의 앞에서 원전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에너지 믹스는 정권의 의지이기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과제가 있다. 누가 그 원전을 받아들일 것인가. 폐기물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지역 주민들은 얼마큼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얼마큼 동의할까. 부안이 20년 전 물은 질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속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속도는 절차를 대체할 수 없다. 부안은 그 사실을 한국 사회에 가장 먼저 가르쳐줬다.
모든 전환은 지역과의 협의 위에서 가능하다. 원전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따라오는 방폐물 문제는 결국 정부의 몫이다.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늦어지고 있으나, 야당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장관 임명은 명약관화하다"고 밝힌 만큼, 국민주권 정부 첫 환경부 장관 임명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신임 장관이 될 김 후보자에게 부안의 비석은 오래된 경고이자,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제를 함께 안긴다. 기술보다 민주주의가 앞서야 한다는 상식은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 전문가로서 김 후보자가 반드시 새겨야 할 책무다.

황덕현 경제부 기후환경전문기자 © 뉴스1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