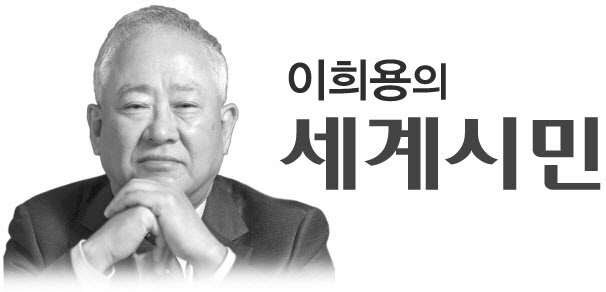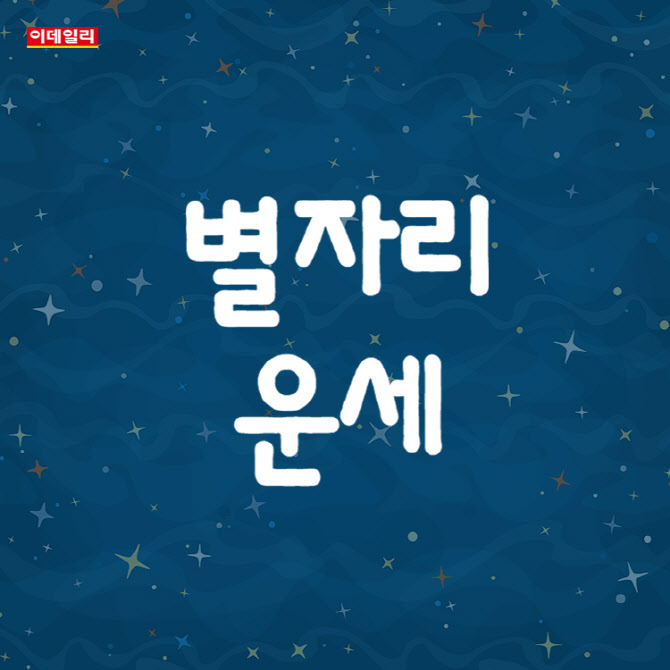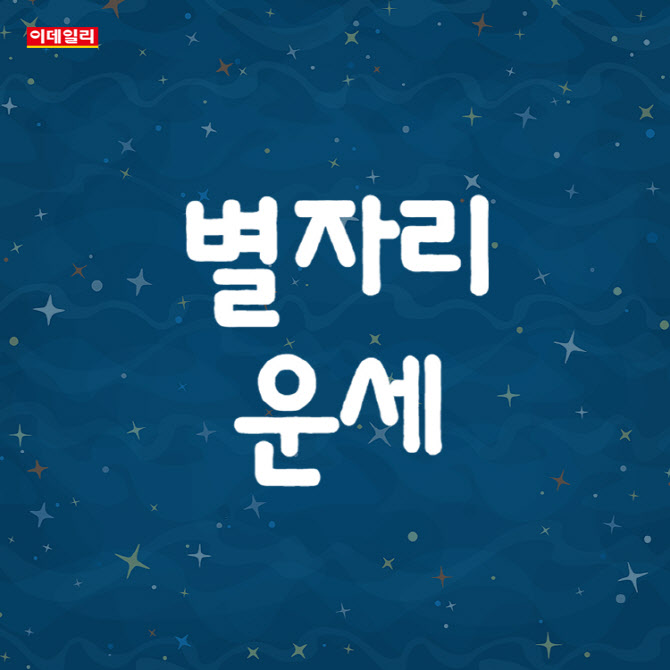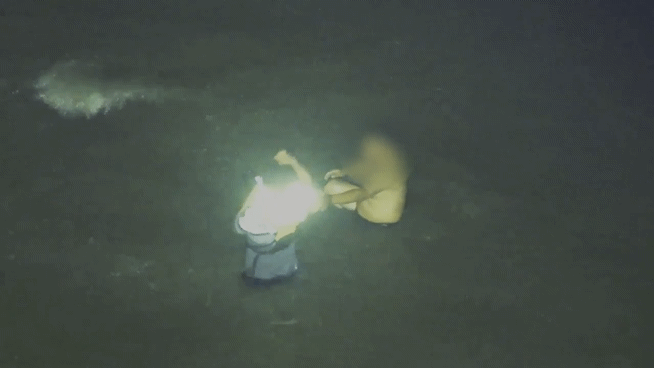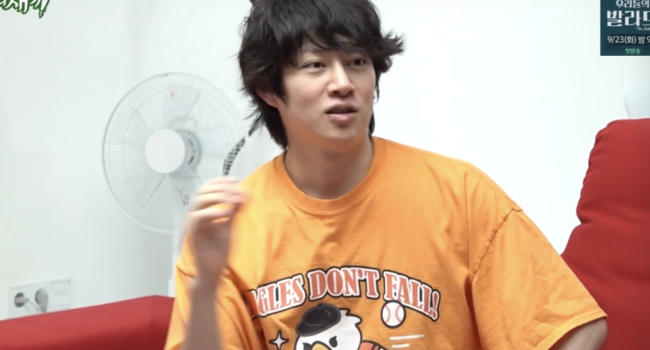용산구에 걸린 태극기와 현수기.(사진=용산구)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일제가 항복한다는 소식을 듣고 탄식했다. ‘백범일지’에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을 준비한 것도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중략) 지금까지 들인 정성이 아깝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었다’고 털어놓았다.
김구의 우려대로 연합국은 한민족의 열망에는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동아시아 전략을 실행했다. 한반도에 38선을 그어 남북한에 미군과 소련군을 각각 진주시키고 신탁통치안으로 분열과 대립을 부추겨 민족의 비극을 불러왔다.
2015년 개봉한 영화 ‘암살’에서 살인청부업자 하와이 피스톨(하정우 분)은 조선 주둔군 사령관과 매국노를 죽이려는 독립군 저격수 안옥윤(전지현 분)에게 “그런다고 독립이 되겠느냐”며 비아냥거린다. 그러자 안옥윤은 “모르지. 그렇지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라고 대답한다.
영화 속 장면처럼 우리 민족은 일제가 한반도 병탄 야욕을 드러낸 19세기 말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한순간도 항일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국내는 물론 중국, 러시아(소련), 일본. 미주, 유럽, 동남아 등 세계 방방곡곡에서 모든 동포가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불충분하나마 광복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1943년 12월 1일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 중국 총통 장제스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한 뒤 “한국민이 노예 상태에 놓여 있음을 상기하며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로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카이로 선언이 아니었다면 일본이 항복한 날이 광복절이 될 수 없었을 테고 3년 만에 정부를 수립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카이로 선언문에서 독립을 언급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장제스가 제안하고 루스벨트와 처칠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련 공산당 서기장 이오시프 스탈린도 카이로 회담에는 불참했으나 선언 발표 전 이란 테헤란에서 미·영 정상을 만나 동의했다.
장제스는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 거사에 감명받은 뒤 줄곧 한국의 독립을 후원하고 지지해 왔다. 의열단원들을 황포군관학교에 입교시켜 독립군 장교로 길러내는가 하면 광복군 창설과 운영도 적극 도왔다. 한국과 중국은 손잡고 일제와 싸운 혈맹이나 다름없었다.
미국도 일찍부터 한국의 독립을 지지했다. 호머 헐버트를 비롯한 한국 선교사 출신들의 노력과 안창호·이승만·박용만 등 재미동포 지도자들의 활약 덕이다. 2차대전 말기에는 중앙정보국(CIA) 전신인 전략사무국(OSS)에서 광복군 대원들을 훈련시켜 한반도 침투 작전을 준비하기도 했다.
영국은 동남아 등지에 보유한 많은 식민지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한국 독립 문구를 넣는 데 반대하다가 중국과 미국의 요구에 떠밀려 조건부로 동의했다. 영국도 1943년 8월부터 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印緬戰區工作隊)와 함께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서 일본과 맞서 싸운 전적을 끝까지 외면하기는 어려웠다.
소련은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민족해방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방하면서도 연방 내 소수민족의 독립 요구는 억눌렀다. 독립군에 대해서도 이중적 태도를 취했으나 항일투쟁의 역사와 성과를 인정했기에 한국 독립을 약속하고 실천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칠 때 샤를 드골이 이끄는 자유 프랑스군도 참전하고 레지스탕스 대원들이 각지에서 호응했다. 우리도 광복군이 한반도 진공 작전을 펼치고 국내 독립운동가들과 합세해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냈다면 좋았겠지만 2차대전 후 식민지에서 그런 사례는 없었다.
강대국은 결코 자진해서 식민국을 독립시켜 주지 않는다.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싸워서 얻어낸 것이다. 광복절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겠다고 다짐하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