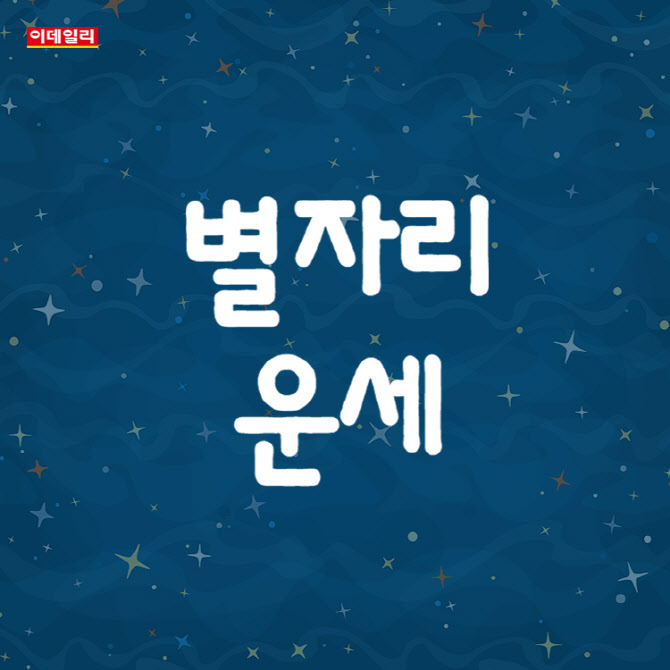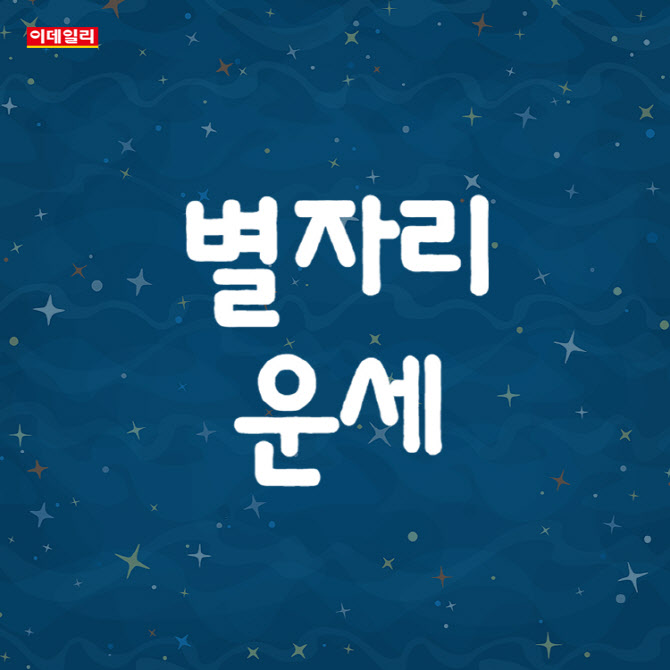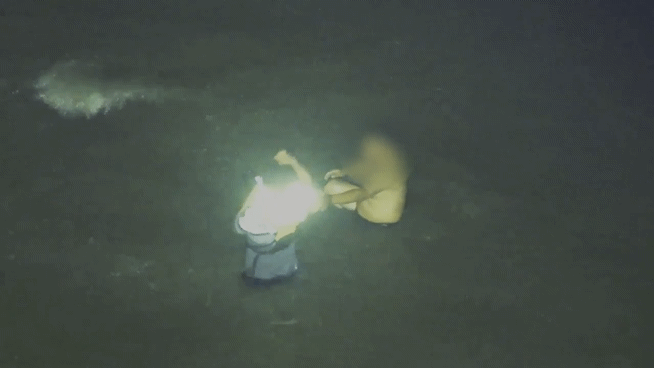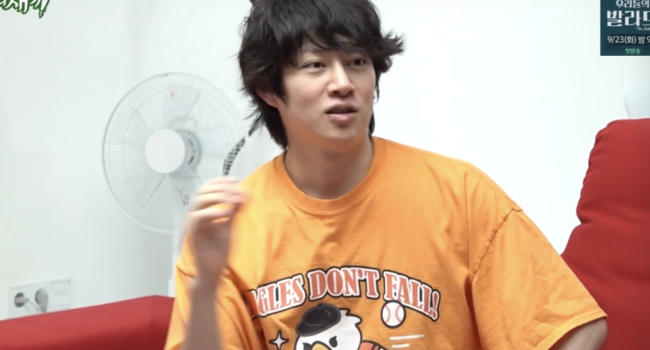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엔 이처럼 고강도 경제적 제재 부과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연간 산업재해로 노동자 3명 이상 숨진 법인에 최소 30억원, 최대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하한액(30억원)은 영업이익이 600억원 나는 기업에 최대(5%)로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와 같다. 영업이익을 이만큼 내지 못하면 사망사고로 사업을 접어야 할 만큼, 중대재해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3명 이상 사망사고를 낸 기업은 9곳이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에 경제적 제재뿐 아니라 중대재해 구조적 원인 해소를 위한 방안, 산재 감축을 위한 노사 참여 강화 및 지원 확대 등을 망라해 담았다.
특히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건설사엔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공사 설계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적정 공기 확보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고 전문기관과 인·허가기관이 심의·검토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발주자에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원청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 발주자는 시행사(원청)에 산재 예방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도급 구조가 많은 건설업 특성을 감안해 시행 원청 역시 시행 하청사에 이 금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별 사업장의 원청 노사만 참여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함께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앞으로는 산업안전 관련 의사결정 시 현장 상황을 잘 아는 하청 노사 의견도 반영하라는 것이다. 50인(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청노동자 사망률이 높은 점(2024년 기준 72%)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은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무 대상을 현행 12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 공사현장으로 확대한다.
◇중앙·지자체 근로감독관 3000명 증원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한(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구체화했다. 중앙 행정력이 닿기 어려운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론 지자체가 감독과 사후조치를 할 수 있게 근로감독권한을 부여하고, 2028년까지 중앙과 지자체에 3000여명의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술직군 채용도 확대해 그 비중을 현행 48%에서 70%로 늘린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직접 감독하는 고위험 사업장을 현행 2만 4000곳에서 2028년 7만곳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엔 3만곳을 맡긴다. 또 민간 재해예방기관엔 영세사업장 51만곳을 관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늘어나는 추세인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산재로 숨지면 지금은 1년간 고용허가제가 제한되는데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건설업의 경우 사업장 단위에서 사업주 단위로 변경한다. 사업장이 다르더라도 같은 사업주 아래의 한 사업장에서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가 시공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을 현행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계획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