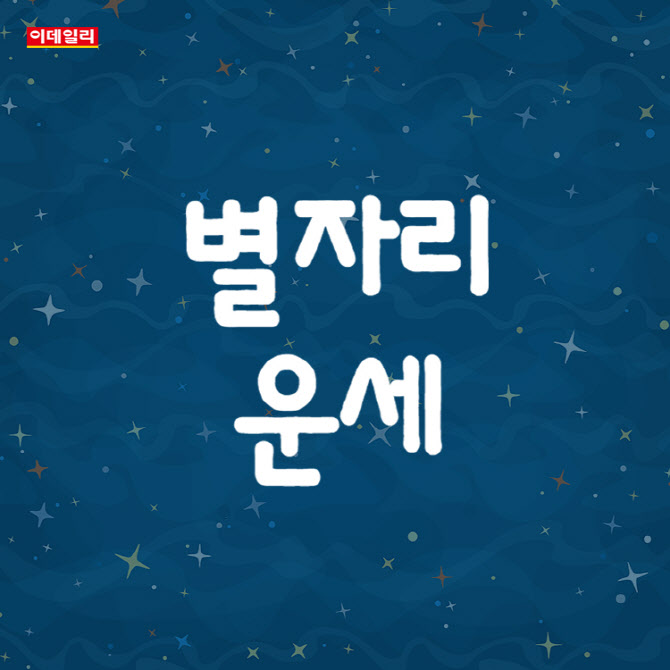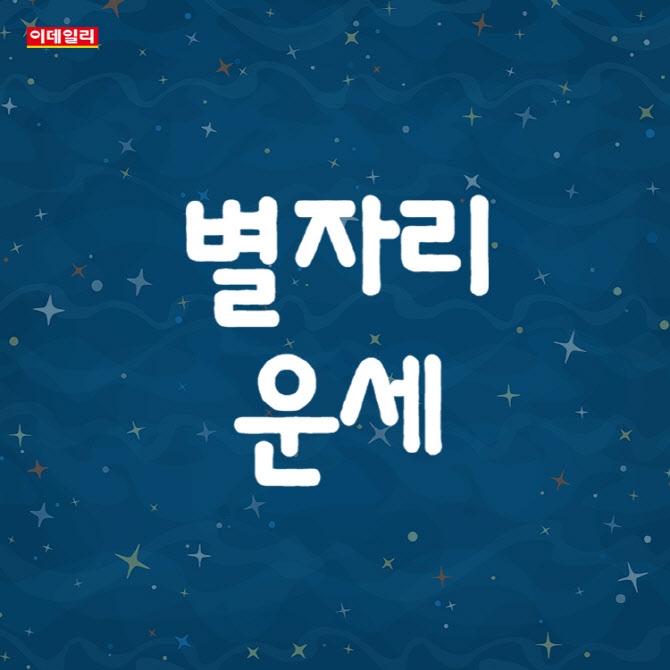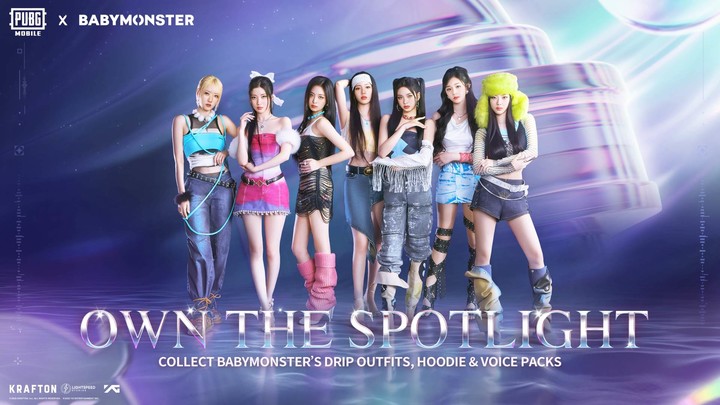많은 사람이 “언제 리더는 무관심해지는가?”를 묻지만,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개인의 흥미 고갈이나 외부 유혹보다 더 큰 원인은 ‘목표의 불일치’다. 리더의 목표가 조직의 목표와 어긋나는 순간, 무관(無關)은 곧 무관심(無關心)으로 번진다.
현장에서 리더에게 목표를 물으면 “승진”, “자리 지키기”, “오래 버티기”가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그것도 목표다. 그러나 리더 고유의 목표는 아니다. 팀원의 목표는 대개 ‘개인 성장’에 가깝다. 실력 축적, 성취감, 보상, 때로는 유연근무나 재택의 극대화가 그것이다.
반면 리더의 목표는 조직의 목표에 훨씬 더 가까워야 한다. 리더십의 언어로 바꾸면, 리더의 목표는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잘 가는 것’이다. 여기서 ‘잘’은 굿바이가 아니라 ‘일을 탁월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리더의 목표가 조직과 어긋나면 문제는 곧바로 ‘권한의 총량’으로 나타난다. 팀원은 쓸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마음을 먹어도 조직 손실이 상대적으로 작다.
그러나 리더는 다르다. 책임과 권한이 클수록, ‘다른 마음(私心)’의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장군 한 명의 일탈은 용사 백 명의 일탈과 차원이 다르다. 내부에 몸담은 채 조직을 해치는 행위, 그것이 바로 배신이다. 목표 불일치가 지속되는 한, 배신의 위험은 상시화된다.
무관심의 다른 얼굴은 ‘생각의 부재’다. 어떤 리더는 출근하니까 출근하고, 회의하니까 회의하고, 일하는 척하니까 일한다. 이런 리더와 함께 일하는 팀원은 곧 깨닫는다. “우리 리더는 조직 생활과 후배 육성에 진심이 없다.” 리더는 조직에서 어른이어야 한다. 나이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다. 어른이 자기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조직은 금세 균열을 드러낸다. 무관심한 리더는 조직의 면역계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바이러스와 같다.
성과 측면에서 무관심의 해악은 더 분명하다. 오늘날 평가는 개인과 팀을 결합해 보상한다. 리더 1명과 팀원 5명이면 리더의 몫은 6분의 1이 아니다. 최소 2분의 1에 가깝다. 리더의 무관심은 팀 성과의 절반 이상을 잠식한다. 그럼에도 많은 리더가 자신의 영향력의 크기를 모른다. 호칭이 기능적으로 바뀌고 연차에 맞춰 타이틀이 붙다 보니, 팀장이 되어도 “달라진 건 팀장 수당과 책임뿐”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리더의 자리는 곧 ‘팀 성과 레버리지’의 자리다. 다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조직이 리더를 그 자리에 앉혔다면, 리더는 자신이 무엇으로 팀의 결과를 ‘다르게’ 만들 것인지 매일 묻고 답해야 한다. 관심은 곧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곧 판단과 실행으로 환산된다. 팀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일, 핵심 목표를 팀 언어로 번역하는 일, 팀원의 동력을 보강하는 일,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팀의 진행 방향은 달라진다. 반대로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아무리 많은 회의를 열고 메시지를 보낸들 성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무관심은 때로 ‘합리적 냉소’로 포장된다. “현실이 원래 그래요.”, “윗선이 안 바뀌면 뭘 해도 무의미합니다.” 이런 말은 현명해 보이지만, 사실상 책임 회피의 언어다. 리더의 언어가 변명으로 버뀌면, 팀은 가장 먼저 그 리듬을 잃는다. 그래서 리더의 첫 번째 과제는 냉소를 이기는 것이다. 작은 승리를 설계하고, 팀에 맞는 페이스를 정하고, 성과의 의미를 함께 해석하는 일. 관심은 이렇게 ‘의도된 구조’로 전환될 때 비로소 지속된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세상 일의 결과는 고민의 양에 비례한다. 리더가 성과를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면, 성과도 동일하게 줄어든다. 반대로 리더가 ‘팀과 일’을 100번 생각하고 10번 메모하고 1번 글로 정리하면, 팀은 그만큼 방향을 얻는다.
리더의 무관심은 구명튜브에서 바람을 빼는 행동과 같다. 표면은 멀쩡해 보이지만, 정작 빠져나갈 때가 되면 아무도 잡고 떠오를 수 없다. 오늘 당신의 팀에 공기가 빠져나가고 있다면, 그 시작점은 대개 리더인 당신 마음의 한복판이다. 관심을 다시 채워 넣어라. 목표를 정렬하고, 생각의 밀도를 높여라. 그때 비로소 팀은 다시 부력을 얻고, 조직은 진공에서 벗어난다.
■문성후 대표 △경영학박사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연세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