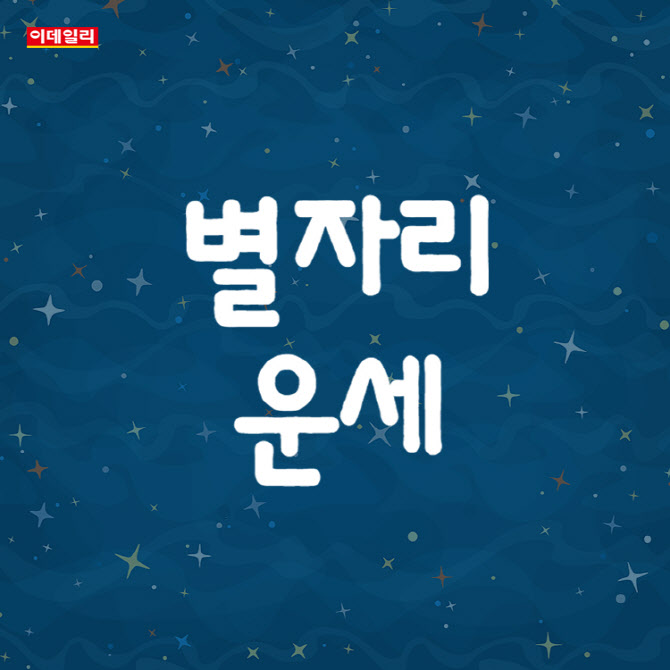지난해 한 지방 보건지소에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의정갈등으로 공보의를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 발생해 격일 진료하는 보건진료소가 늘었다. (사진=안치영 기자)
현재 수도권 외 지역 대부분은 인구가 감소하거나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해 앞으로 30년 내 소멸 위험이 큰 지역을 소멸위험지역이라고 하는데 올해 기준 전국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한다.
지역 소멸은 비단 의료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 일자리 부족, 수도권과 지방 인프라 격차로 말미암은 수도권 집중 현상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나마 의료 시스템은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큰 편이다. 당정은 최장 10년간 의사 근무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지방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의사만 있다고 그 지역이 살 만한 곳으로 변하진 않는다.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고 일자리도 있어야 하고 교육·교통 인프라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돼야 한다. 하다못해 병원에서 근무할 직원과 간호사가 없다면 의사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의사도, 환자도, 간호사도 사람이다. 사람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사 혼자 ‘근무하러 오는’ 지역이 아니라 ‘가족 모두 살고 싶은’ 지역이 되는 것이 지역의사제와 지방 살리기의 목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