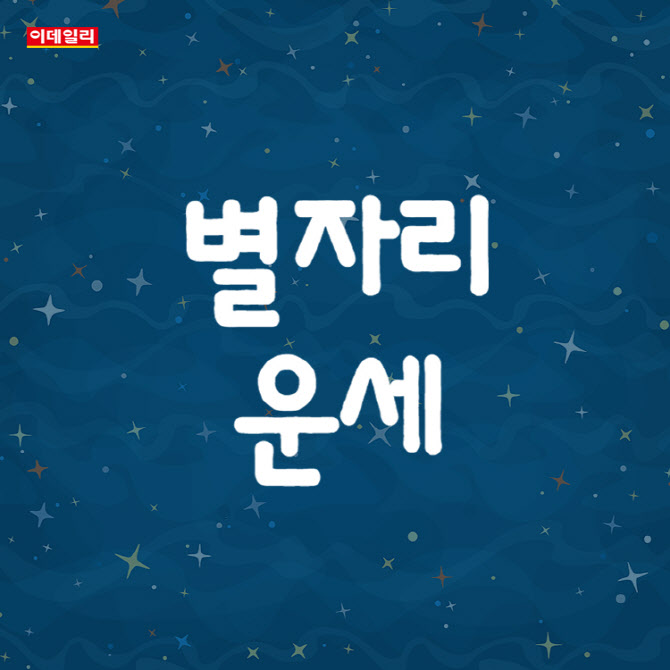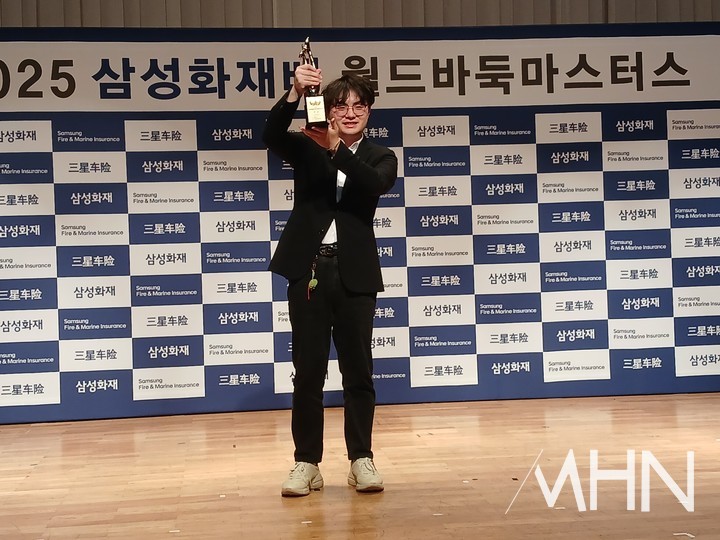신경차단술은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과 주위조직에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 치료 약물을 주입해 통증 신호를 보내는 신경 전달 통로를 차단하는 의료기술이다. 통증을 줄이고 신경 주변의 염증, 부종을 개선하는 치료 방법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신경차단술은 대개 정형외과 의원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서 많이 시행한다.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찾아오면 의사는 수술적 치료에 대한 부담이 적고 간편한 신경차단술을 으레 권한다. 심지어 이러한 신경차단술은 건강보험이 15회까지 적용돼 환자에게 비용적 부담도 적다.

부위마취 설명 이미지. 틍증클리닉 등에서는 투여하는 약물과 그 농도를 조절해가며 기본적인 통증 치료 방법의 하나로 사용하기도 한다. (자료=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일부 의료진은 신경차단술 등의 보존적 치료를 진행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빠르게 수술을 시행해야 하는데 수익적인 요소를 고려해 끝까지 치료를 고집하는 경우도 있다. 의료진 각자의 의료적 판단에 대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와 환자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의료계 내에서도 이를 비판하기가 어렵다. 환자 또한 의료기관을 옮기며 건강보험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는 사례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어깨 수술을 예로 들면 원래는 간단하게 내시경으로 봉합술을 하면 될 치료를 3~4년 동안 환자에게 주사만 놓고 있었다”면서 “결국 관절이 다 망가져서 인공 관절을 해야 하는데 모두 따졌을 때는 10배~20배 이상 사회적 기회 비용이 들어간 셈”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렇게 동네서 간단한 수술을 하는 의원이 줄어들면서 근골격계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경증 수술이라도 최소 전문병원으로 가야 한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은 죄다 통증 치료만 하고 있어 종합병원 대부분이 마취 전문의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 마취 전문의 업무량 증가로 인해 중증 환자 수술 또한 차일피일 미뤄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면 주사 치료만 하는 정형외과·통증의학과 동네 의원에서 신경차단술로 벌어들이는 돈은 지난해 기준 약 2조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건강보험 지출액이 약 102조 원으로 전망되는데 시술 하나가 전체 지출액의 약 2%에 달한다.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선 결국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의사도 필요하지만 중증 환자를 위해서는 마취 전문의가, 뼈가 부러졌을 때 수술할 수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필요하다. 꼭 필요한데 처우가 낮아 의사들이 외면하는 치료 방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필수의료를 살리려는 정부의 의지와도 일치한다. 의료계 또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의료계 내에서 정형내과를 자조적인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눈 앞의 이익만 쫒다간 결국 명분도, 실리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