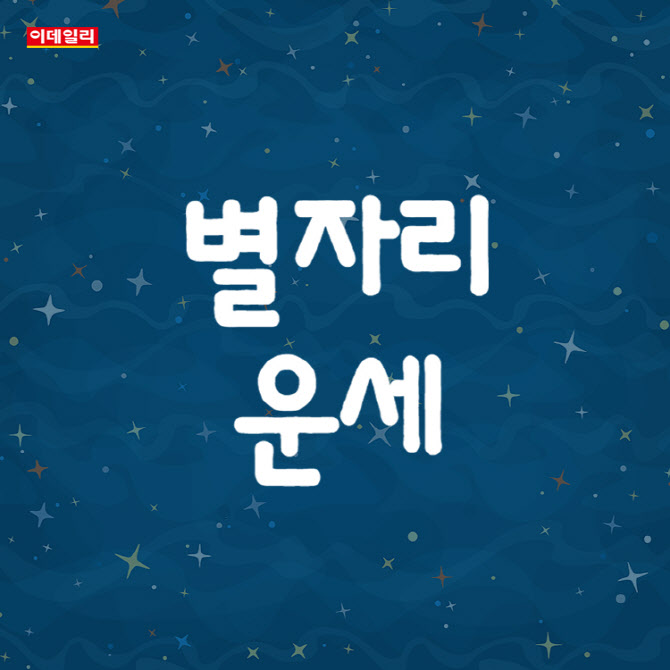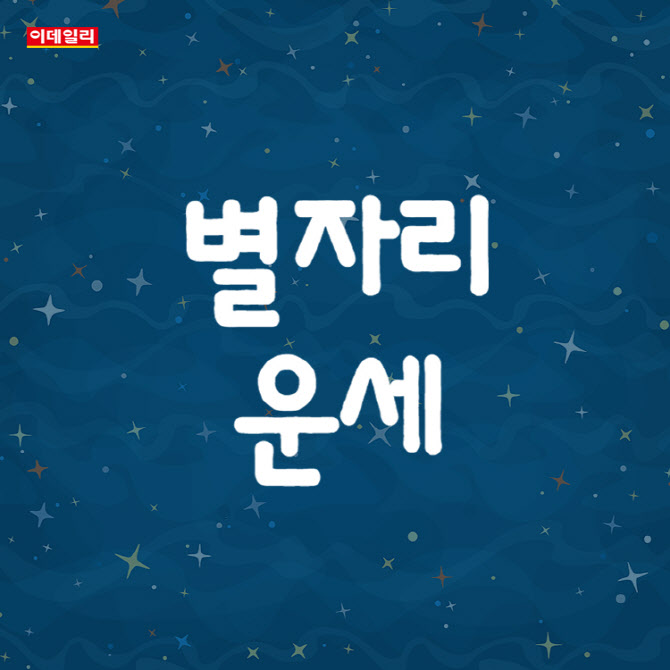구급차. (사진=연합뉴스)
소방당국은 16분 뒤인 오전 6시 33분께 현장에 도착했으며 당시 학생은 심한 발작 등 간질 증세를 보였다. 다만 이름을 부르면 반응할 정도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급대원은 이송 단계의 중증도 기준(Pre-KTAS)을 5등급 중 ‘긴급’인 2등급으로 분류한 뒤 학생의 증세를 고려해 신경과가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연락했다.
그러나 권역응급의료센터인 해운대백병원, 동아대병원을 비롯해 양산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 등 4곳은 모두 소아신경과 배후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
이후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직접 나서 동아대병원, 부산백병원, 해운대백병원을 포함해 부산대병원, 동의병원, 고신대병원과 경남 창원에 있는 창원한마음병원 등 8곳에 요청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 사이 구급차 안에서는 1시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결국 학생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구급대원은 Pre-KTAS를 ‘소생’에 해당하는 1등급으로 상향한 뒤 오전 7시 30분께 당시 가장 가까웠던 대동병원으로 향했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가장 가까운 병원은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하지만 병원 의료진이 학생의 옷을 벗겨 정밀 확인한 결과 꼬리뼈 주변에 심한 외상이 발견됐다.
학생은 시민 신고 전 이미 크게 다쳤던 것으로 추정되며 외상은 옷 아래 가려져 있어 현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학생은 끝내 숨졌으며 유족 요청에 따라 부검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이 제시간에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둘러싸고 상반된 해석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가 병원에 어떻다고 말했는지가 중요해 보인다”며 “심정지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현장에서 기도 삽관 등 처치를 하며 즉시 이송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급대가 외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원도 환자의 긴급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외상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만큼 응급실에 먼저 이송됐던 게 중요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의 경우 환자와 소통이 어려운 데다가 심한 간질 증세를 보여 환자의 옷을 벗기고 나서야 외상이 발견됐다.
현장에 있는 구급대원이 환자 증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만큼 인력과 장비가 제대로 갖춰진 병원에 우선 이송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