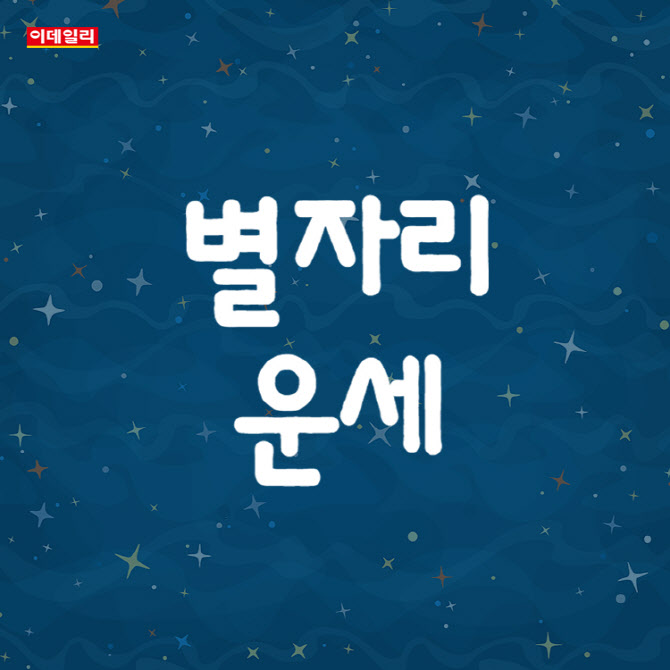(사진=연합뉴스)
이와 달리 공무원은 PTSD와 같은 정신적 질환은 물론 공무상 발생한 재해(공상)를 전부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공상 업무 담당자가 단 6명에 불과하고, 공상 조사관은 전무한 탓이다.
1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가 공무상 재해(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기준) 신청을 받아 처리한 건수는 2021년 6538건에서 2024년 9892건으로 51% 늘었다. 그러나 재해보상심사담당 부서에서 안건 검토 및 자료 보완을 거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상정하는 업무 담당자는 같은 기간 6명으로 동일하다. 정원은 4명으로, 그나마 파견 나온 2명을 더한 수치다.
민간의 산재 담당자와 비교하면 공상 업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민간은 근로복지공단의 전국 지사에 산재 신청을 하면, 지사의 재해심사 조사관이 직접 조사에 나선다. 공단의 재활보상부 정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1662명이며 이중 조사관은 약 950명에 달한다. 이들 조사관이 재해 근로자의 재해 입증을 위한 조사를 벌인다.
조사 결과는 질병의 경우 임상의, 직업환경의확과 전문의, 노무사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에 상정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 판단 자료로 쓰인다.
반면 공무원은 근로복지공단처럼 재해 조사를 해주는 직원이 없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공상 신청을 받지만, 제출 자료를 확인하는 수준이다. 공무상 재해를 입증하는 것은 재해 신청자 본인의 몫이다.
문제는 최근 들어 정신적 질환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공상 조사관이 전무한 탓에 이마저도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정신질환과 관련한 공무상 재해 처리 건수는 2021년 258건에서 지난해 578건으로 124% 증가했다. 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PTSD만 해도 본인이 겪은 상황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데 개인에겐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민간에선 사고를 목격해 PTSD가 생기면 사고를 목격한 점만 입증해도 산재 처리가 되지만, 공무원은 사고 목격과 PTSD 연관성을 비전문가인 공무원 개개인이 입증해야 하는 셈이다.
소방공무원들이 참사 트라우마를 겪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도 이러한 환경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난 7월 이태원 참사 당시 투입된 경남 고성소방서 소속 40대 소방관이 공무상 요양 불승인 판정을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8월엔 이태원 현장에 출동한 후 우울증을 앓던 인천소방서 소속 30대 소방관이 실종 10일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공상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산재전문 한 노무사는 “우정직 공무원 유족급여 신청을 대리한 적이 있는데, 자료 보완 요구 등이 상당히 미흡했다”며 “지금과 같은 프로세스로는 공상 처리 결과에 대한 승복 비율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 조직을 확충하든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노무사는 “초기에 입증 자료를 모아 제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민간은 재해심사 조사관이 자료를 누락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며 “공무원 공상 조사관이 없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