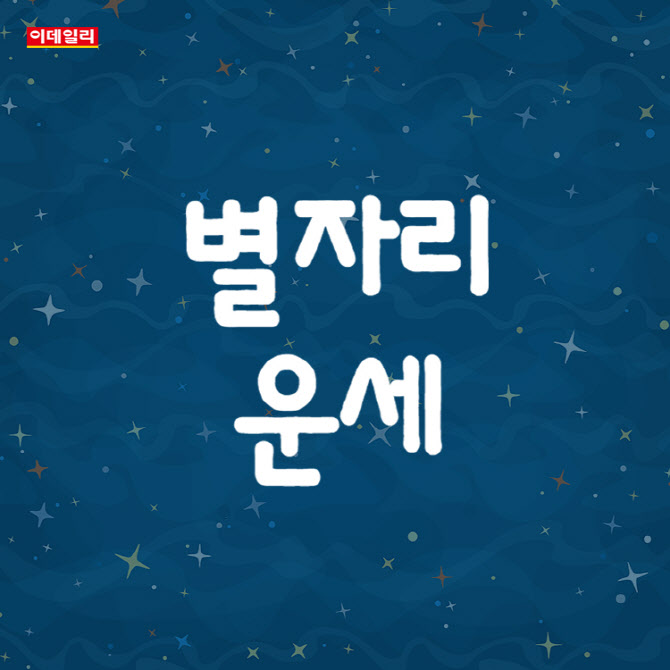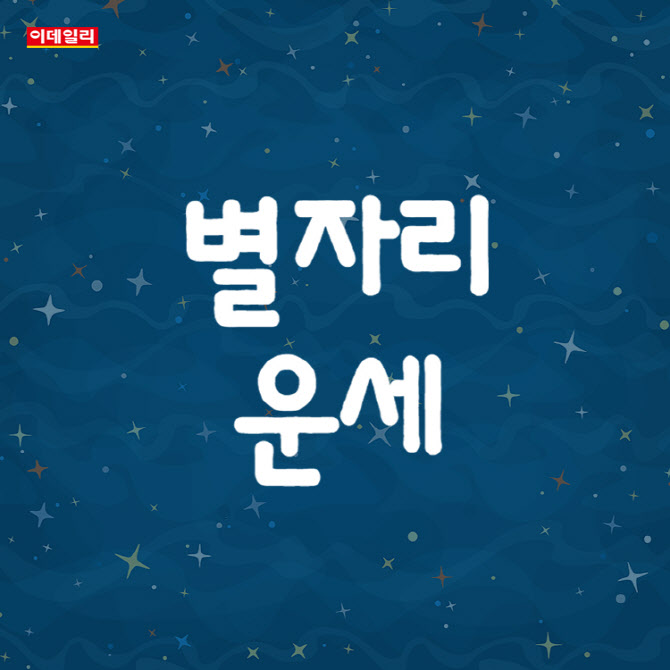그렇다면 이 세대의 현실은 어떨까.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세대의 평균 자산은 약 7억5000만원, 그중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집값 상승으로 장부상의 자산은 커졌지만 정작 손에 쥔 ‘현금’은 부족하다. 연금·이자·배당 같은 노후 소득원이 전혀 없는 응답자는 39%에 달한다. 자산 1분위(하위 20%)의 부채비율은 79%로 재정건전성도 취약하다. 부동산 비중이 지나치게 크고, 노후 현금흐름은 부실하고, 부채는 무겁다.
낀 세대로서의 부담은 더 크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생존 인구는 약 615만 명, 전체의 12.2%다. 대부분 50대 중반의 가장이다. 이들 가운데 79%는 자녀 또는 부모를 부양하고, 24%는 양쪽 모두를 부양한다. 가족부양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퇴직 후 소득이 갑자기 끊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김 부장의 이야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한 가정을 넘어 세대 전체,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쉽게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미리 준비했어야지.”
“왜 대비를 안 했어?”
물론 개인의 책임이 전혀 없지는 않다. 하지만 문제를 조금 더 차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2차 베이비붐 세대가 흔들리면 그 여파는 가족을 넘어 국가로 번진다. 가장의 소득이 끊기면 소비가 줄고 내수가 위축된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대규모 조기퇴직이 사회적 부담으로 바뀐다.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 중심의 재무구조가 흔들리면 자산가격의 급격한 하락도 올 수 있다. 김 부장 한 사람의 이야기가 곧 한국 경제 전체의 미래와 연결되는 이유다.
“그래도 서울에 집 한 채 있잖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현재만 보고, 부분만 보고, 절대 비교만 하는 사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나보다 휠씬 사정이 좋잖아’라며 비교할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사회 전체의 영향을 판단하고 상대적 비교 속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퇴사한 뒤 집으로 돌아온 김 부장은 부인에게 말한다.
“미안해.”
무엇이 미안했을까. 지금까지 일만 했던 삶이? 앞으로 돈을 못 벌어준다는 사실이? 앞으로 이런 미안함을 말해야 하는 가장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답을 해줘야 할까.
“김 부장님, 미안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았고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말해주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진짜 대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