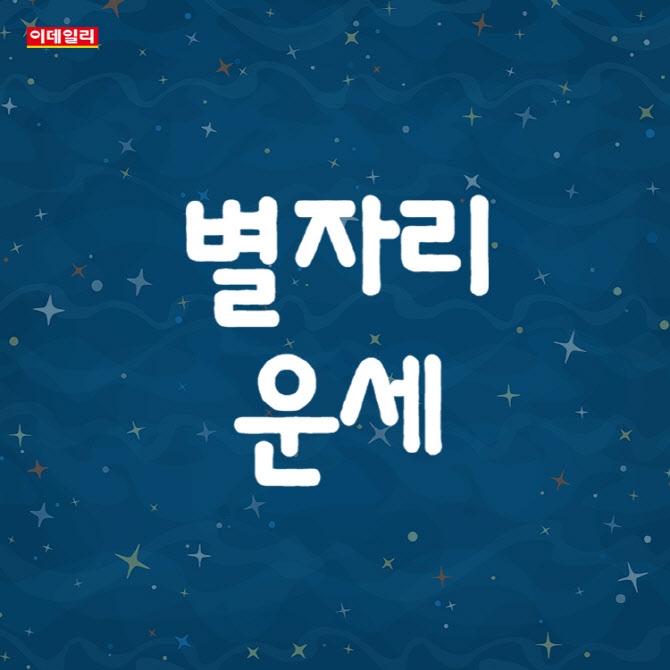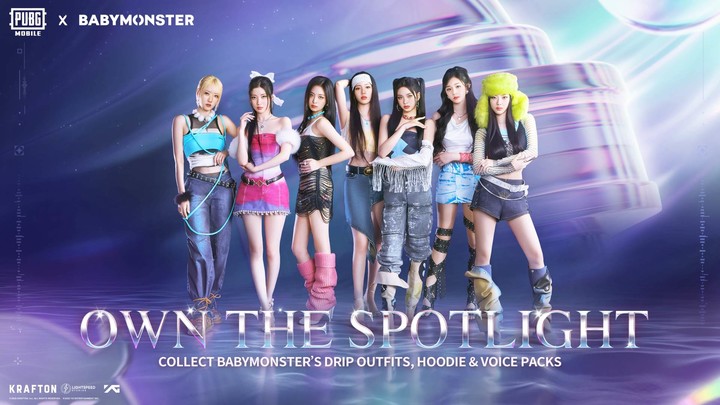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김우성 비서관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김 비서관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만나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다"고 회상했다. 외교부에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땐 가족들이 받은 납치 피해 연락이 오히려 스캠(사기)일 수 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가족들이 그간 연락받은 내용들을 보니 납치가 사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비서관은 일단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보기로 했다. 실종자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정리하고, 종이를 한 장 꺼내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도식도를 그렸다.
원내대표 비서실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일하며 쌓은 인적 네트워크도 총동원해보기로 했다. 외교부를 통해 현지 영사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현지 경찰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신고 가족과 정부 기관을 연결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전화 통화를 하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사건 접수 사흘 만인 8월 9일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산 일대 범죄 단지에 대한 현지 경찰의 급습이 이뤄졌다. 건물 안에는 신고자를 포함해 한국인 14명이 감금돼 있었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작전이 이뤄진 배경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박찬대 의원실이 있었다.
한국인 14명의 생명을 구했지만 김 비서관에게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후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대학생 박 모 씨(22)가 14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이뤄졌던 그 범죄단지에 감금됐었던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박 씨는 구조 작전 하루 전날인 8월 8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김 비서관은 "단 하루만 더 빨랐어도 구할 수 있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라며 "죄책감이 오래 남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구조 작업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자, 의원실 제보가 쏟아졌다. 전화가 몰려 다른 업무를 못 볼 지경이었다. 제보 중 1건은 현지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1차 구조가 실패한 경우였다. 범죄조직들은 자신들이 쫓기고 있다는 걸 의식해 사무실을 옮기기도 했다.
김 비서관은 다시 피해자들과 접촉했다. 범죄조직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이메일 계정의 '내게 쓴 메일' 기능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들의 위치를 추적했다. 피해자는 '태극기에 담긴 빨간색과 파란색의 수건을 창가에 걸어뒀다'는 힌트를 남겼고 결국 지난 9월 30일 2명을 추가로 구출할 수 있었다.
연속된 구조 작전은 김 비서관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그는 "밤 11시, 새벽 7시에도 전화를 받을 수 있어야 했다"고 전했다. 당시 김 비서관의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과 재활치료센터를 오가던 중이었다. 그는 "입원 수속이나 간병을 도와드려야 하는데도 캄보디아에서 전화가 오면 부모님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구조 상황부터 보게 됐다"며 "지금도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라고 털어놨다.
'이번 일에 왜 그렇게 열심이었나'고 묻자, 그는 피해자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가족분들에게는 1분 1초가 생지옥이었을 것"이라며 공직자가 국민을 대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 역시 '이건 내 가족의 일'이라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비서관에게 이번 구출 작전은 6년여 간의 국회 생활 중 가장 잊지 못할 경험이 됐다. 특히 "구조된 가족분들께서 울면서 전화를 주셨던 때"가 기억난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이번 작전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던 점은 괘념치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의원님의 권한을 제가 잠깐 위임받아서 일을 한 것일 뿐"이라며 진정한 영웅은 현장에서 즉각 조치에 나서준 공무원들이라고 공을 돌렸다.
아버지를 제대로 간호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캄보디아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 아들이 고생했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김 비서관은 전했다.
김 비서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 언론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찬대 의원실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영사조력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김 비서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과 보좌진이 국회 경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들을 뚫는 데 앞장섰다. 그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9월 국회의장 공로상을 받았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