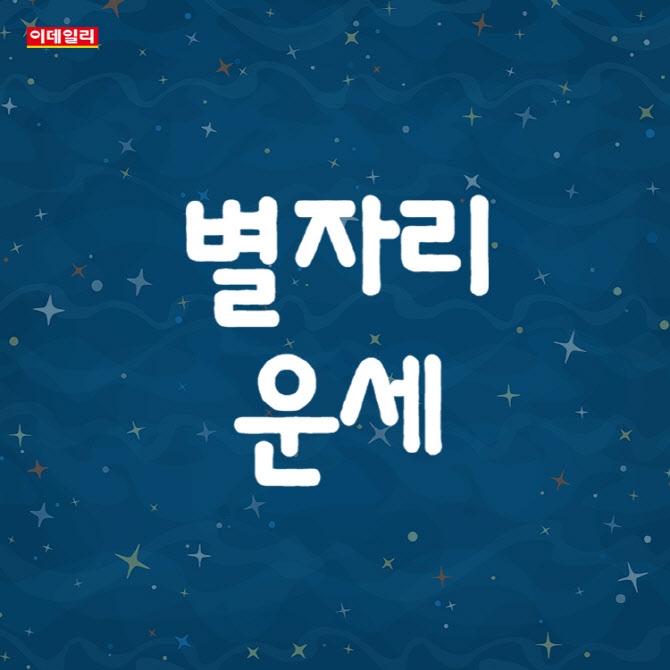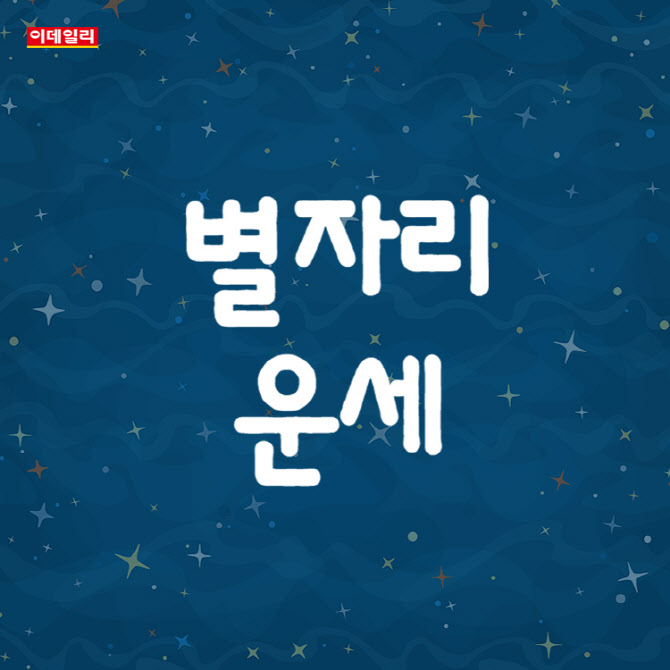© News1 DB
직장갑질119가 정리해 23일 발표한 '직장 내 손해배상 판단 5문 5답'에 따르면 회사 측이 사회 초년생이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강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직장갑질119는 "사전 손해배상 약정을 쓰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고, 설령 노동자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사용자 관리·감독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며 "하지만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사용자의 요구대로 실제 과실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금액을 배상하기도 한다"고 짚었다.
직장갑질119는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갑자기 그만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엔 우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사직 절차 관련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등 사직 절차 관련 규정이 있다면 노동자가 이를 따랐을 시 회사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근로계약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직 관련 규정도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가 사직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해지된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음은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경우, "회사가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서면 요구가 왔을 시 '본인은 인정할 수 없고, 본인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할 것"을 추천했다.
회사와 거래처 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직원에게 책임 소재가 있다며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라고 하는 경우는 "직원의 고의나 무거운 과실로 거래처와의 분쟁이 생긴 것이 아니라면 비용 청구는 어려울 것"이라며 "변호사 비용은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원 실수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서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서명을 우려하는 경우에 관해선 "법원은 노동자가 손해 전부를 사용자에게 배상하기로 하는 각서나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손해 전액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그런 각서나 서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책임은 일정 한도로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면 그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 법적 다툼을 해야 하므로,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수정을 미리 요청하는 게 좋겠다"고 부연했다.
양현준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일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도 있고, 계약기간 중 사직한 경우에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