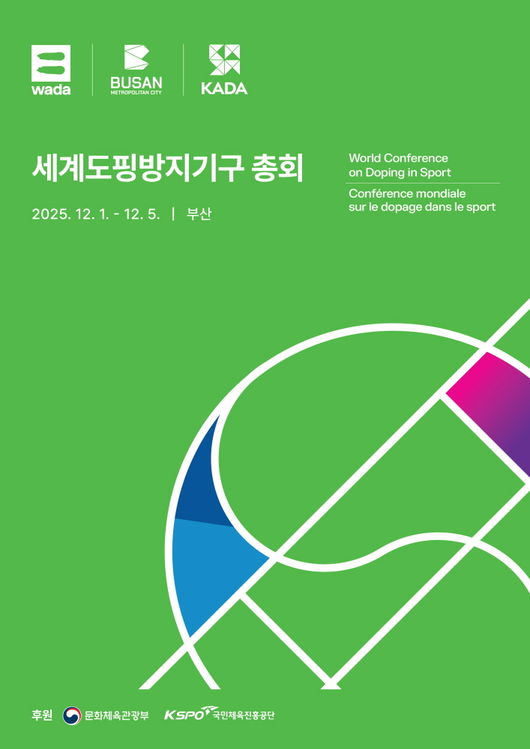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A씨는 현역병 입영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했다. A씨는 2019년 11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해 7급 재검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후 2020년 6월부터 대구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의사들에게 “집 밖을 잘 못 나갔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면 긴장된다”는 등 우울증과 사회공포증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
A씨는 의사로부터 ‘우울장애 의증(의심되는 증상), 사회공포증 의증’ 진단을 받아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했다. 2021년 2월 규칙적 약물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7급 판정을 받자, A씨는 그해 9월까지 병원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약을 거르지 않고 먹었다”, “약은 꾸준히 먹는데 변화를 못 느끼겠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그 결과 A씨는 2021년 9월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최초 병역판정검사 이전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한 적이 전혀 없었다. 초·중·고교 시절 학급 회장과 반장을 역임했으며 교우관계도 원만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편의점과 PC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계속했고, 대학 진학 후에도 신문방송 및 경영컨설팅 동아리에 가입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다.
특히 A씨는 2021년 2월부터 9월까지 13회에 걸쳐 약물 처방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1회만 조제받았다. 총 22회 처방 중 14회는 약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의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질환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신과 진료의 특성상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기초해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A씨는 이를 악용했다”며 “약물 처방을 계속 받으면서도 대부분 조제받지 않았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의사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휴대폰 분석 결과 친구들과 “공익 최대한 가려고 병원 엄청 다니고 있다”, “6개월 이상 진료기록이 필수”라는 대화를 나눈 점도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봤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A씨 측은 2심 과정에서 “실제로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겪었으며, 증상 호전을 느끼지 못해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확인신체검사를 거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는 2019년 11월 병역판정검사 이전 친구와의 대화에서 ‘정공(정신건강의학과 공익근무요원) 할까?’, ‘신검받을 때 심리검사 이상하게 해봐라’는 등 계획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4급 판정을 받은 직후인 2021년 12월 매형에게 ‘4급 공익 나왔어요. 공무원 붙으면 근무하다 다녀오려구요’라고 말했다”며 “공무원 업무를 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우울이나 불안증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확인신체검사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병역법 시행령과 병무청 훈령에 따르면 사실관계 조사 후 확인신체검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며 “병무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위반죄 성립,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