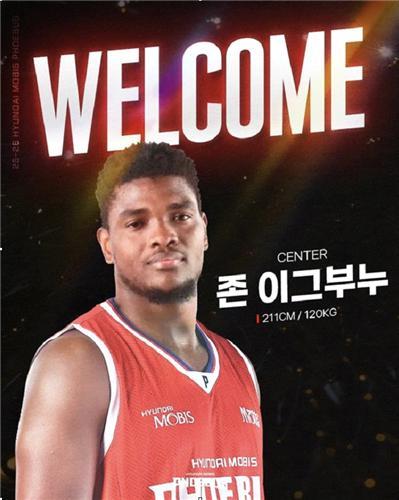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전 총리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저는 1970년 경제관료로 입직해 한평생 공직의 길을 걸었다”며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줘,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길 끝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순간에 대한 기억과 맥락도 없고 분명치 않다”고 토로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결정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었으나 막을 도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그날 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했는지 스스로에게 다시 물었다”며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히 추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날 밤 혼란했던 기억을 복기하면 할수록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쳤다고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며 “그동안 저를 믿어주신 국민들에게, 저의 모든 어려운 순간을 함께한 가족·동료·공직자에게 부끄러워, 얼굴 들기 어려워 황망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이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 강조하며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