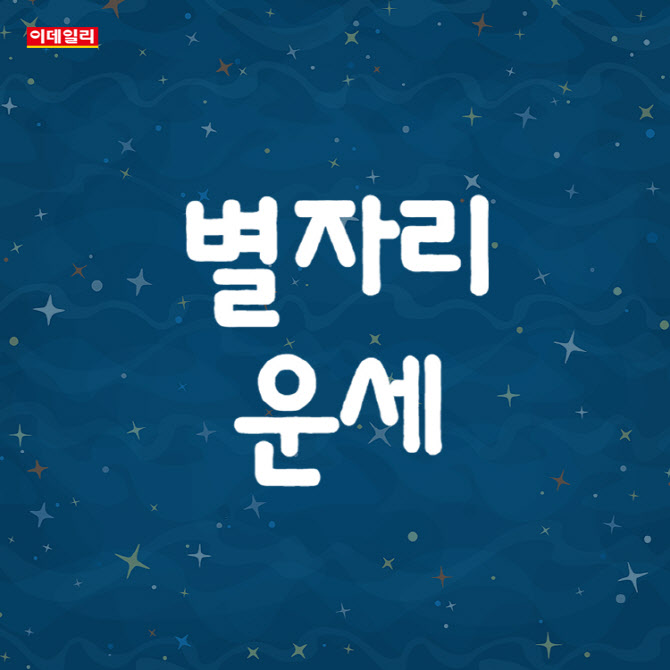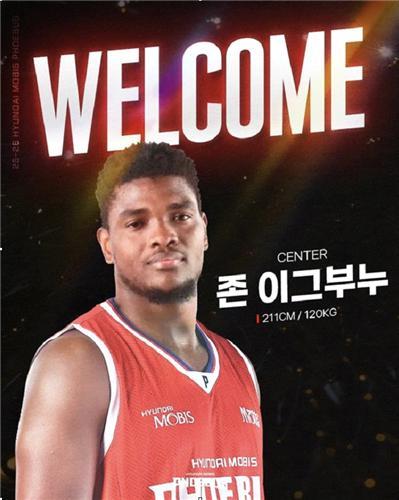(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이후 공수처는 내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군 인력이 막아서면서 대치 끝에 집행하지 못했다. 이후 공수처는 올해 1월 7일 법원으로부터 2차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행위가 헌법 66조와 77조에 의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1월 6일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주체는 공수처장이 아닌 공수처 검사 차정현으로, 공수처장에 대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헌재는 “이 사건 행위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후속 조치들은 모두 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돼 있고 권한대행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시점에 발생했다”며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계엄선포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체포영장 청구·발부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며 “체포영장 청구·발부는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비상계엄은 12월 4일 국회의 해제 의결을 통해 당일 해제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4월 4일 탄핵 인용 결정을 받아 파면돼 조만간 계엄 선포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히 예상된다거나 그 행사가 시간적으로 충분히 구체화된 경우로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로 사건을 다툴 실익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취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