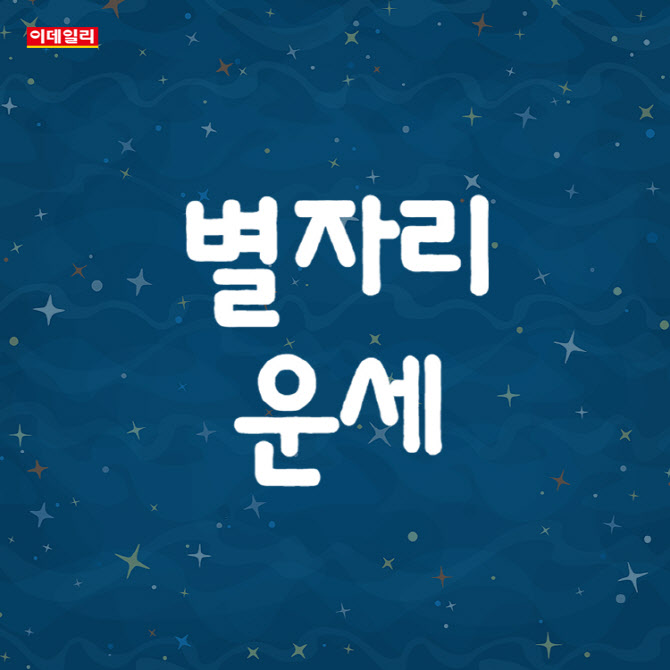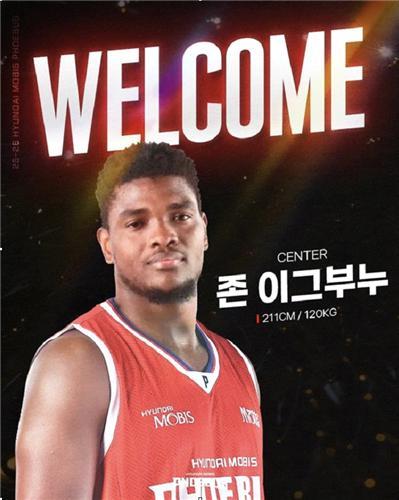팔당 상수원보호구역.(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 남양주시와 지역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불합리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심판 청구 5년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는 27일 남양주시 수도법 7조 6항과 시행령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이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상수원보호구역의 허가 대상 건축물 종류와 행위 등 허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다.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 3명과 남양주시는 조안면 일대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2020년 10월 27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부는 지난 1975년 7월 수도권 시민에게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며 경기 남양주·하남·광주 지역 일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에 해당하는 42.4㎢가 포함됐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으로 거주 목적이나 경제활동을 위한 건축물·공작물 설치 규제를 받는다. 주택 면적도 100㎡로 제한된다.
심판을 청구한 주민 장 모 씨는 2018년 조안면에서 딸기 가공 시설을 지으려다 허가를 받지 못했다. 김 모 씨는 숙박업을 하려다, 허 모 씨는 자신의 주택을 음식점으로 변경하려다 모두 거절당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주민들은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수도법과 시행령이 아니라 법령이 위임한 조례와 규칙의 구체적 집행에 따라 발생했다는 취지다.
헌재는 법 시행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지만 주민들은 관련 조례 시행 이후 1년 넘게 지나서야 청구했기에 효력이 없다고 봤다.
남양주시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헌재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