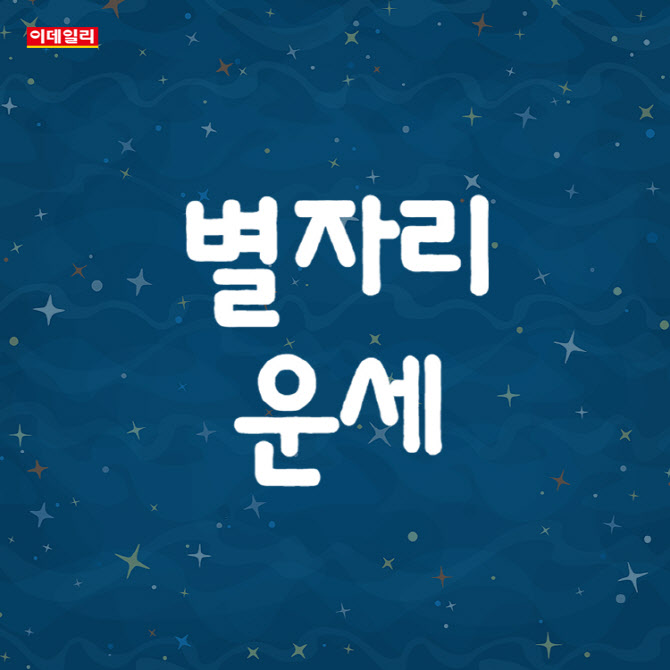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27일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개최된 ‘AI시대, 청소년이 만들어가는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 정책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성평등부)
현장에서는 디지털 환경 변화가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맞물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기존 대응 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특히 온라인에서 즉시 보상 구조가 강화된 점이 핵심적 변화로 꼽혔다. 숏폼과 알고리즘 추천, 실시간 알림 등과 같은 즉각적인 자극이 반복되면서 뇌가 빠른 보상에 익숙해졌고, 그 결과 오래 집중해야 하거나 천천히 깊은 사고를 해야하는 활동을 어려워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비대면 소통이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직접 읽는 경험이 줄어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는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사회적 규범을 익히는 과정까지 약화시키며, 결국 시민성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재신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학생들이 실제 공부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10분에 한 번 스마트폰을 집어든다”며 “오프라인 중심으로 논의해온 기존 시민성 개념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재정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AI의 일상화로 청소년의 판단 과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현실감을 높인 초실감 기술과 자동화된 추천 시스템이 정보 선택 시간을 줄이고 판단 기준을 알고리즘에 의존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에 AI 환경에서 필요한 시민성은 데이터 흐름과 알고리즘 구조를 이해하고 기술 수용 범위를 스스로 결정하는 역량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묘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대표는 “기술이 앞설수록 인간다움은 교육이 지켜야 한다”며 △아날로그와 디지털 경험을 병행하는 교육 △콘텐츠 분석 활동 △국제 협업 프로그램 △데이터 주권 교육 등을 실천 방안으로 소개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AI 시대, 청소년이 만들어가는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튜브)
현장 관계자들은 AI 시대 디지털 시민성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제원 구미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디지털 시민성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체험과 실천을 통해 내면화되는 역량”이라며 지역 청소년 시설을 ‘디지털 시민성 허브’로 키워야 한다고 했다. 청소년 당사자인 남은지 청소년특별회의 위원은 “청소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니라 디지털 난민에 가깝다”며 “청소년들이 알고리즘의 주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