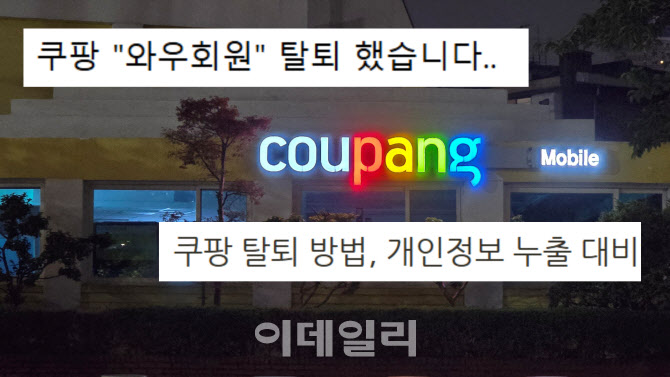[AI DALL-E3가 생성한 이미지]
당시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는 슬로건 아래 가족계획사업을 밀어붙였다. 정책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1955~1974년 연 90만~100만명에 달하던 출생아 수는 1979~1982년 84만~86만명대로 내려앉았고, 1984년에는 처음으로 7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2023년에는 23만명대까지 하락했다.
상황을 되돌릴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회고록 ‘이채필이 던진 짱돌’에 따르면 1984년 보건사회부 국장 주재로 열린 국립보건원 회의에서 이미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1980년 2.82명, 1983년 2.10명까지 떨어졌고 1984년엔 1.74명으로 지속 하락하면서 대체출산율(2.10명) 아래로 진입한 상태였다. 당시 사무관이던 이 전 장관은 “산아제한을 계속하면 머지않아 저출산 사회가 된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엔 질책만 돌아왔다고 한다.
이후 비슷한 주제의 회의는 10년 넘게 이어졌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인구정책의 방향을 바꿀 기회를 여러 번 놓친 셈이다. 합계출산율이 1.63명까지 떨어진 뒤에야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공식 폐지했다. 1960년대 목표였던 인구 억제는 성공했지만 그 후유증은 오늘날 국가적 위기로 이어졌다. 출산율 하락은 가속도가 붙어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까지 추락했다. 세계 인구학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은 2750년경 소멸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놓았다.
올해 들어 출산율이 소폭 반등해 0.8명대를 회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일시적 신호’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 출산세대인 30대 여성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주거·일자리·삶의 질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서다. 취업문은 여전히 바늘구멍이고 월급을 모아도 내 집 마련의 꿈은 신기루에 가깝다. 이런 현실에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꺼이 선택하기는 어렵다. 청년들이 충분히 일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는 한 저출생의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 더는 청년들이 결혼·연애·출산을 포기하는 ‘삼포(결혼·연애·출산 포기 ) 세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한다는 소식은 반갑다. 지방소멸, 이민, 청년 문제까지 포괄하는 종합 인구정책 콘트롤타워로 새판을 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그동안 간판만 바뀌고 실제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던 사례도 적지 않다.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아이에서 노인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이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인구전략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새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