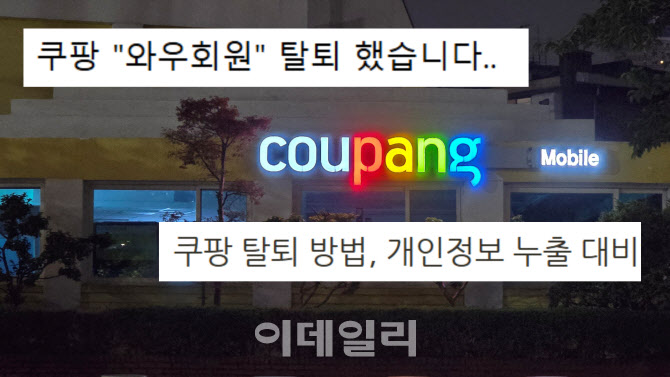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요즘 다시 해외 대학 랭킹이 언론과 대학을 뒤흔들고 있다. 올해 11월, QS(Quacquarelli Symonds)가 서울에서 '2026 아시아 대학 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 Asia 2026)를 공개하자 국내 언론은 일제히 "OO대 몇 위"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해외 평가기관의 행사 하나가 마치 '한국 대학 성적표 발표식'이 된 듯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 현상은 단순한 숫자 경쟁을 넘어, 교육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같은 대학, 다른 순위: 랭킹별 결과는 왜 엇갈리나
우선, 지금 발표되는 순위만 보더라도 QS와 THE(times higher education)의 결과는 크게 엇갈린다. QS world 2025에서 서울대는 31위지만, THE world 2025에서는 공동 62위다. KAIST는 QS에서는 53위, THE에서는 82위이고, 연세대와 성균관대는 QS에서는 각각 56위·123위지만 THE에서는 공동 102위다.
한편 지역 순위인 QS Asia 2025에서는 연세대 9위, 고려대 13위, KAIST 15위, 성균관대 16위, 서울대 18위, 한양대 19위, POSTECH 22위로 또 다른 순위 배열이 등장한다. 같은 해, 같은 한국 대학들인데도 '한국의 톱' 지도는 지표와 평가 방식의 차이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이 단순한 비교만으로도, 우리가 매년 접하고 있는 대학 순위가 '객관적 서열표'가 아니라 '측정 도구가 만들어낸 서로 다른 그림'임을 곧바로 알 수 있다.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에 마련된 학습공간 'K-큐브'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지표가 결과를 만든다: QS와 THE의 평가 기준 차이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이유는 각 평가기관이 대학을 바라보는 기준과 지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매우 단순화하면, QS는 국제적 평판과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교원당 인용도 같은 '외부 지향적 영향력'을 강조한다. QS 지표의 약 45%가 학계 평판과 고용주 평판 같은 설문 기반 평가라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반면 THE는 교육환경(teaching), 연구환경(research environment), 연구성과(research quality), 국제화, 산학협력 수입 등 보다 '대학 내부의 교육·연구 환경과 질'을 비중 있게 반영한다. 연구 인용도 역시 QS는 교원당 인용 비중을 크게 두지만, THE는 연구 질 지표를 세분화해 정교하게 측정한다.
요컨대 QS는 '국제적 브랜드 경쟁'의 속성이 강하고, THE는 '종합적 대학 운영 능력'에 조금 더 가까운 평가틀을 사용한다. 여기에 QS Asia는 비교 범위를 지역으로 한정해 '아시아 대학 간 상대적 경쟁력'을 보여주는 일종의 지역 리그다. 서로 다른 건강검진을 받으면 검사 수치가 달라지듯, 서로 다른 랭킹의 기준을 적용하면 대학의 위치도 달라지는 것이다.
지표 관리가 교육·연구를 잠식할 때: '순위 올리기'의 비용
문제는 이러한 지표와 평가방식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국내 대학과 언론이 이 순위를 하나의 절대적 서열 순위처럼 소비해 왔다는 점이다. 순위가 오르면 현수막을 걸고, 떨어지면 '비상 대책'을 세우며, 때로는 평가기관 컨설팅에 거액의 비용을 지출하기도 한다. 총장들은 동창회의 압력과 홍보 효과를 의식해 해외 평가에 과몰입하고, 언론은 이를 '객관적 실적'처럼 포장해 갈등을 부추긴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교육혁신과 연구역량 강화라는 근본적 과제를 뒤로 미룬 채 지표 관리와 서류 작업, 설문 독려에 자원을 낭비한다. 대학이 '평가기관이 설계한 게임'에 매달릴수록 대학 본연의 공적 기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경쟁하는가…본질로 돌아가자
결국 문제는 '한국 대학이 지금 무엇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지'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귀결된다. 대학은 글로벌 브랜드 점수 경쟁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지식을 생산하고 다음 세대를 성장시키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평판 지표 몇 퍼센트를 올리기 위해 교수들의 연구와 교육이 왜곡되고, 대학의 전략이 외부 평가 일정에 종속되는 현실을 더 이상 정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대학은 백화점 상품처럼 숫자로 진열되는 존재가 아니라 저마다의 철학과 비전을 가진 공공재다. 언론은 해외 평가기관의 홍보 대행사를 자처할 것이 아니라 이 순위 체제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조명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은 '순위 경쟁’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대학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에 다시 답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놀음의 함정에서 벗어나 각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연구의 본질로 돌아가는 일이다. 대학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때, 순위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참고자료로 다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opini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