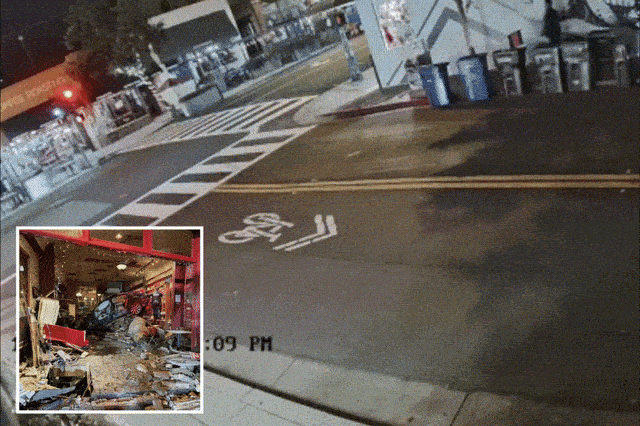문제는 평균의 착시다. 한국의 장시간 근로는 주로 소규모 제조업, 영세 자영업, 하청 업체, 서비스업 종사자 등에서 발생한다. 반면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은 이미 주 52시간제가 정착해 있고 재택근무·유연근무·장기휴가제·워케이션 등 다양한 제도를 누리고 있다. 즉, 한국의 문제는 ‘국가 전체의 과로’가 아니라 산업과 기업 규모별 격차의 문제다.
대기업 근로자들은 정시 퇴근과 휴식이 비교적 보장되고 성과 중심의 근무 문화로 전환 중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하청 구조에 놓인 근로자들은 여전히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한다.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들 영세사업장의 비중 때문이다.
전체 사업체의 98%가 50인 미만 소기업이며 이들이 전체 고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평균 1900시간’이라는 통계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아닌 중소기업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수치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구조적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에는 추가 복지에 불과하지만 인력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에는 생존의 문제다. 결과적으로 ‘쉴 수 있는 사람만 더 쉬는 제도’가 돼버리는 것이다.
OECD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독일은 약 1340시간, 프랑스 1490시간, 영국 1540시간, 일본 1640시간, 캐나다 1650시간, 미국 1790시간 수준이다. 이들 국가의 평균은 1570시간 내외로 한국보다 300시간 이상 짧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간당 노동생산성’이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약 51.1달러 수준으로 미국(약 83달러), 독일(약 75달러), 프랑스(약 70달러), 일본(약 60달러)보다 낮다. 즉, 한국은 더 오래 일하면서도 생산성은 훨씬 낮은 구조다.
임금 수준에서도 비슷한 격차가 나타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연간 임금은 약 4만8000달러, 미국은 7만7000달러, 독일은 6만달러, 프랑스는 5만달러, 일본은 4만1000달러 수준이다. 한국의 임금이 일본보다 높아졌다고 하지만 이는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이지 생산성이 높아서가 아니다. 시간당 보상으로 환산하면 여전히 주요 선진국보다 20~40% 낮다. 결국 한국의 문제는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다’가 아니라 ‘많이 일해도 덜 번다’라는 데 있다. 우리의 병목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생산성이다.
법의 기본 원리는 평등이지만 경제의 원리는 효율성이다. 모든 기업과 근로자에게 동일한 노동시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
생산 라인에서 정해진 공정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와 창의적 사고가 요구되는 연구개발자나 기획직의 노동시간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어떤 직무는 10시간을 일해도 집중도가 낮을 수 있고 또 어떤 직무는 5시간 만에 10시간의 성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양한 근무 형태를 모두 ‘주 52시간’이라는 하나의 법으로 묶어버려 효율적인 직무조정이나 성과 중심의 일 문화가 자리잡기 어려워졌다. ‘모두에게 평등한 법’이 실제로는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제도가 되는 이유다. 과연 어느 나라가 신생 소규모 기업에 노동시간을 규제하고 있나.
같은 일을 해도 성과와 기여도가 다르고 직무의 책임이 다르다. 임금은 그 차이를 반영하는 수단이다. 이를 억제하려는 제도는 열심히 일한 사람의 동기를 떨어뜨리고 혁신을 막는다.
노동시간도 마찬가지다. 개인, 기업, 산업마다 생산성이 다르다. 법으로 획일화한 근로시간을 강제하면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가 같은 조건에 놓인다. 결국 이런 제도는 생산성 향상을 막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벼농사와 밭농사, 과수농사를 같이 하는 농민에게조차 일을 얼마만큼 하느냐는 적용할 수 없는 개인적 의사결정의 영역이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축소하는 일이다. 줄어드는 인력을 보완할 유일한 방법은 단위당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인구감소 시대의 경제 생존 전략이다.
생산성 향상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다. 기업 문화 개선, 직무 전문성 강화, 재교육, 인공지능(AI)·자동화 도입, 유연근무제 확산 등으로 일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적게 일하고도 더 잘 버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지 단순히 ‘적게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90%를 넘는다. 한국은 60% 수준이다. 주어진 휴가만 모두 소진해도 근로시간은 연간 100시간 이상 줄고 사회 전체적으로 7% 이상의 추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법으로 시간을 줄이지 않고 휴식 문화만 바로 세워도 근로시간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주 4.5일제보다 더 현실적인 방법이다.
한국의 근로시간 논쟁은 결국 생산성 논쟁이다. ‘법으로 시간을 줄이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은 착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시간당 부가가치를 높이는 혁신이다. 이는 국가의 저출생·고령화에 대체하는 노동 존중 정책이며 경제정책이고 유일한 생존전략이다. 더 일하고 더 쉬고 더 행복해지는, 다 같이 살아가는 사회는 우리 가까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