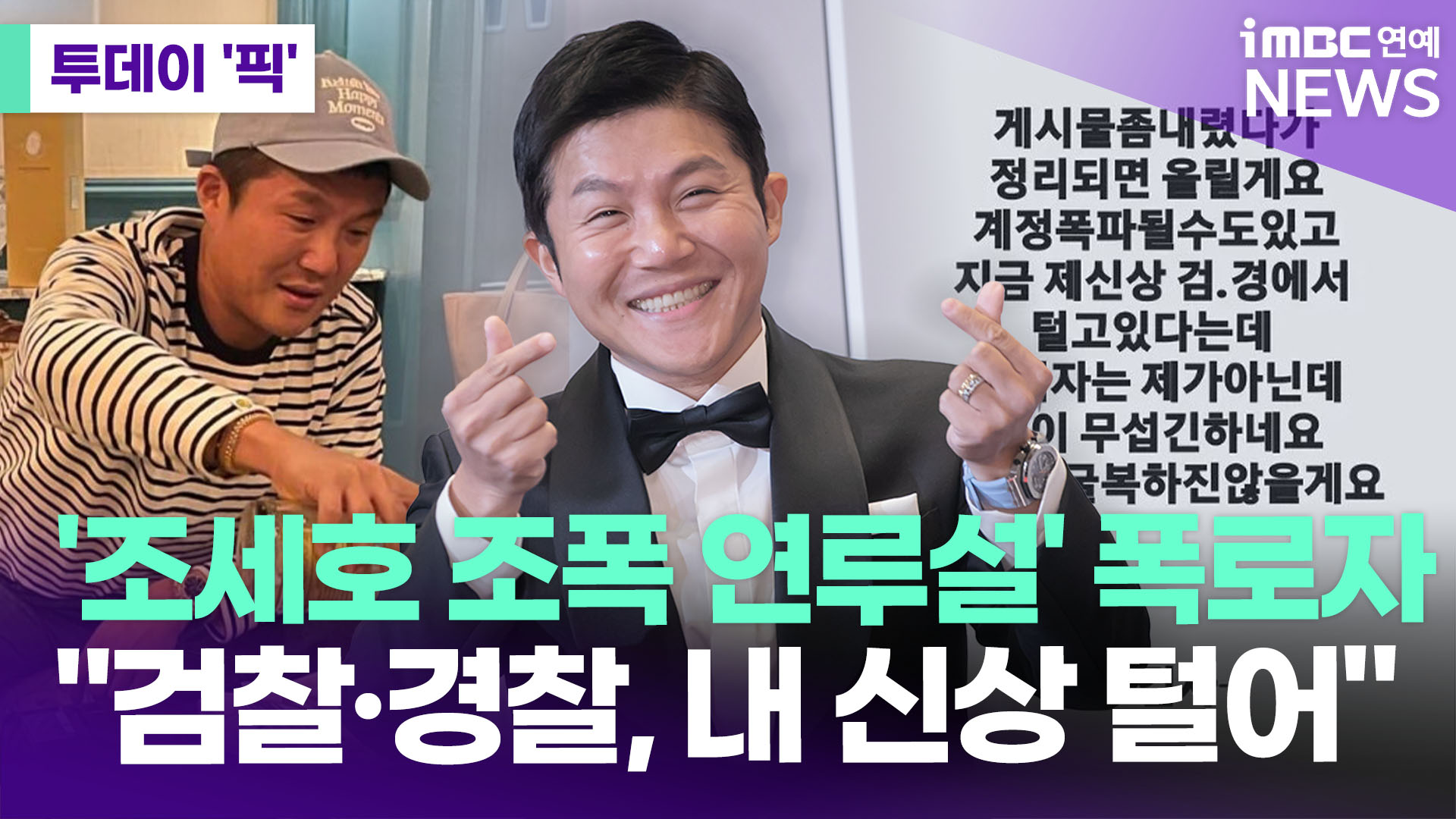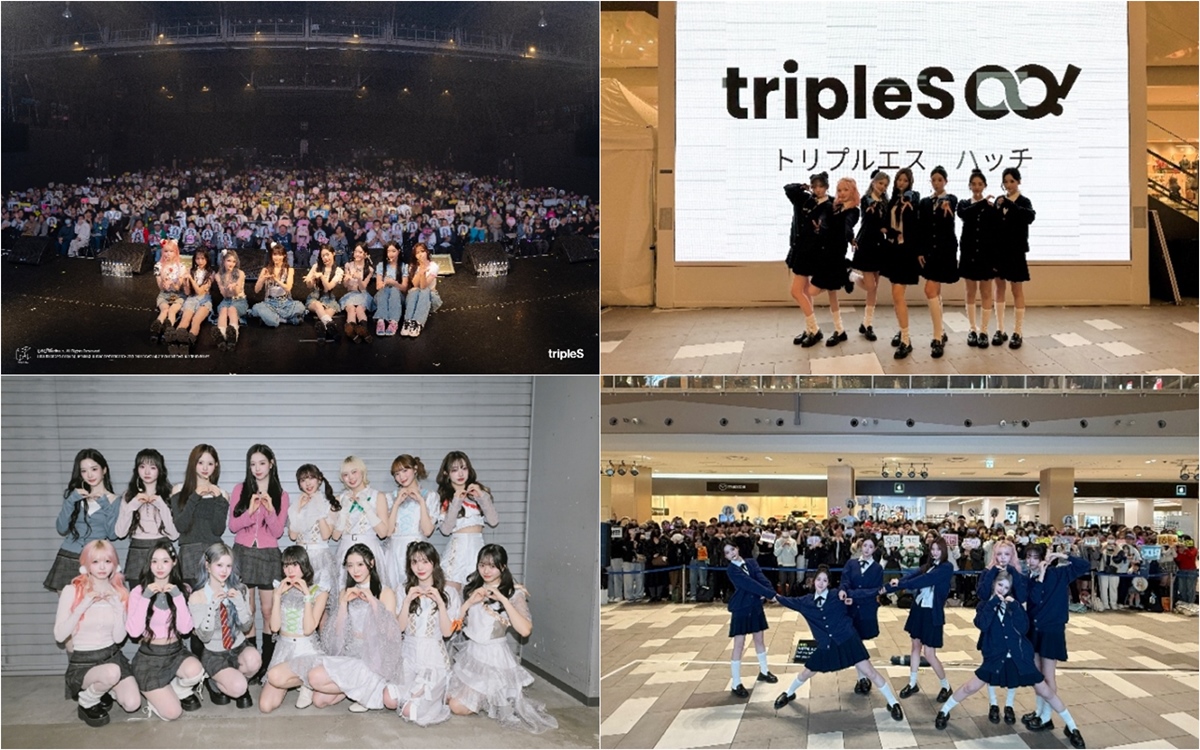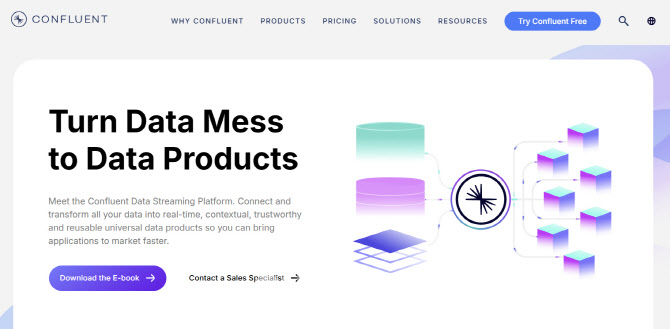[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지만 연세대 경영대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과 과제-노동정책을 중심으로’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8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5 제3회 좋은일자리포럼’에서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소득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현행 노동시장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면 이중구조만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정년연장 명분 ‘소득공백’ 해소…상위 17%만 혜택
정부가 65세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가장 큰 명분은 ‘60세 정년과 65세 연금 지급 사이의 소득공백’이다. 이 교수는 이 공백의 실체와 비용 부담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3만원 수준, 공공기관 종사자도 평균 200만원 정도다. 반면 기업이 60세 이상 정규직을 유지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평균 임금은 570만~7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 교수는 “70만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업에 700만원을 부담시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10년 전 도입된 60세 정년도 실제 노동시장에선 ‘규정상의 정년’으로만 존재할 뿐이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현재 정년 적용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집단은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 약 17%**에 불과하고,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단기근로 형태로 정년과 무관하게 고용이 종료되고 있어서다.
실제 기업들의 평균 조기퇴직 연령은 52.9세, 50대 초반 권고사직 비율은 여전히 높고 구조조정의 핵심 타깃도 50대다.
이 교수는 “정년 65세 도입 시 혜택은 상위 집단에 집중되고, 오히려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는 제도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한다”며 “정년연장은 특정 계층만 이익을 보는 불균형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연장이 가져올 가장 큰 부작용으로 이 교수는 청년고용 위축을 꼽았다.
이 교수는 “정년연장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시점을 뒤로 밀어내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은 임금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신규채용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해법은 ‘패키지 정책’…정년·임금·직무·재고용 구조를 함께 손봐야
이 교수는 지금의 정년연장 논의가 숫자 조정에만 매몰되어 있다며 그 아래에 깔린 노동시장 구조를 먼저 손봐야 정년정책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가 제시한 해법은 하나의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 문제를 동시에 조정하는 ‘패키지 접근’이다.
그는 우선 정년 규정 자체의 실효성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정년을 높이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50대 초반 조기퇴직이 지속되면 제도는 현실과 괴리될 수 밖에 없어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구조를 직무·역량 기반 체계로 전환해 임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을 돕는 시스템을 병행하지 않으면 세대 간 고용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년은 노동시장의 맨 위에 있는 제도이며, 그 아래의 임금·직무·재고용 구조가 함께 움직여야 실효성이 생긴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단일한 정년정책이 아니라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년, 임금체계, 직무 기준, 중장년 고용, 청년 일자리 체계를 하나로 묶는 정책 패키지가 마련되어야 세대·직군·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균형 있는 노동시장 개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