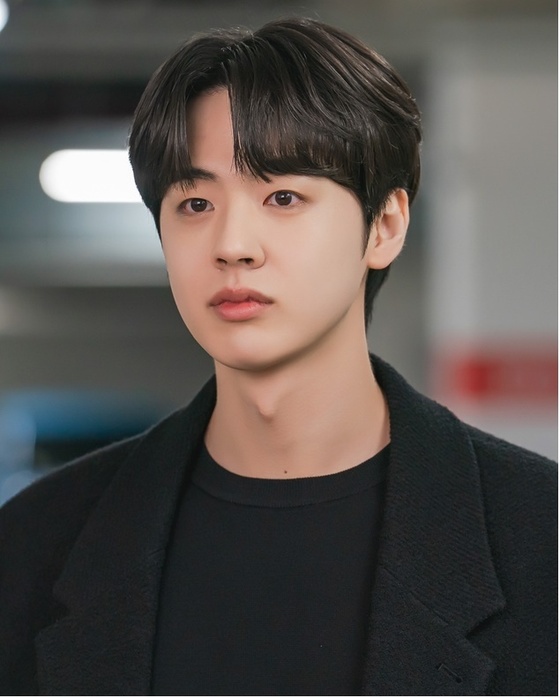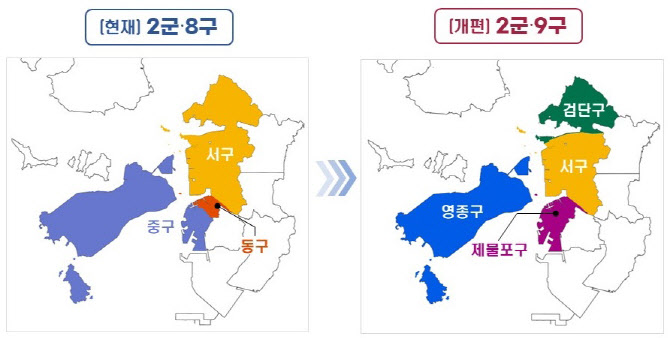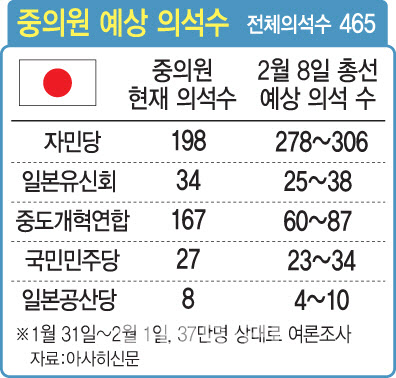정원오 성동구청장(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이영훈·김태형 기자)
그는 현재의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에 드는 모든 비용뿐 아니라 업체의 이윤까지 표준운송원가에 포함해 서울시가 100% 보전하는 구조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업체가 경영을 효율화하거나 비용을 아낄 동기가 적다는 것이다.
해법으로는 철도망과 과도하게 중복된 시내버스 노선을 정리하고 철도망을 중심으로 대중교통망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노선이 없는 곳은 그 공백을 메울 보완노선을 재배치하고 수익성이 낮아 시내·마을버스 운행이 어려운 노선은 공공버스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이전에도 버스파업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선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민영제와 공영제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화 모델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며 성동구의 성공버스(성동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를 참고 사례로 내세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자치구에서 10대 정도의 공공버스를 운영해본 경험으로 7000대가 넘는 서울시에 버스 공영제를 적용하자는 것은 깊은 연구가 결여된 즉흥적인 제안으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이어 “전체 버스를 공영제로 하면 2023년 기준으로 2조 1000억원이 더 들고 매년 1000억원 정도의 시민 세금을 써야 한다”며 “적자 노선만 공공화한다면 수익은 버스회사가, 적자노선은 시민세금으로 보전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영제로 운영 중인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민영제나 준공영제보다 더 많은 운영비를 투입하는 게 현실”이라며 “결국 그 부담은 요금 인상이라는 형태로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 만약 요금을 올린다면 100원정도를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제시했다. 필수공익사업이란 일반 국민이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공공사업들을 뜻하는 말로, 지정 시 버스가 파업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운행을 담보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실제로 필수공익사업인 지하철의 경우 파업 시 적정 수준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파업권을 제한하자는 게 아니다”며 “노동자의 쟁의권은 존중하되 시민이 일상을 이어갈 권리 역시 제도로서 보호하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철도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파업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며 “시민의 큰 불편 없이 노조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