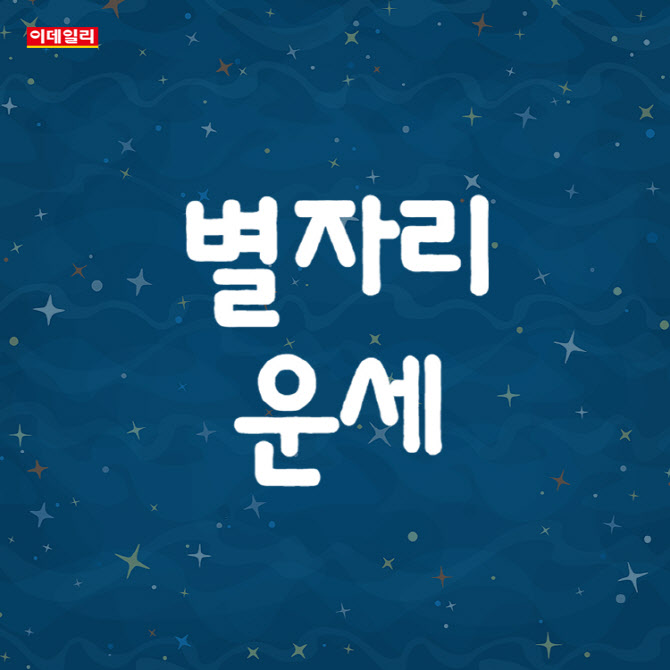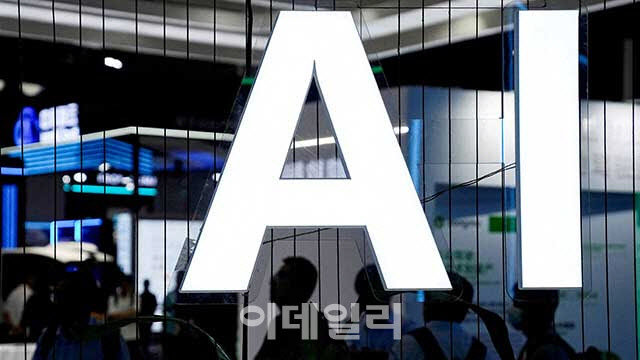
(사진=연합뉴스)
반면 ‘창업초기 소형’ 분야는 201억원에 불과해 비(非)AI 스타트업에는 사실상 자금 유입이 제한됐다. 당국은 “AI·딥테크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야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의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국내 AI 스타트업 다수는 여전히 응용 서비스 단계에 머물러 있고,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반도체 인프라를 직접 구축한 기업은 드물다. “자금은 쏟아붓지만 실질적으로 소화할 기업 풀이 좁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일부 벤처캐피탈(VC) 관계자는 “결국 밸류 거품만 키우고, 플랫폼 기업 유동성 호황기처럼 실적과 괴리된 몸값만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자본시장 데이터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계 VC 투자금의 53%가 AI 스타트업으로 향했다. 미국만 놓고 보면 그 비중이 64%에 달한다. 오픈AI가 400억달러, 스케일AI가 140억달러, 일론 머스크의 xAI가 100억달러 규모 펀딩에 나서는 등 메가딜이 줄을 잇고 있다. AI 스타트업 비중은 전세계적으로 29%, 미국에서는 36%까지 치솟았다. 사실상 ‘AI만 투자받는 시장’으로 기울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한국은 글로벌과 상황이 다르다. 필수 인프라가 취약하고, 독자적인 R&D보다 글로벌 기술을 응용하는 기업이 다수다. 단기간 내에 대규모 투자를 소화하며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수가 제한적인 셈이다.
결국 정부의 드라이브는 긍정적 시그널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AI는 산업을 혁신하는 도구이지만 독립적 성장동력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과거 플랫폼 기업 거품이 남긴 교훈처럼, AI 역시 거품 논란을 피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한 VC 관계자는 “AI는 피할 수 없는 메가트렌드지만, 결국 상장과 엑시트 구간에서 성과가 입증되지 않으면 LP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투자 속도보다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