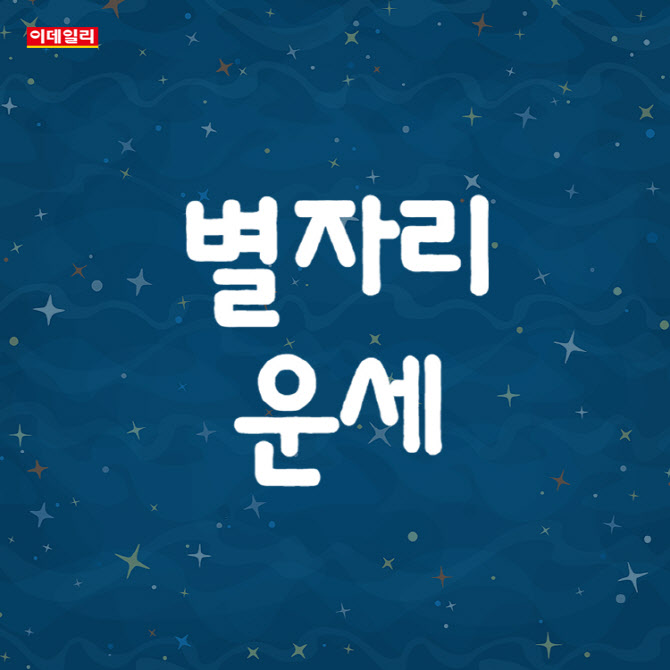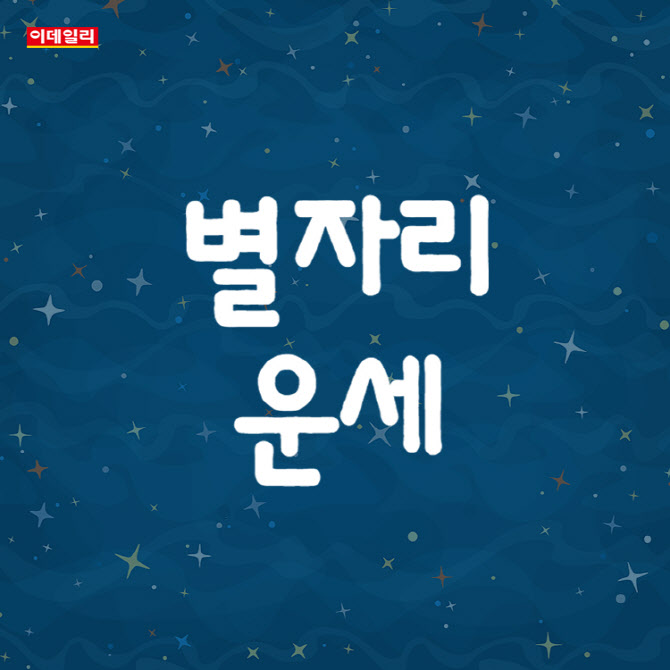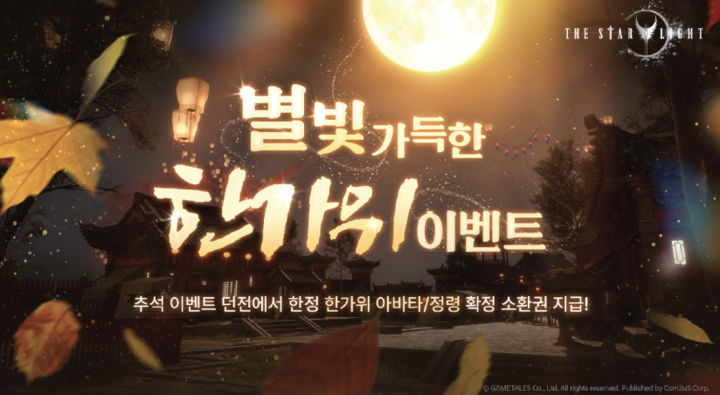(사진=연합뉴스)
한국앤컴퍼니 역시 지난 5월 전담 법인 ‘한국앤컴퍼니벤처스’를 공식 출범시켰다. 100% 자회사 형태로 신설된 이 회사는 수백억 원 규모의 1호 블라인드펀드 결성을 추진 중이며, 연내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라이선스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투자 분야는 AI, 로봇, 우주, 양자컴퓨팅 등 이른바 ‘딥테크’ 영역으로, 모빌리티·에너지 사업 확장을 넘어 첨단기술 분야 스타트업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포석이다. 앞서 한온시스템 인수로 몸집을 키운 한국앤컴퍼니가 이제는 벤처 투자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굵직한 그룹들이 잇따라 CVC 투자를 본격화하자 재계 안팎에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CVC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수는 있지만 여러 제약이 따른다. 반드시 100% 자회사로 두어야 하고, 펀드 결성 시 외부자금은 전체의 40%까지만 허용된다. 차입 역시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묶여 있다. 해외 투자 비중도 20%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외부자금 출자한도를 50%로, 해외투자 비중은 3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다. 또 공동 운용(Co-GP)을 허용해 글로벌 벤처캐피탈과 협업할 수 있는 길을 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재계 인사는 “대기업은 기존 산업 네트워크와 자본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스타트업을 키우는 데 최적”이라며 “금산분리 완화 없이는 민간 유동성 유입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회사·CVC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지주 소속 CVC의 벤처 투자 집행액은 24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9% 늘었다. 지주회사 수도 177개로 소폭 증가하며 CVC를 통한 자금 공급 규모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금융 중심의 벤처펀드 조성이 포화에 이르면서 민간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CVC가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벤처업계의 체감도 비슷하다. 최근 벤처기업협회 설문조사에서는 ‘차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CVC 규제 완화’를 꼽은 응답이 24.5%로 가장 많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책자금만으로는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에 한계가 명확하다”며 “민간 자본이 대거 유입돼야 회수시장 다변화, 특히 M&A와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