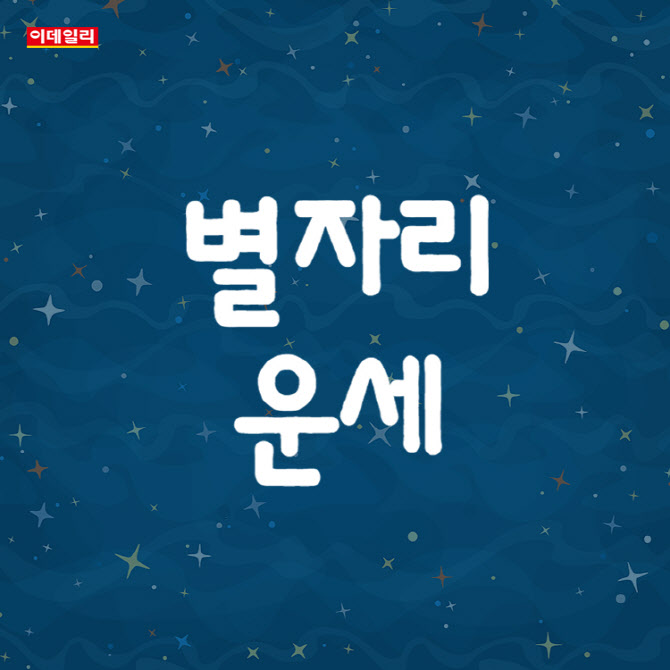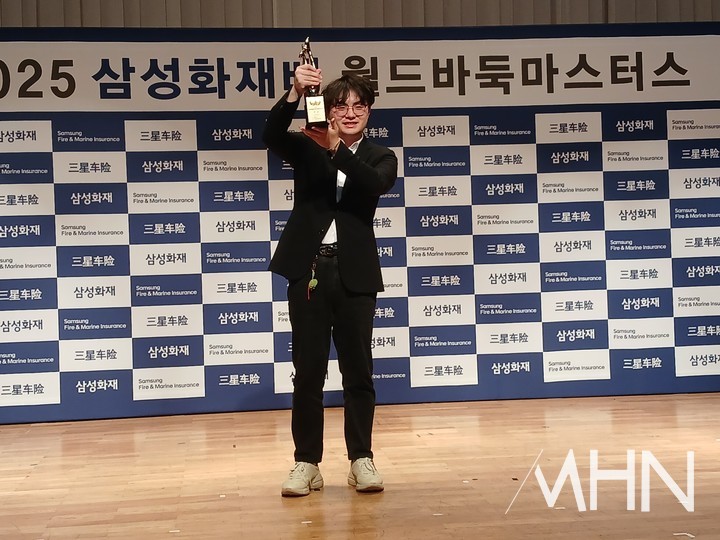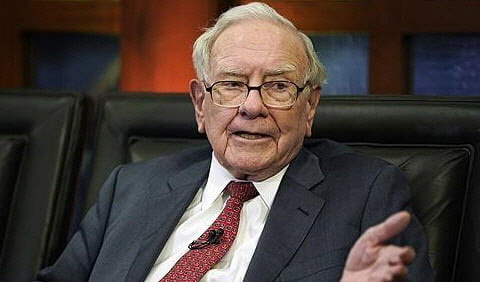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인 이른바 ‘버핏지수’부터 살펴보자. 2024년 우리나라의 명목GDP 2556조원 대비 코스피 시가총액은 3300조원(14일 기준)으로 버핏지수는 무려 144%에 달한다. 코로나19 직후인 2021년 사상 최대치였던 124%를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다.
워런 버핏이 만든 이 지표는 주식시장이 한 나라의 실물경제 규모 대비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버블 지수’로 불린다. 단순 계산으로도 현재 우리 증시가 실물경제를 1.5배 가까이 앞서가고 있다는 의미다.
흥미로운 건 최근 워런 버핏의 투자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액이 3분기 기준 3817억달러(약 534조원)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점이다. 버핏은 애플 지분을 대거 매각하는 등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쌓아가고 있다. 시장 과열을 우려한 ‘투자의 귀재’가 방어적 태도로 선회한 것이다. 그가 보는 미국 증시와 우리가 마주한 한국 증시의 고평가가 심상치 않다.
M2 통화량 대비 시총 비율로 측정하는 유동성 지수 역시 위험수위에 근접했다. 9월 기준 M2 통화량은 4477조원,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 합계는 3773조원으로 유동성 지수는 약 84.3%를 기록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이 같은 수치는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의 91%보다는 낮지만, 코로나19 시기 78%는 이미 넘어선 상태다. 시중에 풀린 돈 대비 주식시장으로 쏠린 자금의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다.
물론 이들 지표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시장 구조와 환경이 달라지면서 과거 수치를 단순 비교하기엔 한계가 있다. 글로벌 유동성 환경도 과거와 다르고, 정책적 주식시장 구조개혁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현재 주식시장이 실물경제나 유동성 규모 등과 비교하면 역사적 고점 수준까지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정책의 속도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앞서 가고 있다.
과거 데이터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높은 기대감으로 부양된 시장은 이후 수익률이 저조했다. 기업 이익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높아진 상황에서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빚을 내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상승장이 지속될 땐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이 극대화되지만, 조정이 오면 손실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시장이 뜨거울수록 냉정함이 필요하다. 버블 지수들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한 채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빚투에 나서는 건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 버핏이 현금을 움켜쥐고 있는 이유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