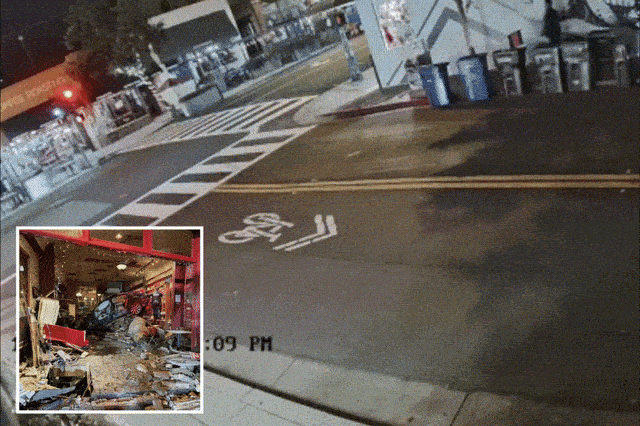AI·핀테크·콘텐츠 플랫폼 기업의 경우 글로벌 자본 접근성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증시보다 나스닥 상장이 낫다는 판단에서 미국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 증권 거래위원회(SEC) 규제 강화, 회계·공시 기준 상향, 글로벌 기업공개(IPO) 투자심리 둔화 등 복합적인 장벽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원하는 밸류에이션과 시점에 나스닥에 입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야놀자는 나스닥 상장을 염두에 두고 과거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주관사로 선임했지만, 실제 상장 추진은 지연되고 있다. 2021년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약 2조원을 유치하며 미국 상장 가능성이 급부상했으나, 글로벌 플랫폼 시장의 밸류에이션 하락으로 당시 거론됐던 10조원 수준의 희망 밸류와 실제 평가 간 괴리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미국 나스닥 상장을 사실상 확정 짓고 JP모건·모건스탠리를 주관사로 선정하며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 시장에서는 예상 시가총액을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지만, 핀테크 업종에 대한 미국 기관투자가들의 보수적 시각, 규제 리스크, 수익성 프레임 등이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네이버파이낸셜 역시 두나무와의 합병 이후 해외 상장 가능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나스닥 상장 등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고 언급했지만,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국내보다 미국 시장에서 더 높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상장 옵션을 열어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국내 기업들의 미국 상장 성공률이 최근 몇 년간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다. SEC의 엄격한 회계·공시 기준, 내부통제 강화 요구, 장기 심사 절차 등이 발목을 잡으면서 ‘프리밸류 조정 → 추가 보완 요구 → 상장 지연’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글로벌 IPO 투자심리 위축까지 겹치면서 상장 자체를 철회하는 사례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 벤처투자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나스닥에 도전하려면 글로벌 수준의 회계·IR·지배구조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국내 기준과 괴리가 커 준비 부족으로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 기관투자가들과의 소통 경험이 적은 것도 핵심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밸류에이션 문제도 난제로 꼽힌다. 다른 한 VC 운용역은 “국내 유니콘 상당수가 매출 대비 과도한 밸류를 들고 미국 시장에 접근하려 하지만, 현재 글로벌 투자자들은 성장성보다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더 본다”며 “프리밸류 조정 없이는 상장 성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나스닥 상장의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글로벌 기술기업 프리미엄, 해외 자본 유입, 브랜드 강화 효과 등은 국내 시장에서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식 빠른 상장 전략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회계·공시 체계의 선진화, 글로벌 IR 역량 확보, 중장기 성장 전략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앞선 VC 관계자는 “미국 시장은 준비되지 않은 기업에게 매우 냉정하다”며 “K-유니콘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선 구조적 체질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