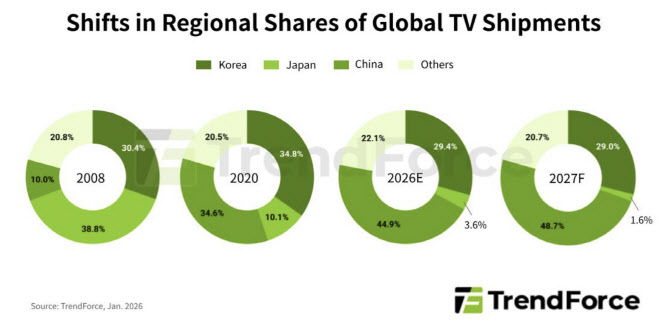코스피가 사상 처음 4,900을 돌파한 지난 19일 국내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개인 투자자들의 글이다.

코스피가 장중 5,000을 넘어선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기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스피가 사상 초유의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적게는 몇백만원, 많게는 수십억 원의 수익을 인증하는 개미들도 있었다. 그러나 상당수는 기대만큼 수익률을 올리지 못했거나 오히려 손실을 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지수는 4% 남짓 오르는 데 그쳤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인 ‘코스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을 내놨지만 ‘천스닥’(코스닥지수 1,000)까지는 아직 약 40포인트나 남아있다.
국내 증시가 대형주들의 독무대가 되면서 당초 전문가 분석과 달리 중·소형주 프리미엄이 강하게 나타나는 ‘1월 효과’도 미미한 실정이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대형주 지수는 이달 들어 약 20% 올랐지만, 중형주와 소형주 지수는 각각 약 8%, 1.2% 오르는 데 그쳤다.
반도체 대형주에서 자동차, 원전, 방산 등 다른 업종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순환매 장세에도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쏠림현상’이 심화한 것이다.
한지영·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 12일 “연초 이후 6거래일간 코스피가 8% 넘게 급등했지만, 이 기간 코스피의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의 평균은 각각 316개, 470개를 기록했다”며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많은 구간에서 지수가 급등했다는 것은 반도체, 조선, 방산, 자동차 등 소수 업종에만 랠리 온기가 집중됐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 2559개 종목 가운데 연초 이후 1524개(59.6%) 종목이 상승했지만, 하락한 종목도 1035개(40.4%)에 달했다.
이에 대해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코스피가 역대급 강세를 보였지만 온기의 확산은 제한적으로 다소 쏠림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