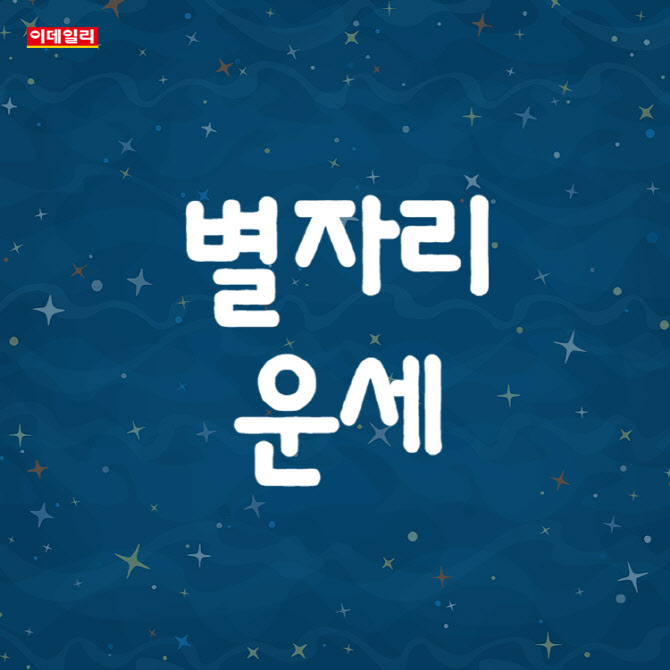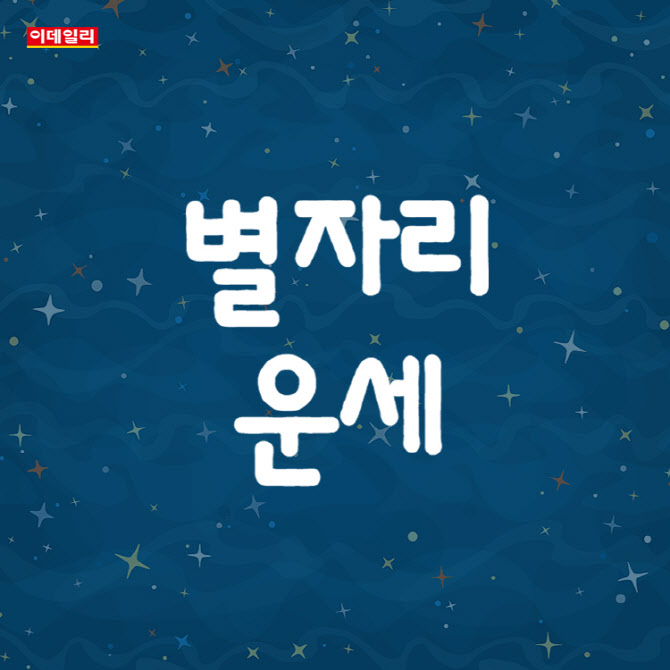세계 3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스테이트스트리트(State Street)의 회장 로널드 오핸리 가 제시한 전망은 단순한 트렌드 분석이 아니다.그는 “이 다섯 가지는 서로 얽혀 있으며, 자본의 흐름과 정책의 축, 산업의 우선순위를 동시에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핸리 회장의 발언은 국가부채 급증, AI 투자열풍, 에너지 수급 불균형, 규제 완화, 공급망 재편이 맞물린 ‘새로운 자본질서’(New Capital Order)의 윤곽을 그렸다.

로널드 오핸리 스테이트스트리트 회장이 15일(현지시간) 어싱턴DC에서 열린 국제금융협회(IIF) 연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금융협회(IIF) 연례회의에서 오핸리 회장는 “현재의 국가 부채 수준은 현대 경제사에서 유례가 없다”며 운을 뗐다. 그는 “전면전이 벌어지는 상황도 아닌데 이 정도의 재정지출이 지속되고 있다. 어느 시점이 상한선인지, 어느 수준에서 시장이 반응할지 누구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부채는 단순히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변수가 됐다”며 “고정수입(fixed income) 시장뿐 아니라 투자 배분, 통화정책, 민간자본의 위험선호도 모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핸리 회장는 “‘무한 부채 시대’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며, 정부와 투자자 모두 자금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AI는 자기증폭형 군비경쟁...이제 막 시작 단계”
AI를 두 번째 축으로 제시한 그는 “AI는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라고 규정했다. 구눈 “5대 하이퍼스케일러만 놓고 봐도 300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전통산업과 스타트업의 자본투자까지 합치면 1990년대 통신 인프라 구축 붐에 비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하이플라이어(high flyer)’들이 통신기업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센터·반도체·AI 활용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AI는 일종의 ‘자기증폭형 군비경쟁(arms race)’이다. 성능이 향상될수록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하고, 더 큰 투자가 뒤따른다”고 분석했다.
“내 아이들이 ‘구글이 뭐야?’라고 묻는다. 그만큼 검색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AI의 진정한 승자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생산성 향상 효과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수요는 폭발적… 현실과 이상 동시에 봐야”
오핸리 회장는 “AI의 확산은 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전망치를 절반으로 줄여도 에너지 수요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금의 인프라로는 감당이 불가능할 수준”이라며 “결국 전 세계가 모든 에너지원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논점은 ‘재생에너지 대 전통에너지’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에너지원의 최적 조합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오핸리 회장는 “미국 내 최대 재생에너지 투자 지역은 텍사스다. 땅이 넓고, 바람이 불며, 햇빛이 강하기 때문이다. 즉 시장의 논리가 작동한 결과”라며, “이념이 아니라 물리적·경제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AI 발전 속도에 따라 에너지 산업의 구조 자체가 재편될 것”이라며 “에너지와 AI는 이제 불가분의 관계”라고 했다.
◇“규제완화, 미국에서 세계로… 새로운 균형점 모색 중”
오핸리 회장는 “미국 행정부의 탈규제(deregulation) 정책이 이미 금융과 디지털 자산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단기 정치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시작이다. 토큰화(tokenization), 디지털자산 규제, 인프라 투자정책 등에서 이미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탈규제 논의가 유럽과 아시아로 확산되고 있다”며 “미국의 정책 방향이 세계 각국의 정책 프레임을 자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의회와 행정부 간 조율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미지수지만, 정책의 방향은 명확하다. 금융과 기술, 산업정책이 서로 교차하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세계화의 종말이 아닌 재세계화… 안보와 산업이 주도”
오핸리 회장는 마지막으로 “세계화의 종말이 아니라 재세계화(Re-globalization)가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에는 시장과 효율이 절대적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안보·산업정책·공급망 안정성이 새로운 우선순위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로스앤젤레스 항의 최대 수출국이던 중국의 자리를 지난해와 올해 모두 베트남이 대신했다”며 “공급망 재배열(reordering)이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럽은 방위비 증액과 산업기반 재건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전통 제조강국인 독일뿐 아니라 중·동유럽 국가들도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긴장이 낳은 경제적 재세계화의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2026년까지 자본의 지형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며 “이제는 글로벌 자본의 재배열(reordering)이 시작됐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