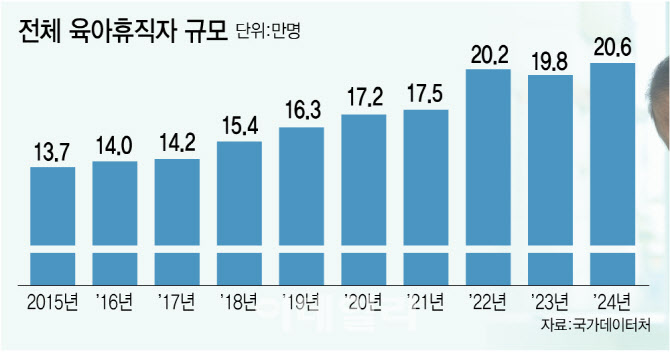(사진=AFP)
앞서 회사 설립자이자 전(前) CEO인 콜린 앵글은 아마존과의 인수 거래에 대한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의 심사가 “회사의 ‘스케일 확대 경로’(path to scale)를 차단해 아이로봇의 추락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규제 당국이 회사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나무에 집착하다 숲을 잃은’ 전형적인 실패”라며 아마존의 인수 불발로 “혁신적인 미국 기업과 미국 일자리, 미국 지식재산권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코헨 CEO는 이를 정면 반박했다. 그는 “회사는 혁신에 실패했다. 소비자에게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 경쟁사들에 가격과 제품 구성 면에서 철저히 밀렸다”고 일축했다. 이어 “회사 문제를 모두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는 건 결국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나는 피해자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마존과의 인수·합병(M&A) 거래 무산이 아이로봇에 타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제품 경쟁력·비용 구조·고객 경험 측면에서 다년간 누적된 전략 실패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1990년 설립된 아이로봇은 2000년대 초 가정용 로봇 청소기의 대명사가 된 룸바로 시장을 개척했다. 하지만 이후 ‘유피’(Eufy), ‘로보락’(Roborock) 등 중국 업체들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걸레·청소 겸용 로봇 등 새로운 제품군으로 공세를 펼치면서 시장 주도권을 빼앗겼다.
코헨 CEO는 “아이로봇이 5~10년 전 전략적 결정을 다르게 내리고 경쟁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지금 상황은 전혀 달랐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전 경영진이 “소비자 니즈를 ‘이해하’기보다는 자사 기술을 소비자에게 ‘강요’했고, 원가 구조를 경쟁사 수준으로 맞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아이로봇은 지난 14일 파산 신청(챕터 11)을 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에 부품을 공급해온 중국 피시아 로보틱스와 그 자회사에 인수될 것이라고 알렸다. 양사는 피시아가 아이로봇 지분 전량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 합의를 체결했다.
델라웨어 파산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매각 당시 아이로봇은 피시아에 제조 서비스 대금으로 1억 6150만달러를, 피시아 홍콩 자회사에는 1억 9100만달러를 각각 빚진 상태였다. 홍콩 자회사가 보유한 채권은 지난달 미국 사모펀드 칼라일그룹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이 밖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인상에 따른 약 340만달러의 미지급 관세도 확인됐다.
코헨 CEO는 관세 부담과 규제 환경 등이 “잠재 인수자 범위를 좁혔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인수 후보와의 협상은 아이로봇이 당시 주요 채권자였던 칼라일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아이로봇은 앞으로 상하이 등에서 피시아 인력을 활용해 일부 엔지니어링 기능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독립 상장사 지위를 잃고 중국 제조업체의 자회사가 되는 것이다. 룸바 브랜드와 기술 자산이 어떤 방식으로 재편·활용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코헨 CEO는 미국 상장사였던 아이로봇이 중국 제조·공급망에 더 깊이 의존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만 답했다.
그는 “부채가 쌓인 제조업체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피시아가 사실상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파트너였다”며 “주어진 카드 안에서 최선의 수를 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약 500명의 일자리는 지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