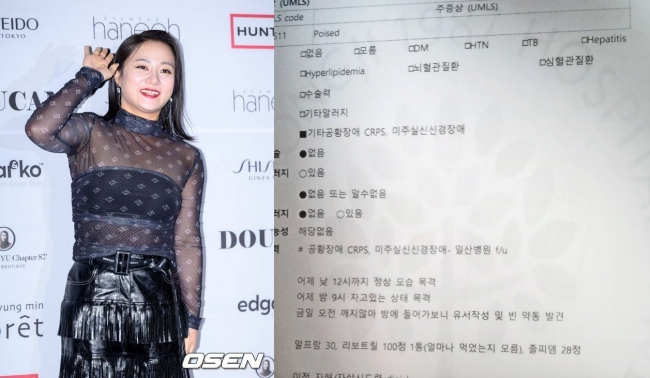중국은 기술이 아니라 환경을 설계하는데 공을 들인다. 이는 화웨이와 알리바바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통칭하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디지털 인프라를 깔고 ‘틱톡’이 그 위에서 정서적 영토를 확장한 방식과 궤를 같이한다. 개별 제품의 성능 경쟁을 넘어 사용자가 중국식 인터페이스와 표준에 익숙해지도록 해 자연스럽게 중국 생태계에 편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중국이 강조하는 ‘강강연합’(强强聯合) 역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함께 강해지자’는 달콤한 수사 뒤에 중국발 생태계 확장이라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은 이 거대한 서사의 전쟁터에서 어떤가. 한국은 CES 혁신상을 휩쓸며 기술의 밀도를 증명했지만 이를 하나의 국가적 외교 자산으로 꿰어낼 서사의 실은 중국과 비교해 부족해 보인다. 민관이 합동으로 이 서사 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생태계 전략을 치밀하게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5세대 이동통신(5G)망이나 스마트 시티 인프라 수출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에듀테크나 의료 AI 솔루션을 기본 탑재하는 K콘텐츠 플랫폼·정보기술(IT) 인프라의 동반 진출이 필요하다. 정부의 뒷받침은 두말할 나위 없다. 현지 주민이 한국의 기술 없이는 일상의 편의를 누리기 어려운 생태계를 선제로 조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10년 후 전 세계를 한국의 우방으로 만드는 가장 실질적인 기술 외교의 본체다.
여기에 한국만의 차별적 서사인 기술의 민주화와 상생을 얹어야 한다.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에서 기술 강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압축 성장 유전자(DNA)는 글로벌 사우스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공감과 희망을 제공한다. 기술 경쟁은 이제 누가 더 매력적인 미래를 이야기하느냐의 싸움이다. 우리가 가진 독보적인 기술 자산을 외교적 서사로 전환하고 부처 간 장벽을 허무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때 한국은 기술 패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 민관이 함께 공동의 목표로 향할 때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