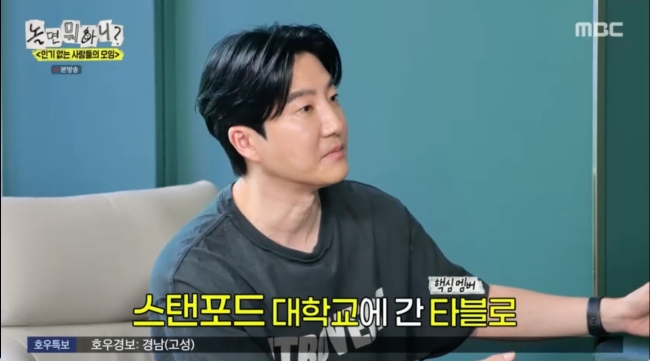인류 문자의 기적, 한글
지구촌 7000여개 언어 중 창제자와 창제시기, 창제원리, 창제목적이 분명하게 밝혀진 문자는 단 하나, 바로 한글이다. 1443년에 세종대왕은 대다수 백성을 위한 문자를 창제했다. 인간의 발음기관과 천지인의 원리를 형상화한 한글은 그 자체로 철학이고 과학이며 예술이다.
한글의 진면목은 그 단순함과 규칙성에 있다. 단지 아름답기만 한 문자가 아니다. 정(情)과 한(恨)처럼 외국어로 온전히 옮기기 힘든 깊은 정서를 담는 그릇이자, 복잡한 의미를 간결하게 담아내는 고효율의 언어도구다.
영문소설을 한글로 번역하면 문장 분량이 20~30%나 줄어드는 현상은 단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곧 한글이 얼마나 압축적이고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더욱이 한글은 난독증 발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문자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규칙적 구조, 체계적인 음소 조합, 직관적인 발음법, AI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한글은 인간과 기계 모두에게 우호적인 문자다. 기술이 언어를 요구하는 시대, 한글은 ‘세계 표준어’가 되기에 손색이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문화가 이끄는 세계, 문자로 이어지는 미래
인류 역사는 늘 문화의 중심이 세상의 패권을 좌우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중세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해양강국 네덜란드, 낭만과 계몽의 프랑스, 산업혁명의 영국, 그리고 20세기의 미국, ‘팍스 로마나’에서 ‘팍스 아메리카나’로 이어지는 흐름은 결코 무력의 결과만은 아니었다. 문화의 향기와 언어의 힘이 세상을 지배해온 것이다.
지금 세계는 K-Culture라는 새로운 흐름에 열광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문화의 중심에는 ‘한글’이 서 있다. 한국은 기술 선진국이자 인공지능 시대의 중요한 선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만약 여기에 한글의 세계화가 더해진다면, 한국은 문화와 기술의 쌍두마차를 탄 미래 국가로, 그 누구보다 빠르고, 넓고, 깊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Pax Koreana’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다.
171개국 선교사, 한글 세계화의 또 다른 열쇠
그러나 국가적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세종학당이 아무리 확대되어도, 물리적 한계와 재정적 제약은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또 하나의 길을 제안하고자 한다. 바로 전 세계에 파견된 수많은 한국 선교사들을 통한 한글 확산 전략이다.
현재 2만1000여명의 한국인 선교사가 해외 171개국에서 활동 중이다. 이들에게 2개월 단기과정의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KSL)’ 교육을 온라인(ZOOM)으로 제공해 자격 인증을 부여한다면, 그들은 선교사역과 함께 한글 교육의 첨병이 될 수 있다.
이는 곧 현지인들에게는 문화와 교육의 기회를, 우리에게는 외교와 산업의 확장을 의미한다.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 높아지고, 유학, 취업, 이주 수요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지방소멸과 인구절벽을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뜻밖의 해답이 될 수도 있다.
한글은 외국인들도 당장 뜻은 몰라도 단 몇 시간, 몇 일이면 읽고 쓸 수 있다. 기술과 문화가 언어를 무기로 삼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무기가 단절과 분열이 아닌, 연결과 이해의 도구가 되길 바란다. 한글은 그러한 꿈을 품기에 가장 적합한 문자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글의 잠재력을 믿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며, 문자를 통해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길을 여는 것,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어쩌면 ‘팍스 코리아나’ 시대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