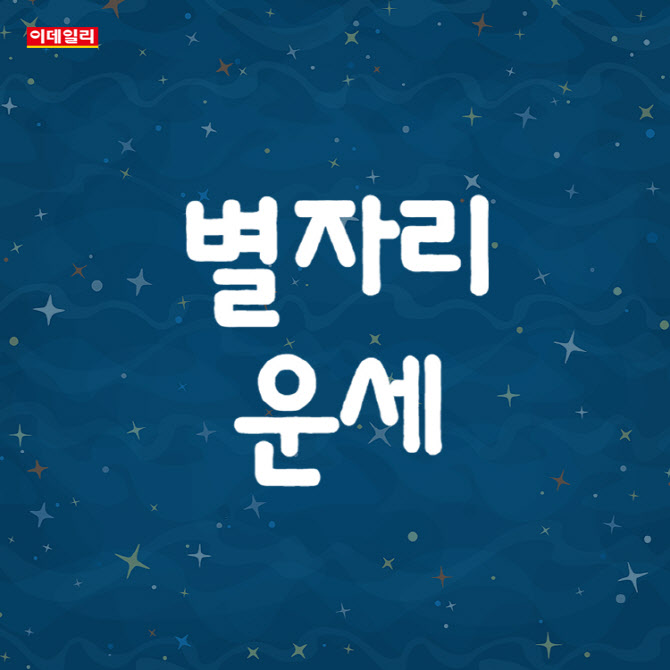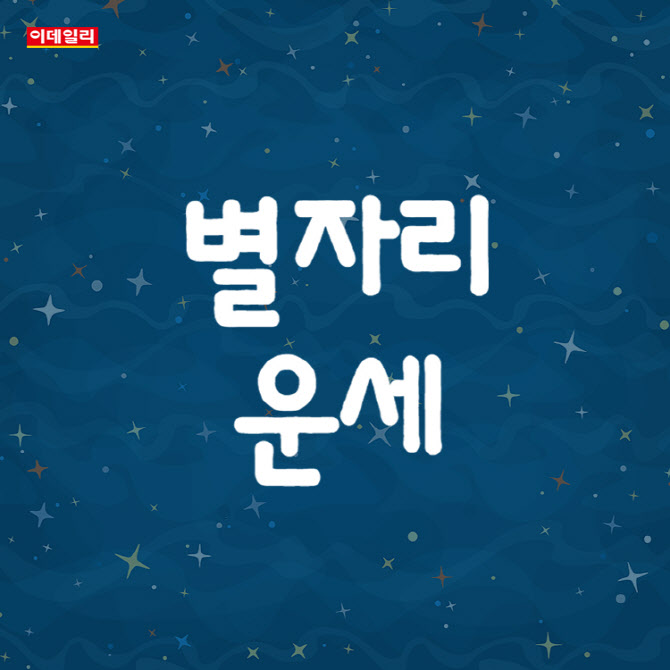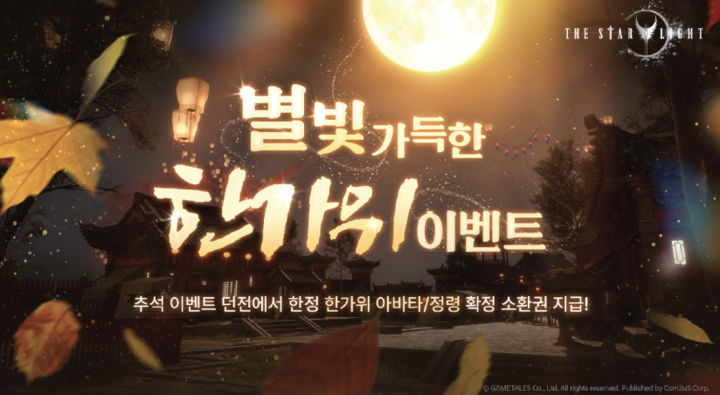1974년 신민당 총재 시절의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김영삼 기록관 제공) 2015.11.22/뉴스1
1979년 10월 4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당시 제1야당인 신민당 총재 김영삼의 국회의원직 제명 동의안이 여당인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의 단독 표결로 변칙 통과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이 사건은 결국 박정희 유신 체제 붕괴의 도화선이 됐다.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은 김영삼이 9월 16일자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발언이었다. 그는 "국민들로부터 멀어진 소수의 독재 정부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다수 국민이냐를 미국 정부가 명확하게 선택할 때가 왔다"며 미국에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 철회와 원조 중단을 촉구했다.
이는 '선명 야당'을 기치로 내세우며 유신 정권과 정면 대결해 온 김영삼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압박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다. 앞서 8월에는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이던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 진압 과정에서 노동자가 사망하고, 김영삼은 야당 총재직마저 박탈당하는 등 정권의 탄압이 이어지고 있었다.
여당은 김영삼의 인터뷰 내용을 '반국가적 언동' 및 '헌정 부정'으로 몰아 징계동의안을 제출했다. 10월 4일, 여당 의원들만이 비공개 회의장에 모였으며, 국회 경호권까지 발동한 가운데 제명안이 일사천리로 가결됐다.
제명 직후, 김영삼은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불굴의 의지를 담은 명언을 남기며 민주화에 대한 희망을 꺾지 않았다. 김영삼의 국회의원직 제명은 그를 지지하는 지역사회에 거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10월 16일부터 김영삼의 정치적 본거지인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는 유신정권 타도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 부마민주항쟁이 발생했다.
유신 정권은 부마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정권 내부의 강경파와 온건파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결국 부마항쟁 발생 열흘 뒤인 10월 26일, 박정희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서거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유신 체제는 종말을 맞았다.
acen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