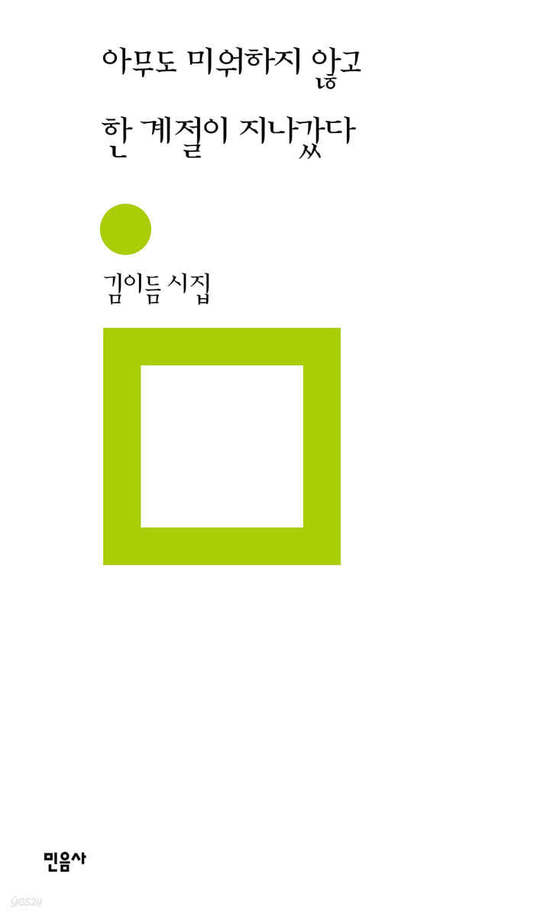
[신간] 시집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한 계절이 지나갔다'
김이듬 시인이 화재 이후의 상실과 반복되는 이별의 감각을 붙잡아, 미움을 유예하고 삶을 다시 설계하는 '재건의 언어'를 담아낸 시집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한 계절이 지나갔다'를 펴냈다.
이 시집은 불탄 집의 잔해와 무력해진 언어 속에서 말의 터를 고르고 기둥을 세우는 과정을 드러낸다. 완결된 성채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올리는 임시 구조물, 곧 '오지의 건축물'이 핵심 이미지로 자리 잡는다.
시인은 귀에 붙은 타인의 멜로디를 밀어내고 자기 음계를 복구하려는 의지가 선명하다. "처음 듣는 음악처럼 귀에 들어온다/네가 올 거니까/새벽은 더 이상 푸른 절벽이 아니고/밤은 더 이상 미완의 종말이 아니다"(17쪽). 이처럼 화자는 계절·시간·감각의 경계가 바뀌는 지점에서 세계를 다시 불러내면서 언어의 윤곽을 다시 그린다.
1부의 시편들은 '이 세상에 없는 것'에서 '한여름 저녁 한 시간 반'까지 상실 직후의 어지럼을 소음·날씨·맛·보행의 이미지로 엮었다. 산책의 보폭, 귤 껍질의 향, 공용어에서 빠져나오는 몸짓이 언어의 집을 다시 짓는 벽돌처럼 쌓인다.
2부는 '첫눈은 매년 첫눈이 된다'에서 '애프터눈 티'까지 계절과 사물의 배열로 삶의 온도를 조절한다. '가을 오후 네 시는 문상 가기 좋은 시간'(p.76) 같은 문장에서 죽음과 만남의 사이가 찻잔의 온도로 가늠되고, 이별의 형식은 장엄함보다 생활의 세밀함을 드러난다.
3부는 '재에 몸을 묻고' '오지의 건축물' '불탄 집 아래'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한 계절이 지나갔다'로 이어지는 핵심부다. 잿더미의 비유가 삶의 구조적 은유로 확장되며, 폐허에 머무르지 않는 방식이 반복된다. '미워하지 않기'는 무관심이 아니라 책임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으로 제시된다.
마지막 4부는 '여자와 사는 여자' '폭우가 우울을 부르지 않을 때' '가을하다' '입동 무렵'으로 호흡을 낮춘다. 관계의 서늘함과 계절의 출렁임이 같은 스펙트럼 위에 놓이고, 말의 힘을 과장하지 않으면서 침묵의 무게를 덜어 주는 리듬이 유지된다.
김이듬은 시·소설·산문을 넘나들며 국내외에서 주목받아 온 작가다. 전작에서 구축해 온 진정성과 현실 감각은 이번 시집에서 더 낮은 목소리로 울린다. '사랑스러워'와 '사랑해' 사이를 더듬던 언어가 파국 이후의 어휘들과 섞이며 새로운 감정의 문법을 만든다.
△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한 계절이 지나갔다/ 김이듬 지음/ 민음사/ 1만 3000원
art@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