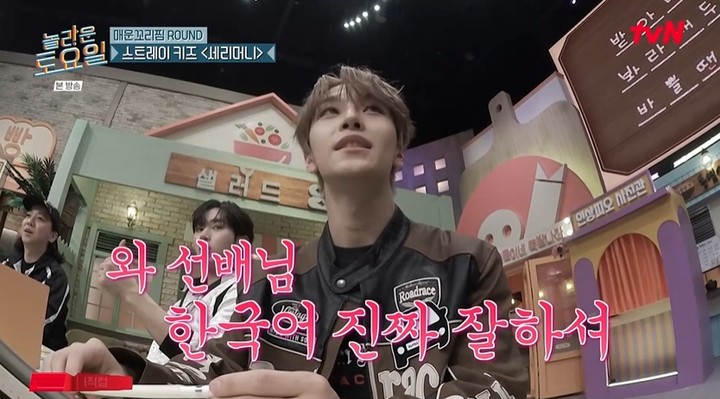정병웅 순창향대 관광학과 교수 겸 전 한국관광학회 회장
회의실 안에서는 ‘지역 소멸’이 논의되고 ‘수도권 집중’이 문제로 지적된다. 그러나 회의장으로 오는 길에서 이미 답은 나와 있다. 서울은 언제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이고, 지역은 늘 시간을 계산하고 각오를 해야 하는 곳이다. 이동의 비대칭성, 접근성의 불균형은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몸으로 확인된다.
지역균형발전을 광화문에서만 논의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행정의 편의 때문인가, 상징성 때문인가. 균형은 중심에서 외곽을 내려다보며 만들어지지 않는다. 균형은 중심을 벗어날 때 비로소 보인다. 국토의 지리적 중앙이든, 인문적 중앙이든, 혹은 국토의 변방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불편을 직접 경험하는 자리’에서 논의가 이뤄지는가 하는 점이다.
지역에서 서울로 오는 교통의 불편함을 실제로 겪어보지 않고서는 지역의 시간 감각을 이해하기 어렵다. 하루가 이동으로 쪼개지고, 회의 하나가 하루 일정 전체를 잠식하는 현실을 몸으로 느껴보지 않고서는 ‘지역의 삶’을 논하기 힘들다. 정책은 통계로 만들 수 있지만, 감각은 경험으로만 생긴다.
지금의 지역균형발전 논의는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숫자와 그래프, 인구와 예산의 문제가 오르내리지만, 정작 왜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는지에 대한 체감적 이해는 부족하다. 그 핵심에는 일상의 불편이 있다. 병원, 학교, 문화시설 이전보다 앞서는 것은 ‘이동의 불편’이다. 오고 가는 데 시간이 과도하게 들고, 선택지는 적으며, 기다림이 길어지는 순간 지역은 삶의 공간이 아니라 견뎌야 할 장소가 된다.
정책 회의의 장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그 자체가 메시지다. 늘 광화문에서만 회의를 연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중심은 여기, 지역은 대상’이라는 구도를 강화한다. 반대로 지역에서, 혹은 국토의 가장 불편한 지점에서 회의를 연다면 질문의 결은 달라질 것이다. 왜 막차는 이렇게 이른가, 왜 환승은 이렇게 많은가, 왜 하루 일정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그 질문 속에서야 비로소 현실적인 대안이 나온다.
지역균형발전은 선언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중심을 잠시 내려놓고 주변으로 이동할 수 있는가, 편리함을 포기하고 불편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가의 문제다. 지역을 살리겠다는 말은 그 지역의 시간과 리듬에 자신을 맞추겠다는 약속이어야 한다. 왜 우리는 여전히 광화문에서만 지역균형발전을 논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균형은 언제나 구호로만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