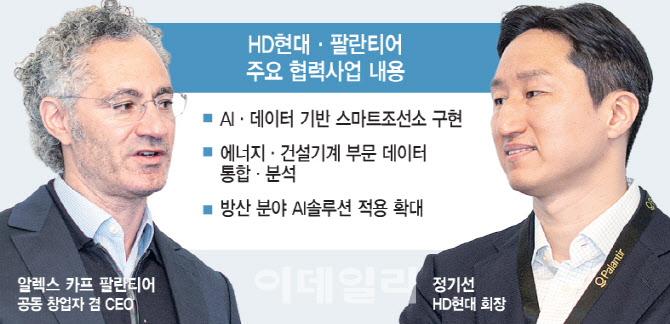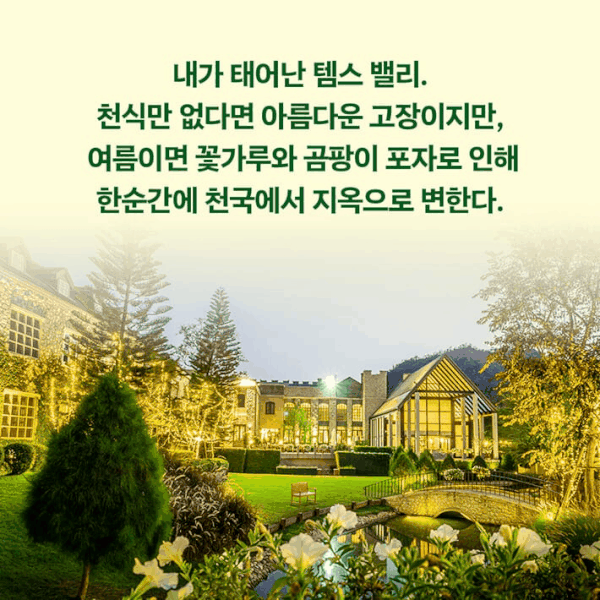
[신간] '인류와 함께한 진균의 역사'
세계적 균류학자 니컬러스 머니가 진균을 '적'이 아니라 '이웃'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안내서를 펴냈다. 피부와 폐, 장에서 시작해 치즈·빵·약·환각버섯, 그리고 자연의 순환까지 진균의 좋은 점과 조심해야 할 점을 균형 있게 보여 준다.
"우리 몸과 생활에 진균이 왜 필요할까"라는 먼저 간단한 물음으로 출발한다. 저자는 곰팡이·버섯·효모를 모두 '진균'이라고 부르며, 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온 오랜 역사를 들려준다.
머리 비듬을 만드는 효모, 발가락 사이 무좀을 일으키는 곰팡이처럼 낯익은 예로 문을 열고, 빵과 김치·치즈를 만들 때 쓰는 효모·곰팡이로 곧바로 이어 간다. 진균은 '무섭다'고만 볼 대상이 아니라, 때로는 유익하고 때로는 해로운 '이웃'이라는 시선이 책의 바탕이다.
책은 먼저 몸속 이야기부터 풀어낸다. 우리 피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진균이 산다. 보통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피부가 짓무르거나 발이 축축하면 무좀 같은 병으로 번진다. 폐로 들어오는 '포자'(진균의 아주 작은 씨앗)도 비슷하다. 대부분은 몸이 스스로 걸러 내지만, 알레르기가 있거나 몸이 약해지면 '진균성 천식'처럼 기침과 숨가쁨을 만들 수 있다.
장에서도 상황은 같다. 장에는 '마이코바이옴'(장에 사는 진균 무리)과 '마이크로바이옴'(세균 무리)이 함께 산다. 음식·습관이 나쁘면 균형이 깨져 더부룩함, 염증 같은 문제가 커질 수 있어, 식습관 조절이나 의학적 치료로 균형을 되돌리는 시도가 이어진다.
두 번째 흐름은 생활 속 진균이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효모와 곰팡이를 이용해 술·빵·치즈를 만들었다. 파란 곰팡이가 만든 진한 향의 블루치즈, 콩·곡물을 발효해 깊은 맛을 내는 전통 식품도 모두 진균의 솜씨다. 요즘에는 곰팡이를 키워 만든 단백질 '마이코프로틴'이 대체육 재료로 쓰인다.
의학에서도 진균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페니실린처럼 미생물이 만든 물질이 항생제로 발전했고, 버섯에서 얻은 성분이 면역을 조절하는 약이 되기도 했다. 반대로 독버섯·곰팡이독처럼 조심해야 할 것도 있다. 비슷하게 생겨도 독이 있는 종이 있어, '모르면 먹지 않는다'가 안전의 첫 원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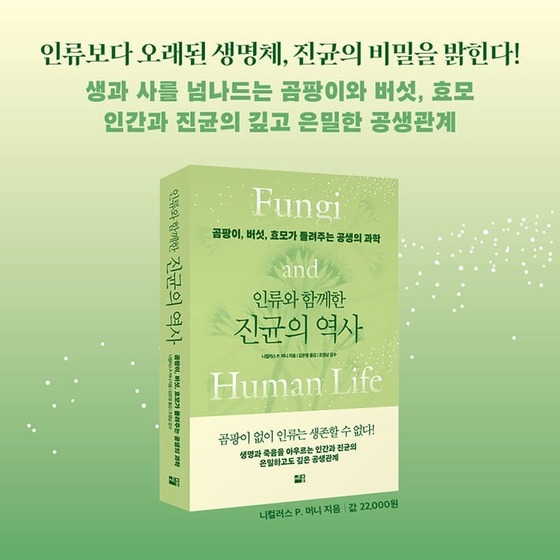
[신간] '인류와 함께한 진균의 역사'
세 번째 흐름은 마음과 의식의 문제다. '환각버섯'으로 알려진 사일로사이빈 버섯은 기분과 생각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최근 일부 나라에서 우울증 등 치료 연구가 진행되지만, 사용 방법·법·안전 문제가 얽혀 있어 섣부른 시도는 위험하다. 저자는 과학이 확인한 효과와 논쟁 지점을 차분히 나눠 소개한다. 핵심은 "전문가와 제도 안에서, 과학적 근거 위에서만 다뤄야 한다"는 점이다.
네 번째 흐름은 자연으로 향한다. 숲속을 떠올려 보자. 떨어진 나뭇잎과 죽은 동물을 분해해 흙으로 바꾸는 주역이 진균이다. 이 덕분에 영양분이 다시 나무와 풀로 돌아간다. 식물 뿌리와 진균이 서로 돕는 '공생'도 중요하다. 진균은 뿌리에서 물과 미네랄을 더 잘 빨아들이게 돕고, 식물은 진균에게 당분을 나눠 준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 어려울 뿐, 숲 바닥에는 거미줄 같은 '균사'가 넓게 퍼져 자연을 이어 준다. 최근에는 버려진 옷감·플라스틱·기름을 분해하거나, 토양을 회복시키는 데 진균을 쓰려는 시도도 늘었다. 죽음 뒤 우리 몸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마지막 순간에도 진균이 일한다. 자연의 순환에서 빠질 수 없는 '분해자'라는 뜻이다.
마지막 장은 우리 모두에게 숙제를 건넨다. 진균을 무조건 없애려 하기보다, 언제 도움이 되고 언제 해로운지 구분하자는 것이다. 손 씻기와 통풍, 발을 잘 말리기 같은 기본 수칙만 지켜도 많은 문제가 줄어든다. 음식·약·자연에서 진균이 하는 일을 알게 되면, "보이지 않는 동료"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겁이 줄고, 배려가 생긴다. 그 배려가 나와 가족의 건강, 그리고 지구의 건강으로 돌아온다.
△ 인류와 함께한 진균의 역사/ 니컬러스 머니 지음/ 김은영 옮김/ 조정남 감수/ 세종서적/ 2만 2000원
ar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