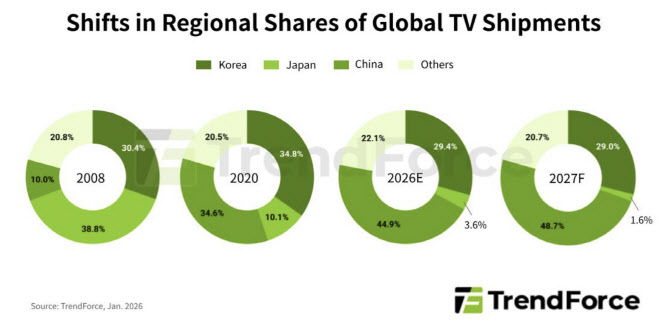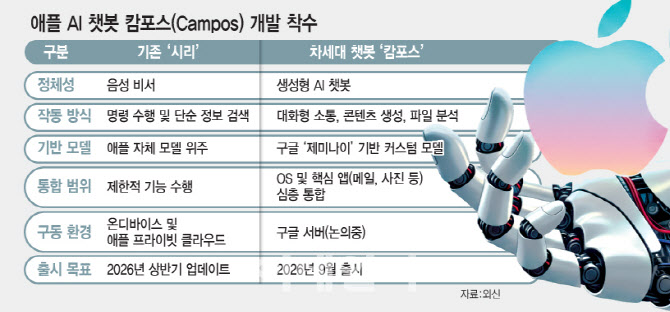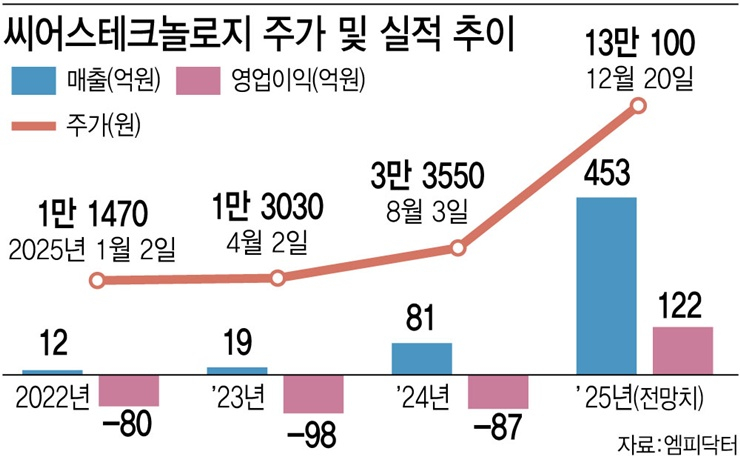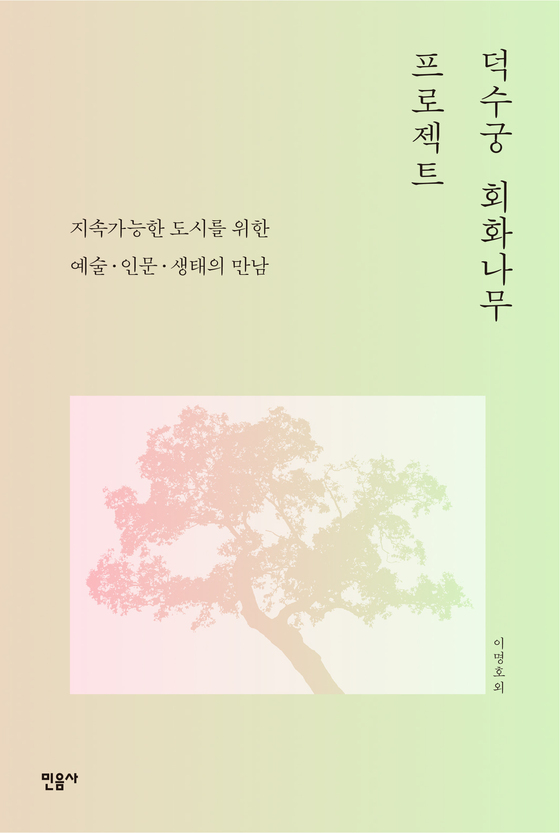
[신간] '덕수궁 회화나무 프로젝트'
한때 고사 판정을 받은 덕수궁 선원전 터 회화나무가 다시 잎과 꽃을 틔웠다. 사진·생태·법·조경·건축 전문가가 이 장면을 한 권에 모아, 도시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돌볼지 쉽게 설명한다.
덕수궁 선원전 터에는 오래된 회화나무가 서 있다. 일제강점기의 철거, 해방 이후의 화재와 방치, 2000년대의 큰 불과 고사 판정을 거쳤지만 2015년에 새순을 밀어 올렸다. 사람들은 놀랐고, 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 결과가 이번 책이다.
사진가 이명호는 공터에 홀로 선 노목을 정면에서 오래 바라본다. 그의 사진은 '보기 좋다'가 목적이 아니다. 잊힌 존재를 다시 가운데로 데려오는 일이다. 사진을 따라가면 도시가 스쳐 지나간 시간을 한자리에서 이해하게 된다.
"저 나무는 죽은 나무가 아니다"라는 선언이 연구자들의 주제를 분명히 한다. 생태학자는 나무를 '시간·공간·사람'이 얽힌 하나의 생명으로 본다.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 준다. 법학자는 인간만 중심이 아닌 '지구법' 관점을 제안한다. 나무와 동물, 땅과 물도 함께 사는 구성원으로 보자는 뜻이다. 말은 간단하지만 도시 정책을 바꾸는 중요한 시선이다.
궁궐 복원 파트는 '왜 복원이 필요한가'를 실용적으로 설명한다. 빈터만 남기면 식민지 시기의 흔적이 더 크게 보인다. 건물과 정원을 고증해 되살려야 전체 맥락이 보이고, 방문객도 역사를 몸으로 느낀다. 전통조경 글은 원형 경관을 조사하고, 어떤 나무를 어디에 어떻게 심고 가꿀지 기준을 세운다. 복원은 과거 흉내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리'의 출발선이라는 메시지를 준다.
도시 경영과 브랜딩에 관한 제안도 명확하다. 유산을 보존하는 일은 일부 구역의 일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과제다. 시민이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서사를 만들고, 방문자가 다시 찾게 하려면 예술·학술·행정이 함께 계획해야 한다. 회화나무를 둘러싼 협업은 그 첫 사례로 소개된다.
결국 나무 한 그루를 통해 '기억을 잇는 법'을 보여 준다. 회화나무의 회생은 우연이 아니라, 기록과 연구, 현장의 손길이 모인 결과다. 독자는 사진과 쉬운 글을 따라가며 묻게 된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답은 복원된 공간에서 시작된다.
△ 덕수궁 회화나무 프로젝트/ 이명호 외 지음/ 편역 표기 없음/ 민음사/ 2만 2000원
ar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