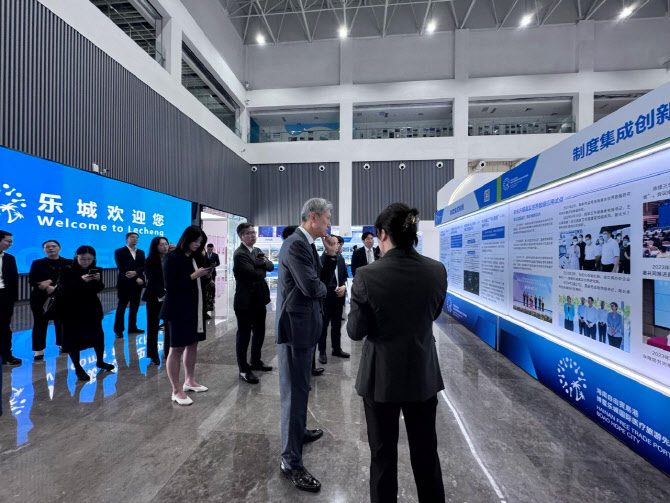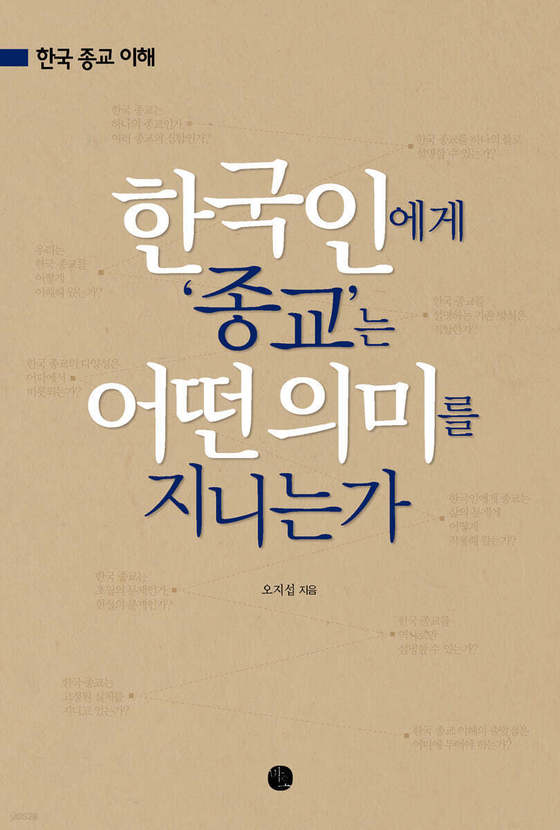
[신간] '한국인에게 종교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오지섭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부원장은 "한국 종교가 무엇인가"를 묻지 않는다. 오 부원장은 "한국인의 역사와 오늘의 삶에서 종교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묻고 이 책에서 답했다.
이 책은 종교를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일상의 기준과 공동체의 약속으로 다시 살펴본다. 아울러 종교를 사람의 마음과 행동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는 '의미'로 본다. 그래서 종교를 공부할 때도 교리만 나열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의 기본 틀은 '신앙'과 '축적된 전통'이다. 신앙은 한 사람이 느끼는 깊은 마음의 경험을 뜻한다. 축적된 전통은 오랜 시간 쌓인 제도·예식·가르침이다. 이 둘이 만날 때 종교는 힘을 얻는다.
한국인은 대개 하나의 종교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유교의 예의·책임, 불교의 자비, 무속의 치유, 그리스도교의 사랑과 봉사를 함께 실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태도를 책은 '중첩적 포용'이라고 부른다.
저자는 역사의 흐름도 간단히 짚는다. 고대의 '하늘을 섬기는 마음'은 자연과 사회의 질서를 함께 세우려는 뜻이었다. 신라의 '화쟁'은 서로 다른 생각을 싸움이 아닌 대화로 풀어 공동체를 묶으려는 시도였다. 조선의 성리학은 초월을 먼 곳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예'라는 생활 규칙으로 사회를 꾸렸다. 이렇게 종교는 시대마다 사회를 움직이는 기준을 만들었다.
근대로 올수록 종교의 변화가 빨라진다. 서학(그리스도교 사상)의 수용은 인격을 존중하고 약자를 돕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동학의 '시천주'(하늘이 내 안에 있다)는 사람 한 명 한 명의 존엄을 깨우쳐 사회 변화를 일으켰다. 교회와 여러 종교 단체는 학교·병원·구휼과 같은 공적 활동을 넓히며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키웠다.
저자가 짚어낸 결론은 '공공성'이다. 공공성은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함께 좋은 것'을 말한다. 종교가 개인의 소원만 바라보면 힘을 잃는다. 공동체의 아픔에 응답하고 공정한 기준을 세울 때 비로소 신뢰를 얻는다. 한국 종교의 여러 순간에서, 초월의 가치를 빌려 현실의 문제를 고치려 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
결국 종교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이다. 정직·책임·자비·공정 같은 기본을 삶에 적용하는 일, 서로 다른 전통을 존중하고 함께 길을 찾는 일—그 자체가 종교의 의미다.
△ 한국인에게 종교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오지섭 지음/ 바오출판사/ 2만원.
ar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