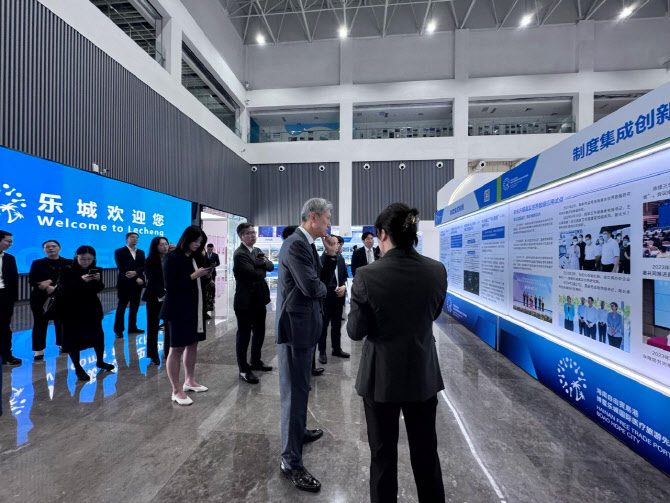[신간] '사막의 바다'
사이보그 용병 오하나는 2056년 다국적기업 SG의 의뢰를 받는다. 오하나는 사막에 호수를 만드는 '사막의 바다' 프로젝트를 공개 반대한 해양생명공학자 아이서를 추적한다. 소설 '사막의 바다'는 기후 재난을 되돌리겠다는 거대한 계획 앞에서 두 여성의 추격과 동행을 오가면서 기술·자본·국가가 만든 위기의 진짜 얼굴을 파헤친다.
오하나는 거대기업 SG가 원하는 답을 쫓아 사막으로 들어간다. 아이서는 프로젝트가 '인류 구원'이 아니라 돈을 위한 장치라고 본다. 아이서의 말은 거칠다.
"저 회사는 더 큰 목적을 위해 뼈아픈 희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험을 성공시키는 것보다 지원금을 받고 주가를 올리는 게 더 중요한 회사예요."(53쪽)
이 소설의 배경은 '너무 늦은' 미래다. 기후 위기 시계의 시한이 지나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을 넘기는 일이 확정되자, 인류는 해결에 매달리기보다 전쟁을 벌인다. 전쟁은 무기를 부르고, 무기는 인간을 바꾼다. 오하나는 총과 계약서가 뒤섞인 시대에서 회사의 도구가 된 인간 병기다.
SG은 위구르스탄 지역 사막 한가운데를 깊이 파, 지하의 염수를 끌어 올려 거대한 호수를 만들고자 한다. 그 호수에서 신종 해조류를 길러 대기 중 탄소를 대량 흡수하면 기후 재난을 되돌릴 수 있다는 논리다.
아이서는 이 논리가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물을 끌어 올리는 양만으로도 지반이 버티지 못해 타클라마칸사막이 붕괴하고, 인근 마을이 함께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야기는 단순한 체포전에서 이해 싸움으로 양상을 달리 한다. 오하나는 계약을 믿는 쪽이고, 아이서는 결과를 믿는 쪽이다. 둘은 서로를 믿지 못하면서도, 상대가 없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을 통과한다.
소설은 여기서 한 번 더 묻는다. "역사가 있다고 같은 짓을 되풀이하지 않았다면 인간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라는 표현처럼 과거의 실패를 알면서도, 같은 방식으로 돈과 힘을 좇는 사회를 비춘다.
아이서는 오하나를 버려두지 못하고, 신유목민이자 네오노마드인 세미라의 도움을 받는다. 살아남기 위한 기술과 고치기 위한 손이 필요해지고, 생태해방전선의 타티아나와 수리 기술자 스테판이 합류하며 '프로젝트 현장'에 접근한다. 그곳에서 보이는 건 구원의 실험실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설비와 통제다.
작가의 문제 제기는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쓰는 방식'이다. 아이서는 신기술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 자체를 경계한다. "신기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희망 아닐까요… 우리의 생활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우리에게 묻는다. 여기서 '기술이 핑계가 된다'는 표현은 쉽다. 지금대로 살아도, 누군가의 새 발명품이 다 수습해 주리라는 기대가 변화를 미루게 만든다는 뜻이다.
소설은 경제의 문법도 숨기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기업들은 돈 벌 궁리를 먼저 한다는 대사는, 기술 낙관의 뒤편을 드러낸다. '재생에너지 산업'조차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이 문제였다고 지적한다. 결국 좋은 목표를 내세워도, 운영 방식이 예전 그대로면 결과도 예전과 비슷해진다.
소설은 끝으로 갈수록 개인의 선택이 국가와 기업의 힘에 부딪힌다. 기업의 프로젝트가 과학이 아니라 정치·안보·자본의 게임판 위에 놓였음을 알린다. 동시에 희생의 언어도 등장한다. "사람들은 피가 흘러야 쳐다본다"는 체념은, 경고가 무시되는 사회의 잔혹한 습관을 보여준다.
소설 '사막의 바다'가 마지막에서 던지는 질문은 "정말로 큰 위기가 있어야만 인류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걸까"로 요약된다. 더 편한 해법, 더 빠른 수익, 더 강한 통제에 기대는 습관을 끊지 못한다면, 다음 기술도 다음 재난도 같은 길을 밟을지 모른다는 경고다.
△ 사막의 바다/ 이수현 지음/ 한겨레출판/ 1만 7800원
ar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