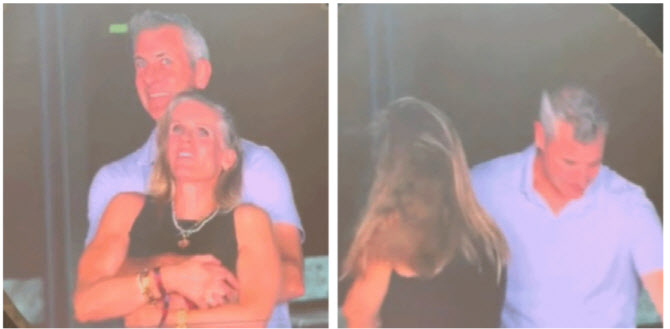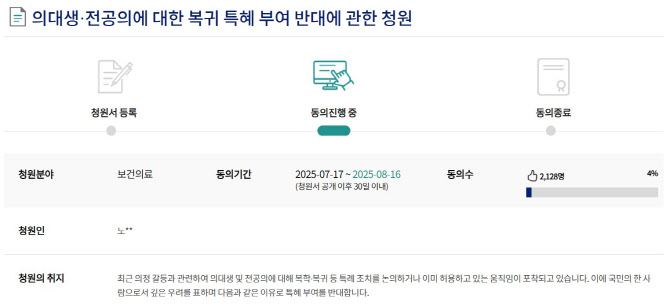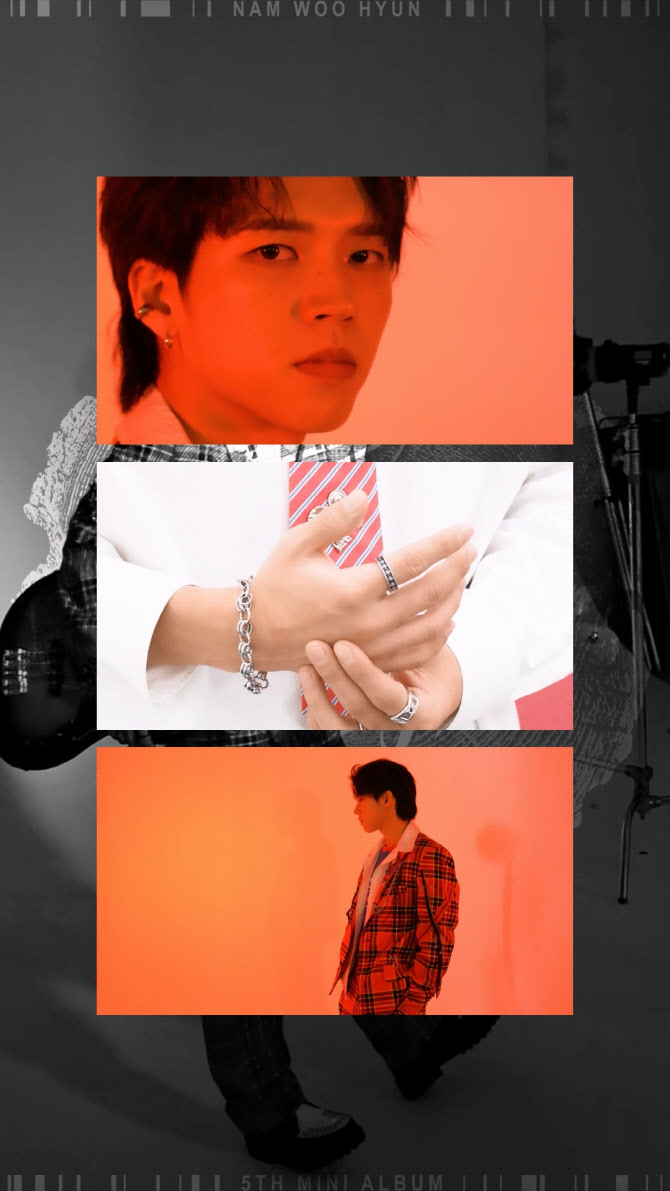[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23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정의하고, 발행 자격을 은행·자금이체업자·신탁회사 등으로 한정했다. 발행자가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에는 준비금의 전액을 요구불예금으로 보관하도록 해 자산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2025년 추가 개정을 통해 일부는 저위험 국채나 단기 예금 등으로 운용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유연성도 확보했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눈에 띈다.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통해 암호자산 교환업자에게 이용자 자산의 국내 보유를 의무화하는 한편, 교환업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암호자산 중개업’도 신설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 서비스까지 포섭하고 있다. 중개업자에게는 설명의무와 광고규제를 부과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투자대상으로서의 암호자산은 금융상품거래법이 담당한다. 일본은 2019년 개정을 통해 증권형토큰(STO)을 금융상품으로 명시하고, 발행사에 공시의무를 부과했고, 향후 자금조달형 암호자산과 비자금조달형 암호자산을 구분해 공시 및 설명의무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암호자산 내부자거래 금지 등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를 위한 디스커션 페이퍼도 발간했다.
반면 한국은 현재 특금법과 가상자산법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자산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발행·유통 등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의돼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포함)의 인가제 도입과 업권별 진입규제, 공시 및 불공정거래 금지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논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내 금융당국도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난립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명확한 제도 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 일본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경희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암호자산 시장의 변화를 기존 법체계 내에서 흡수하며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 자격, 준비금 관리, 중개업 신설 등은 우리나라가 제도 정비 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