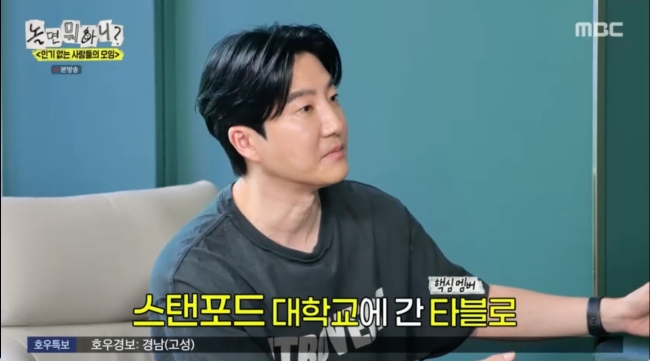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이 단순히 권위주의적 경제개발의 산물이 아니라, 포용적 제도의 축적과 역사적 특수성이 맞물린 결과라고 진단했다.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와 네이선 넌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가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유준하 기자)
로빈슨 교수는 우리나라의 1940~1950년대 농지개혁을 경제 성장의 핵심 분기점으로 꼽았다. 그는 “토지 재분배는 사회적 이동성을 크게 높였고, 이후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박정희 시기의 국가 주도 개발 전략은 기존 경제학 교과서에선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지만, 결과적으로 산업화를 폭발적으로 가속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발전에 집착한 지도자를 얻은 건 일종의 역사적 행운”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한국 경제의 성장이 권위주의 덕이라는 통념에는 선을 그었다. 로빈슨은 “한국은 민주주의와 고도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는 희귀한 실증 사례”라고 평가했다. 초기 우리 경제의 발전은 국가 주도 개발 하에 가능했을 지 모르겠으나 민주주의로 빠르게 이행하면서 지속적인 발전 경로를 밟을 수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한국과 동아시아가 보여준 발전 경로는 서구식 자본주의 발전 모델과는 다른 성격을 띤다고 덧붙였다
로빈슨 교수는 “가족기업 같은 관계 중심적 제도가 경제학적으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한국에선 성장 동력이 됐다”며 “자본주의 발전에는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에 맞는 다양한 경로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동아시아는 서구와는 다르지만 더 질서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발전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며 “반대로 미국은 최근 상황을 보면 제도적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포용적 제도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앞으로 세계 경제 발전과 관련해서는 아프리카를 주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프리카의 잠재력은 엄청나다. 나이지리아는 에너지와 기업가 정신이 넘치지만 지금은 낭비되고 있다”면서 “만약 중국의 1978년처럼 개혁의 방향만 제대로 잡는다면 수십 년간 연 10%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로빈슨 교수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 사이먼 존슨 교수와 함께 제도(institution)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한 제도경제학의 권위자로, 사회적 제도가 국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