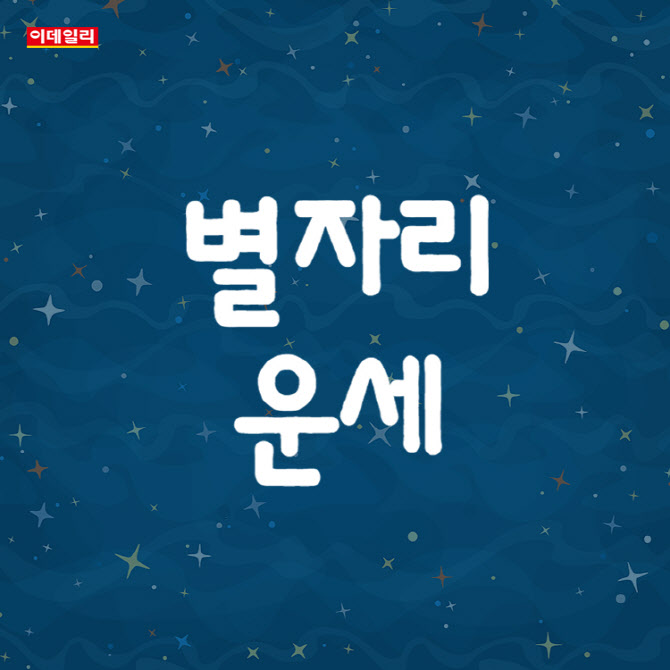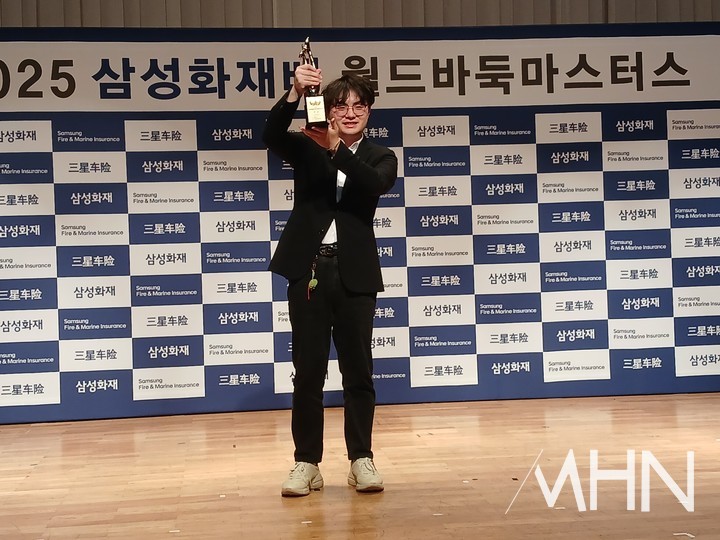대구의 한 제조업체 A사는 최근 글로벌 산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제조 AI’를 두고 “생산공정만 해도 인공지능(AI)으로 전환하려면 데이터 축적을 위한 라벨·센서 부착, CCTV 설치, 데이터 정제뿐 아니라 이를 기획하고 활용하는 비용, 로봇 운영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구축, 관련 인력 투입 등까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기업 74% “AI 투자비용 부담된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제조 AI 투자 부담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업 10곳 중 8곳은 AI를 경영에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소기업은 4% 남짓 정도만 활용했다. 이 때문에 현실성 있는 AI 전환 정책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504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응답 기업의 82.3%는 “AI를 경영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AI 활용은 개인 단위의 생성형 AI 사용이 아니라 기업 차원의 생산·물류·운영 등 AI 솔루션 도입·활용 여부를 뜻한다. 특히 대기업(49.2%)보다 중소기업(4.2%)의 AI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다.

(출처=대한상의)
인력난 역시 문제다. AI 활용 전문인력에 대한 질문에 응답 기업의 80.7%는 “없다”고 했다. 또 82.1%는 “AI 인력을 충원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내부직원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전환한다는 기업(14.5%)과 신규 채용한다는 기업(3.4%)은 17.9%에 불과했다.
스탠퍼드 HAI 조사에 따르면, 2013~2024년 한국 AI 투자액 순위는 세계 9위다. 그러나 2024년 기준 AI 인재 1만명당 0.36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국의 AI 인재는 2만1000명 수준으로 중국(41만1000명), 인도(19만5000명), 미국(12만명)에 비해 턱없이 적다”면서 “절대적인 숫자도 적은데 그나마 있는 인재조차 빠져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출처=대한상의)
◇“AI 효과성 체감 실증 사례 나와야”
이에 대한상의는 현실성 있는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손에 꼽은 게 기업 자율성을 높이는 맞춤형 정책이다. 이를테면 정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그래픽저장장치(GPU)·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데이터 접근성 강화 등에 대해 용처를 세세하게 제한하기보다 기업이 자체 프로젝트에 맞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AI 활용도가 높은 기업들은 자사 전략에 따라 유연하게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AI 도입률이 낮은 기업의 경우 단계별 지원이 중요하다는 게 상의의 제언이다. △도입 전 단계에서는 업종·규모별로 적합한 AI 활용 모델을 진단·설계해주는 컨설팅 △도입 단계에서는 데이터 수집·정제, 알고리즘 적용 등 실무 중심의 기술 지원 △도입 후 단계에서는 기업 내 실무자가 지속적으로 AI를 운용할 수 있도록 실습 교육·현장 멘토링 체계 구축 등을 차례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많은 기업들이 AI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증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를테면 산업통상부는 제조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AI 팩토리를 500개 이상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 64.1%는 AI 활용 목적을 두고 “생산 효율화”를 꼽았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지금은 AI에 대한 미래 조감도를 정교하게 만드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실제 데이터 축적과 활용, 인재 영입 등에 뛰어들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모델 공장, 솔루션 보급 등 제조 현장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더불어 강력한 지원, 파격적인 규제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