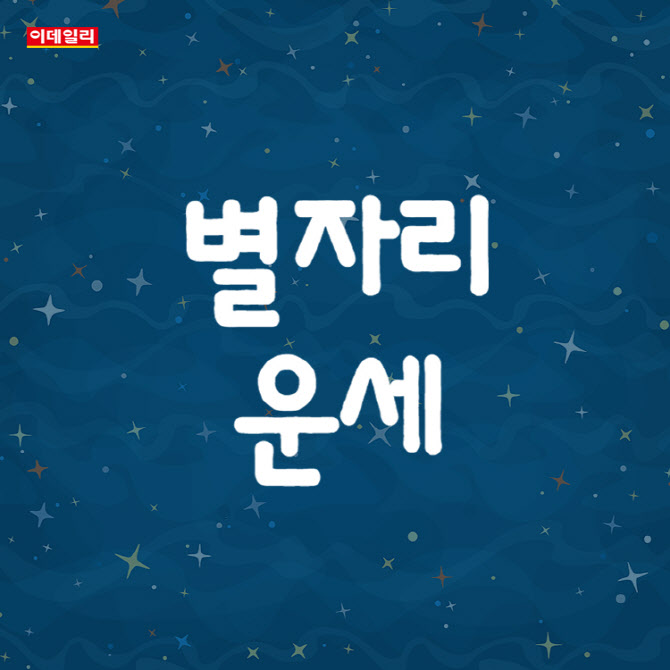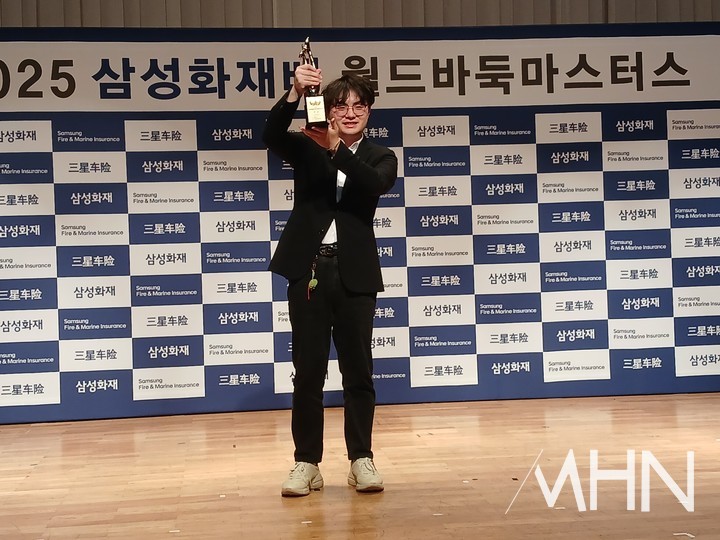평택항 자동차 전용 부두에서 현대글로비스 운반선이 차량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현대글로비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16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미 협상 타결에 따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마련해 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완성차 업계의 속내는 25%에서 10%로 내린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0%에서 15%로 전에 없던 짐이 생겨 부담이라는 분위기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원래 대미 수출 관세가 2.5%였다가 15%로 12.5% 상향됐는데 우리는 한미 FTA에 따라 0%에서 15%로 오른 것”이라며 “15%라는 숫자는 일본·EU와 같지만 부과 같지만 실은 토요타, 폭스바겐보다 미국에서 2.5% 손해를 더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대미 수출을 대부분 책임지는 현대차·기아의 수익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IBK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대미 자동차 관세 15% 부과시 양사 합산 부담 금액은 월 4660억원, 연 5조5960억원에 달한다. 25% 부과시 연 9조3260억원보다는 낫지만 5조원이 넘는 이익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증발하게 되는 셈이다.
결국 미국 외 수출 지역 다변화로 풀어야 하나 중국 자동차의 급부상이 부담이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 경쟁력을 ‘100’으로 가정할 시 올해 기준 중국의 자동차 및 부품 경쟁력은 ‘102.4’로 한국보다 높았다. 2030년 중국 자동차의 경쟁력은 114.8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외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해야 하지만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2017년 9700만대 피크를 찍고 코로나19를 거치며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 과도기에서 중국차가 빠르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 위협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가 우위에서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다 중국 정부가 내수 시장 구조조정 정책을 펼치며 중국차의 해외 공략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생태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중소 부품업체 지원책과 함께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통해 관세 뉴 노멀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관세를 떠안는 열악한 부품업체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별도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며 “최근 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하고 있는데 높은 법인세, ‘노란봉투법’ 같은 반 기업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