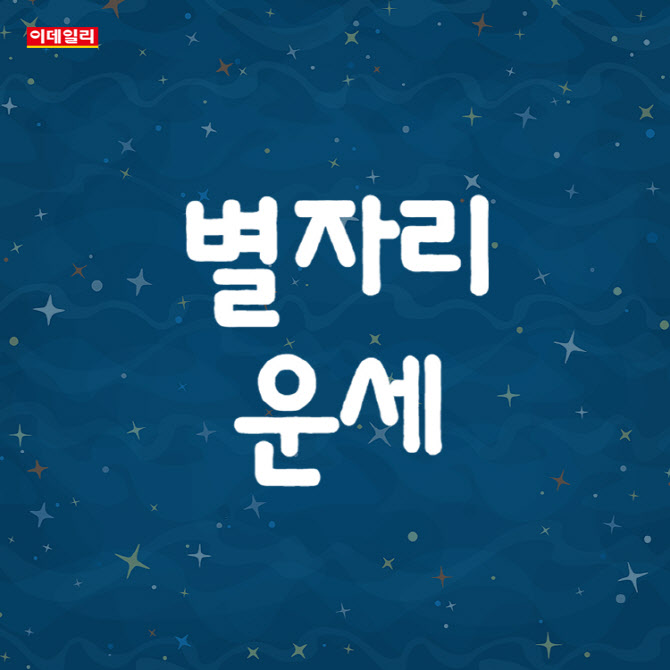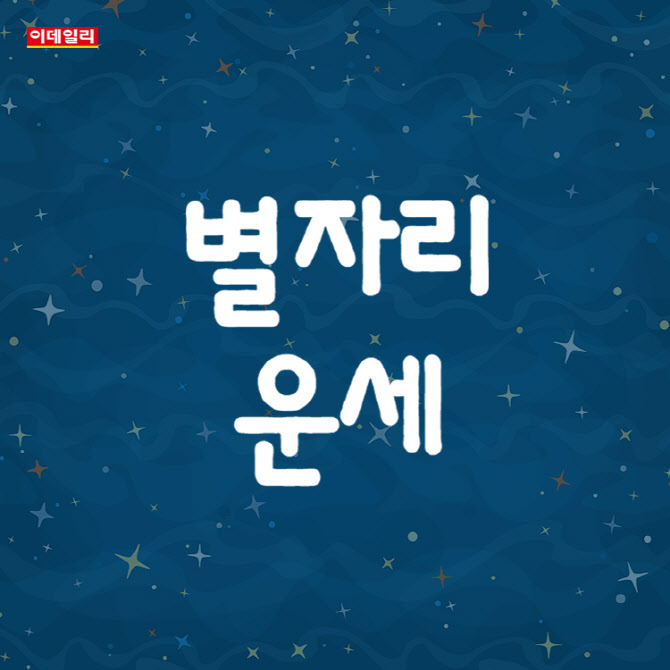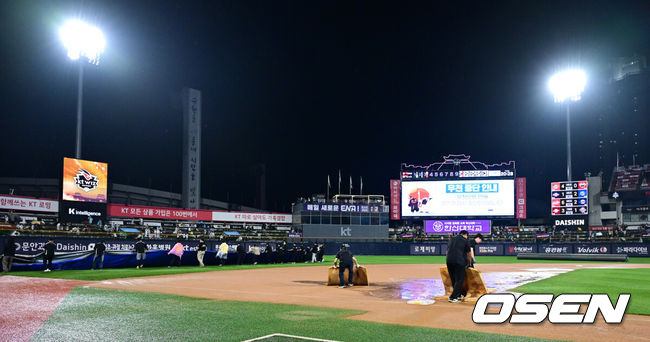정부가 15일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최대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을 물리고 3년간 영업정지 2회 이후 추가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등록 말소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자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산업안전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수백억원대 과징금과 영업정지까지 겹치면 기업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의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영업이익률이 한 자리 수에 불과한데 과징금과 영업정지까지 겹치면 기업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이는 단순히 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현장 근로자와 산업 전반에 파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금 유동성이 좋지 않은 회사들은 과징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빚을 내서 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현장 규모를 감안하지 않은 일괄 규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설 현장 수와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연간 3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대형사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이 1000개인 회사와 100개인 회사를 같게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10대 건설사 중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현장 수가 많을수록 사고 위험도 커지는데 이를 무시한 제재는 신규 수주를 꺼리게 하고 건설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견·중소 건설사 역시 비슷하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처럼 퇴로 없는 규제만 내놓으면 기업들이 분할 같은 편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산업 전반의 건전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근’ 없는 규제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는 자동화 설비나 모듈러 공법 같은 신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안전 투자에 대해 세제·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등 기업이 적극적으로 안전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대책에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확보 방안을 포함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 발주는 공기를 늘리고 관리비를 보전할 수 있지만 민간에는 유인책이 전혀 없다”며 “민간 프로젝트에는 금리 인하나 별도의 인센티브를 마련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대책이 처벌 강화 일변도의 정책을 실제 건설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규제만으로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안전교육 강화와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개선 등 선제적 조치와 함께 이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리 규정을 강화해도 현장에서 지키기 어렵다”며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사회적 비용으로 인정하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