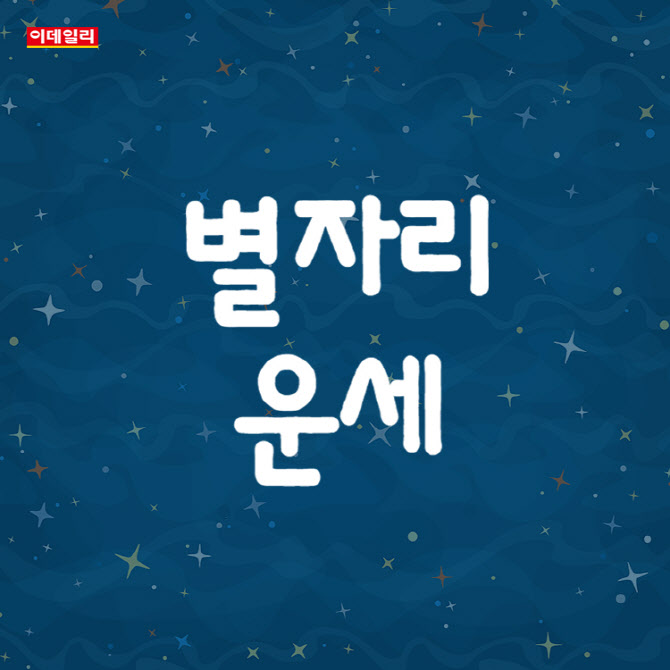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모습. (사진=이영훈 기자)
이에 당국은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세금을 통한 규제다. 다만 그 방법을 두고 국토부·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다소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개인 입장임을 전제하며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지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집값을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간접적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다. 보유세 개편 등은 부동산 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방안이다. 반면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법 개정 없이 부동산 세수를 늘릴 수 있다. 게다가 증세가 아닌 형평성과 조세 정의라는 명분도 있다.
올해 평균 시세반영률(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69%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가동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며 해당 로드맵은 사실상 폐기되며 로드맵 가동 이전 수준인 69%로 돌아갔다. 여당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중단은 내란에 준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가동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각종 부동산 세제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과세표준은 시가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결정된다.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지난 문재인 정부(95%) 당시보다 낮아진 수준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에서 정한 비율(60~100%) 내에서 시행령만 고쳐도 즉시 적용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에만 적용된 상황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5배 높은 곳이, 조정대상지역은 1.3배 이상인 곳이 지정대상이다. 규제지역은 9·7 공급 대책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됐다. 현재 가격이 치솟고 있는 성동·마포 등 한강벨트 권역과 경기 성남 분당구 등이 규제지역 대상지로 거론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체계 내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다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현재 은행권 기준으로는 40%를 초과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이 한도 자체를 낮추거나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그동안 예외로 둔 영역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공급이 없이 내놓는 규제는 단기적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핵심 입지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대출 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은 시장을 눌러놓는 효과에 불과하다”며 “신속한 정비사업 인·허가, 공공·민간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역시 “단기적인 수요 억제 효과는 있다고 보나 주택 공급 감소 우려가 커 효과 장기화는 제한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