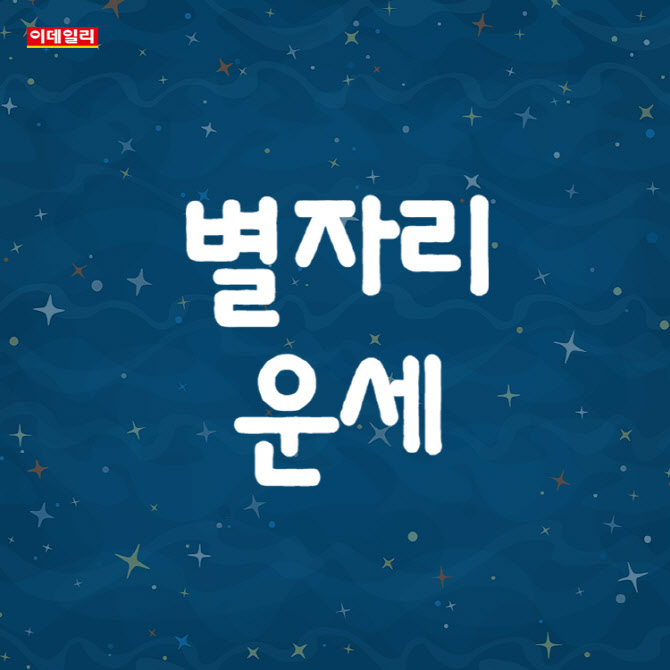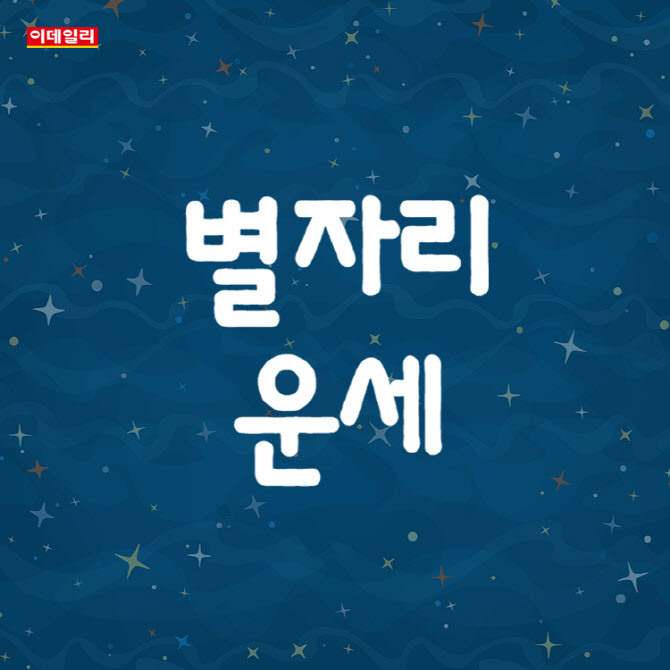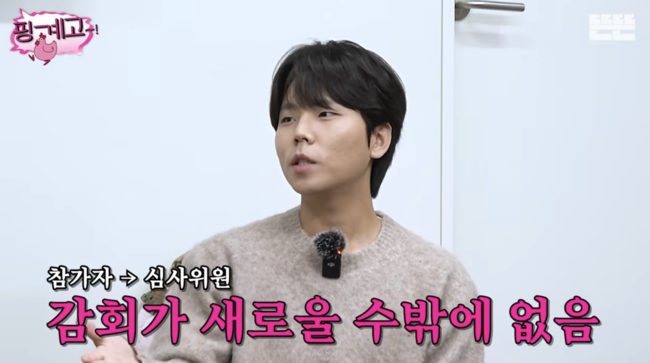우리나라의 궤적은 다르다. 고용은 줄었고, 산업 체질의 구조 전환은 더디다. 인력난이 심화되는데도 해법은 기술 전환이 아닌 임시 파견과 외주화에 머문다. 미국이 노동 구조를 재설계하는 동안, 우리는 낡은 구조를 연명한다. 이 간극이 곧 산업 경쟁력의 차이다.
◇회복의 속도가 감춘 함정
미국 건설노동시장의 회복은 단순한 고용 증가로 읽어낼 수 없다. 숙련공 비중이 2005년 71%에서 2022년 61%로 하락한 것은 생산성과 품질 저하로 직결된다. 반면, 관리직과 공학직의 증가는 프로젝트의 복잡도 증가와 디지털 전환을 반영한다. 건설은 정밀한 데이터 분석과 시뮬레이션, 자동화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국내 건설산업의 위기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부족한지,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전환할지에 대한 고민이 실종됐다는 점이다. 인력난을 비용 문제로만 인식하는 한, 산업은 미래를 상실한다.
◇중간층의 붕괴, 기술 전수의 단절
미국 건설현장은 세대 양극화를 겪는 중이다. 25~54세 중심층은 감소하고, 55세 이상 고령층과 25세 이하 청년층이 동시에 증가했다. 숙련 중간층의 붕괴는 기술 전수 단절로 이어지고, 생산성과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도 동일한 궤도를 밟고 있다. 젊은 기술직 입직자는 급감하고, 베테랑 기능공은 현장을 떠나지 못한다. 그러나 대응 방식에서 양국의 차이가 드러난다. 미국은 이 문제를 ‘지속가능성 리스크’로 정의하고, HBI 같은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3년간 72만 명 양성 계획을 가동 중이다. 교육·훈련·자격 체계를 산업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다.
반면 국내는 숙련공을 ‘노무비 항목’으로 취급한다. 구조적 인력난을 임금 인상이라는 단선적 비용 문제로만 읽는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오인한 것이다.
미국 건설고용의 지역 분포는 남부·산악지대의 성장과 서북부의 둔화로 양분된다. 루이지애나는 13.3%, 켄터키는 9.3% 급증한 반면, 캘리포니아는 6.4% 역성장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인프라법과 주택 정책의 지역 맞춤화를 통해, 지역 단위 인력 양성과 이동성 확보를 산업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았다. 지역은 단순한 건설 현장이 아니라, 숙련 형성과 기술 확산의 거점이 되었다.
우리도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력난의 격차가 극심하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공공사업의 분산이 아니라 ‘숙련의 분산’이다. 기술자·관리자·디지털 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구조에서, 지방 건설업은 하청 구조의 말단으로 고착된다. 미국이 지역을 산업 거점으로 만드는 동안, 한국은 지역을 산업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미국 건설산업은 2005년 이후 화이트칼라 직군이 지속 확대됐다. 관리직은 전체의 10%에서 16%로, 공학·과학직은 1.3%에서 2.7%로 증가했다. 규제 복잡화, 대형 프로젝트 증가, 디지털 전환이 이 변화를 가속했다. 건설은 이제 데이터를 설계하고 AI로 관리하는 산업이 되었다.
국내도 AI·자동화가 일부 도입되지만, 주로 설계나 마케팅 등 비현장 분야에 국한됐다. 현장 생산성 혁신으로는 연결되지 못했다. 미국이 노동집약 산업을 기술집약 산업으로 전환하는 동안, 한국은 ‘현장 중심’이라는 이름의 수직적 산업질서에 갇혀 있다. 이는 기술 도입 속도의 차이가 아니라, 산업 체질 자체의 격차다.
미국 건설노동시장의 변화는 숫자의 경쟁이 아니라, 사람의 재구성에 대한 이야기다. 수백만의 임금근로자, 쏟아지는 이민자 비중, 급증하는 여성과 화이트칼라 인력. 이 다층적 노동 구성이 산업의 회복력을 만든다.
우리가 이 교훈에서 얻을 것은 ‘더 많은 일자리’가 아니라 ‘더 다른 일자리’다. 숙련의 세대 교체, 기술의 민주화, 지역의 자생력. 이 세 축이 맞물릴 때 비로소 국내 건설산업도 생존을 넘어, 지속가능성의 궤도에 오를 수 있다.
미국의 변화는 완벽한 모델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미래는 사람을 배제하는 자동화가 아니라, 사람을 재배치하고 재교육하며 재평가하는 전환에 달렸다. 우리 건설산업이 서 있는 지점은 선택의 기로다. 낡은 구조를 연명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 자체를 재설계할 것인가.

문지형 알스퀘어 대외협력실장(사진=알스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