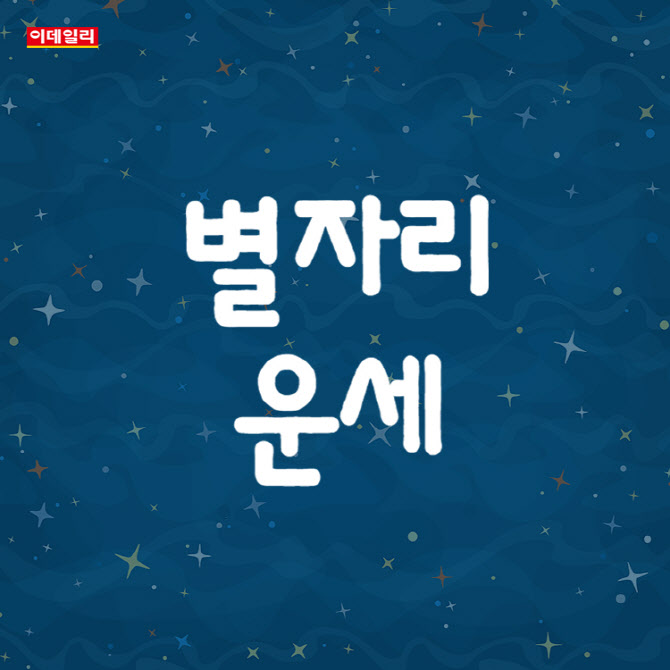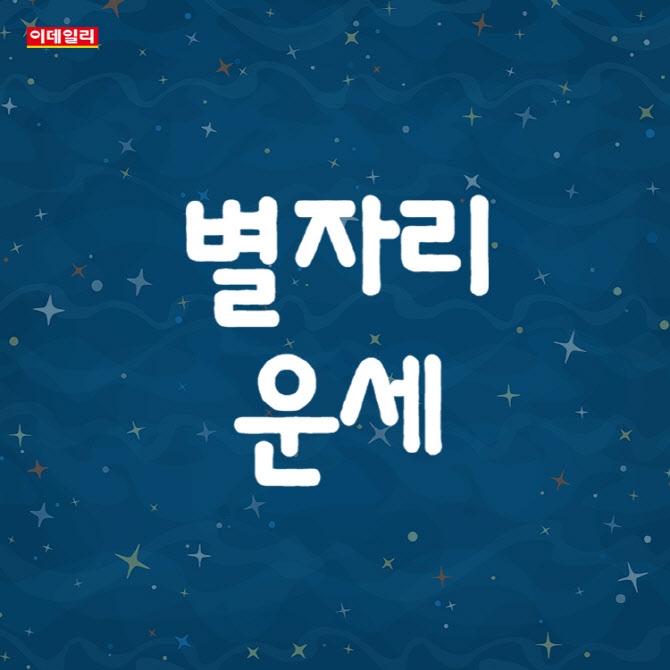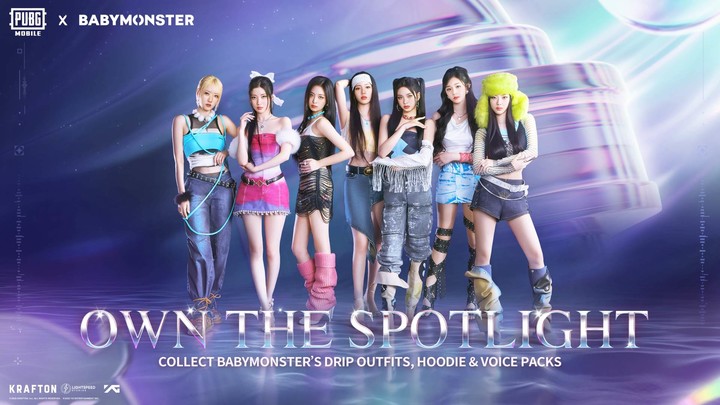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연간 입주량은 2026년 2만가구 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공급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의 공급 한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구간이다. 수요는 인구·일자리·교통망 집중 등으로 유지되거나 강화되고 있는데, 공급만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는 구조다. 이런 환경에서는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영역이 바로 재개발이다. 재개발만이 기존 주거지를 신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구조적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은 어디가 오르는가가 아니라, 어디가 신축 공급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서울 전체 재개발 구역의 현황을 보면 이 흐름은 더욱 명확하다. 총 207개의 재개발 구역이 존재하지만, 이미 완공된 곳이 97곳, 존치정비로 분류된 곳이 3곳이다. 공급 후보군으로 분류될 107개의 추진 구역 중 실제 착공에 들어간 곳은 13곳에 불과하다. 즉, 207개 중 13곳만이 공급으로 이어지는 실질 구역, 나머지는 모두 장기적 기대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숫자는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 공급은 거의 없다는 구조가 시장의 인식을 형성하는 핵심 배경이다.

서울시 재정비촉진구역 단계별 현황(그래픽=도시와경제)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이 공식화된 단계지만, 여전히 입주 시점은 불확실하다.시공사 계약, 공사비 조율, 설계 보완, 인허가 절차, 이주·철거 속도 등 수많은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시장 입장에서는 사업은 진행되지만 공급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구간으로 인식된다. 이런 단계에서는 기대 가치는 반영되지만, 완전한 미래 공급 신뢰도가 형성되지는 않는다.
반면 관리처분인가는 공급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다.세대 배치·분담금·이주 일정 등이 모두 확정되며, 통상 3~4년 후 입주가 가능하다. 그래서 시장은 이 단계를 눈에 보이는 공급으로 평가하며 가격을 선반영한다. 문제는 이 단계의 구역이 서울 전체에서 24곳뿐이라는 것이다. 즉, 207개 중 24곳만이 현실적인 공급 후보군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장기간 대기 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러한 공급 비대칭 구조와 입주절벽이 겹치면서 서울 재개발 시장은 단순한 호재 기대가 아니라 구조적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 새 아파트는 줄어드는데, 재개발은 속도가 느리고, 사업단계는 긴 시간을 요구하며,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사업지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 구조는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재개발을 시간을 사는 투자가 아니라 미래 신축을 확보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결국 서울 재개발 시장의 핵심은 ‘재개발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실질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개발’이냐이다. 이 기준이 향후 10년 서울의 주거 구조, 가격 흐름, 투자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시장은 이미 이 변화를 읽고 움직이고 있으며, 앞으로는 단계별 사업 속도·현실성·입주 타임라인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사진=도시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