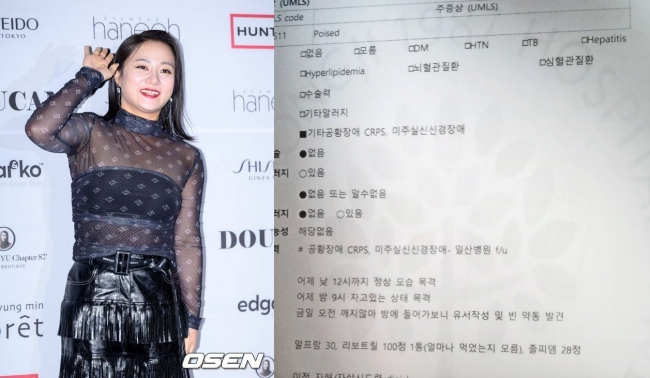서울 종로구 쪽방촌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기준 영등포 쪽방촌 일대 40여 개 건물에는 무려 503개의 쪽방이 들어차 있다. 현재 1.5~2평 남짓한 방 하나당 월 기준 20만~30만원 선으로 시세가 형성돼 있다.
쪽방촌 수익률의 비밀은 ‘방 쪼개기’에 있다. 전용 33㎡(약 10평) 남짓한 공간을 1.5~2평짜리 쪽방 5~6개로 쪼개 세를 놓을 경우, 월 수익은 120만원을 훌쩍 넘긴다.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의 연립·다세대 원룸(전용 33㎡ 이하, 보증금 1000만원 기준)의 평균 월세는 64만원, 가장 비싼 강남의 월세는 90만원을 기록했다. 강남 원룸보다 영등포 쪽방촌의 평당 수익률이 더 높은 기현상이 벌어지는 셈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기존 공공재개발 방식의 보상안으로는 짭짤한 깔세 수익을 누리던 토지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이유다.
정부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서울 핵심 입지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분상제 적용 제외’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15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에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게 되면 토지주들에게 돌아가는 개발 이익이 커져 깔세 수익을 상쇄할 유인이 생긴다.
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영등포 쪽방촌(약 1만㎡)은 최고 800% 용적률을 적용받아 2030년까지 총 797가구(임대 461가구, 분양 336가구) 규모의 초고층 주거 타운으로 탈바꿈한다.
영등포 쪽방촌은 현재 원주민 이주 대책은 물론 개발 방식도 구체화 한 단계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등포 쪽방촌은 초승달 모양의 지형을 살려 3개 블록으로 나뉘어 개발된다”며 “A1 블록은 LH가 맡아 기존 주민 재정착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짓고 S1 블록은 SH가 분양·임대 혼합 단지를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간 개발 성격이 짙은 맨 오른쪽 블록이다. 이곳은 기존 토지주들이 현금 청산 대신 땅으로 보상받는 ‘대토’ 방식을 통해 자체적으로 건물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높은 임대 수익을 놓기 싫어하는 소유주들에게 시공 이익을 직접 챙길 길을 터준 것이다.
이주 대책 역시 이미 영등포 고가 하부에 컨테이너형 임시 거주 시설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다만 서울 용산구 동자동과 대전역 쪽방촌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동자동(약 4만 7000㎡)은 영등포보다 규모가 크고 상가, 대형 건물, 교회가 혼재되어 있어 소유주 간 셈법이 훨씬 복잡하다. 이곳 토지주들 역시 높은 임대 수익 등을 이유로 공공 주도 개발에 반발하며 민간 개발을 요구하고 있어 주민 동의 단계에서 멈춰 서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등포 사례는 ‘수익성’이라는 토지주의 핵심 니즈를 분상제 해제로 풀어낸 성공 모델”이라며 “이 모델을 바탕으로 다른 쪽방촌 정비 사업의 엉킨 실타래도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