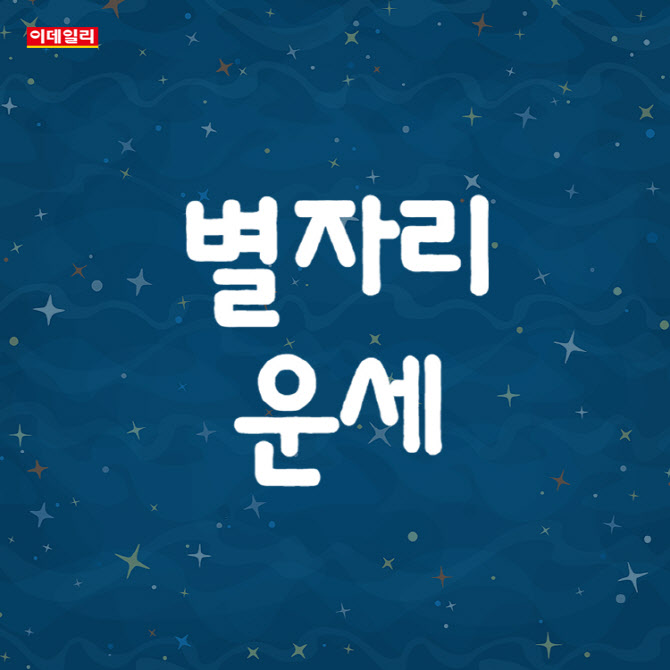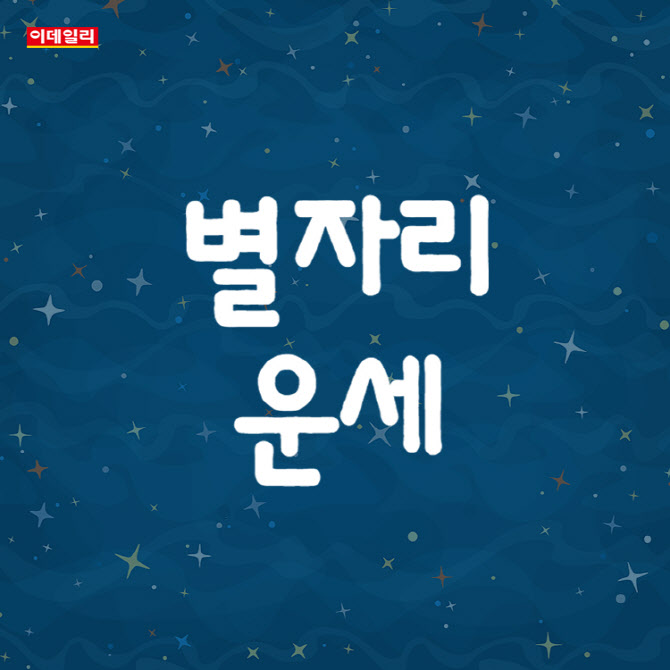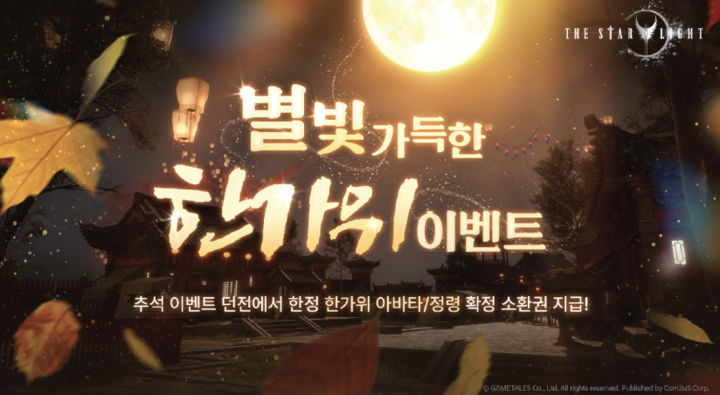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 마련된 현장상황실을 찾아 신속 복구를 위한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이번 화재 사고로 전소된 공무원용 클라우드 스토리지(저장장치) 시스템 ‘G드라이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내부 업무시스템 등급 기준상 ‘다’급 시스템에 해당돼 외부 백업이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이 내부 기준에 따르면 정부의 핵심 업무시스템(‘가’급)은 실시간 동기 복제 방식의 백업이 필수이며, 그보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시스템(‘나’급)은 정해진 시간·날짜 단위로 복제하는 준실시간 비동기 복제 방식의 백업을 한다. 이러한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 백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통적인 하드디스크(HDD)보다 입출력이 훨씬 빠른 고속저장장치(SSD)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G드라이브와 같은 ‘다’급 시스템은 백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돼 성능과 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저렴한 HDD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것이 이번 화재 사고로 전소되며 자료 복구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저성능 스토리지 사용…‘백업’ 중요성 몰랐나
G드라이브는 쉽게 말해 공무원이 업무자료를 공유하는 온라인 저장소로, 행정안전부(행안부)가 2017년 도입했다. 중앙행정기관 48개 및 위원회 26개 등 총 74개 기관에서 국가공무원 19만1000여명이 쓰고 있다. 사용 용량은 올해 8월 기준 858테라바이트(TB), A4 종이 2조2308억장 분량에 달한다.
앞서 행안부는 1일 국정자원 화재 사태 관련 브리핑에서 국정자원 대전본원 5층 7-1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G드라이브가 전소됐다고 밝혔다. 같은 전산실에 있던 백업 스토리지마저 불에 탔고, G드라이브의 경우 대용량·저성능 스토리지라 외부 백업이 이뤄지지 않아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실제 저성능 스토리지만으로는 858TB에 이르는 방대한 데이터 용량을 다른 물리적 위치로 백업·이중화하기 어렵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백업에 수 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데다, 하루 수십~수백TB를 원격 센터로 전송하기 위한 회선 비용과 장비 이중화 부담 등을 감안하면 비효율적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가 백업의 중요성을 등한시하고 예산 확보와 시스템 고도화 등을 미뤄온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스토리지 전문가는 “백업이라는 게 먼저 사고가 터지지 않으면 중요성을 잘 모르는 보험 같은 것”이라며 “지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나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가 있었는데도 정부가 안일하게 여기고 백업 예산을 아낀 결과가 이번 사태”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조선시대에도 조선왕조실록은 철저히 복제·분산시켜놨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중요 시스템만 백업을 실시하는 접근법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백업의 가장 기본적인 ‘3-2-1’(3개 사본으로 2개 저장장치, 1개 외부 장소에 저장) 원칙은 시스템 중요도와 무관하게 일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화재 사태에서 G드라이브 외에 백업이 이뤄진 시스템 데이터는 무리 없이 복구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전체 정보시스템 중 60% 이상의 주요 시스템 데이터는 매일 온라인 방식으로 백업을 하며, 대다수의 시스템 데이터는 매 월말 오프라인 백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PC 말고 G드라이브 쓰라더니…인사처 직격탄
한편, G드라이브 전소에 따른 자료 소실 피해는 부처와 업무 유형마다 제각각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 결재·보고가 이뤄진 공문서는 G드라이브 외에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도 저장돼 있어 피해가 없지만, 공무원 개인 업무용 자료 등은 복구하기 어려워 당분간 업무 마비가 예상된다. 특히 2018년 행안부가 내린 ‘G드라이브 이용지침’에 따라 업무 자료를 개별 PC가 아닌 G드라이브에만 저장해온 인사혁신처는 급한 대로 PC·이메일·공문 등을 통해 업무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