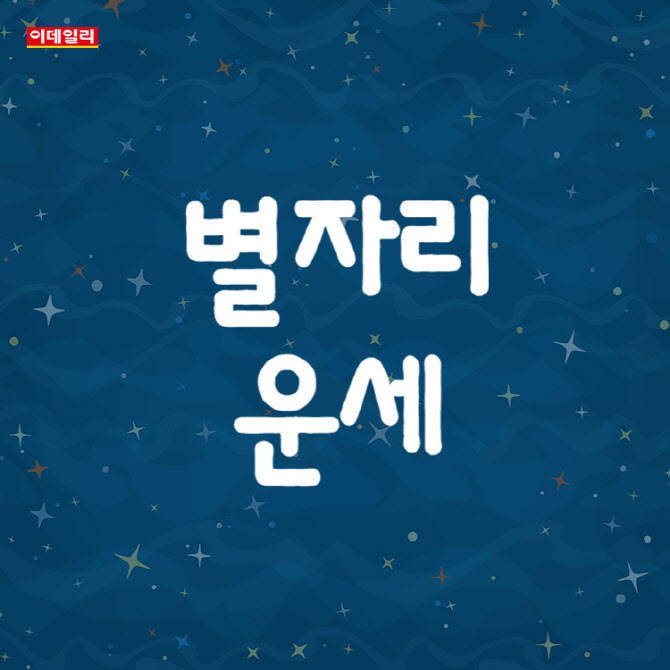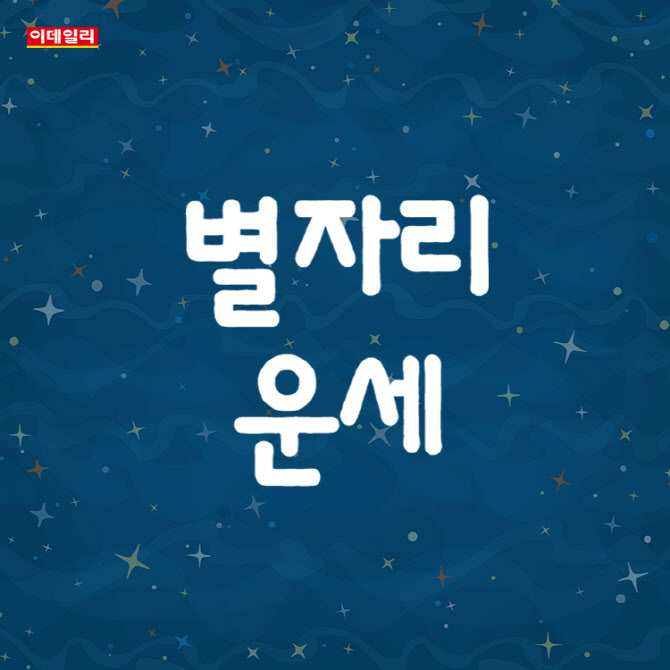[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반기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 공모를 두 차례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업계가 등을 돌린 배경에는 △공공 51%·민간 49%의 불리한 지분 구조 △공공 지분에 부여된 매수청구권 △국산 AI 반도체(NPU) 의무 도입 등 과도한 규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민간 지분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매수청구권을 삭제했으며, 국산 NPU 도입 의무도 철회하는 등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지난달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세 번째 공모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독소조항이 삭제돼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였다. 지난달 11일 사업설명회에는 삼성SDS 외에도 LG(003550) CNS, 현대오토에버(307950) 등 주요 IT서비스 기업을 비롯해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 네이버클라우드·KT클라우드·NHN클라우드·카카오엔터프라이즈·구글클라우드 코리아 등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등 200여 개 기업·기관 관계자가 몰려 업계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후 삼성SDS의 컨소시엄에 대기업들이 대거 참가하기로 결정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등을 돌리는 분위기로 반전됐다. SKT의 경우에는 이미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파운데이션 모델, GPU 임차 사업 등 국가에서 주도하는 AI 프로젝트에 참여 많이 하고 있어 AI 컴퓨팅센터까지 참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LG CNS와 NHN클라우드 등 나머지 기업들 역시 삼성SDS가 꾸린 ‘공룡 컨소시엄’ 보다 더 유력한 컨소시엄을 꾸려 선정될 가능성은 내부적으로 희박하다고 보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단독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또 정부가 독소조항을 완화했다고 해도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성을 미리 측정해볼 수 있는 데이터도 부족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AI컴퓨팅 센터를 활용하는 정부 사업 물량이 어느 정도 될 지 단기 계획이라도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세울 수 있는데 막연하게 수요가 충분하다는 정부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시뮬레이션이 잘못됐을 때 그 책임 주체는 누가 될지도 불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AI 컴퓨팅 센터의 유치를 원하는 지역 간 경쟁이 과열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오는 21일 입찰 마감 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개할지를 놓고 고심하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정기업이 거론되면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 몇군데가 지원했는지 정도만 공개하고 기업명은 공개가 안될 수 있다”라며 “기존에는 유찰 여부에 대해서도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공개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있어 지역명은 민감한 사안”이라며 “컨소시엄 매칭과 관련해서도 기업 간 경쟁이 과도하게 유도될 수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최선의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