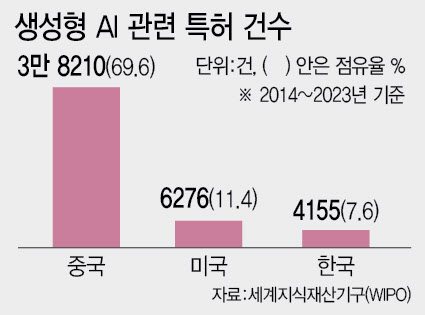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투자 격차는 더 크다. ‘AI Index 2024’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 AI 투자 규모는 672억2000만달러(약 100조원), 중국은 77억6000만달러(약 11조원)로 집계됐다. 한국은 13억9000만달러(약 2조원) 수준으로, 절대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자본의 열세는 곧 인프라 격차로 이어진다. 국내 스타트업과 대학은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가 쉽지 않아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 자체가 제약을 받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의 김성훈 대표도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컨소시엄에 선정돼 GPU 500장을 확보한 뒤에야 본격 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거대 모델을 바닥부터 만드는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 방식만 고집할 경우, 한정된 자원으로는 속도전에서 승산이 낮다는 얘기다.
이런 현실에서 오픈소스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표준 모델을 바탕으로 한국의 특화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방식은 개발 기간을 줄이고 비용 효율을 높일 수 있어서다. 정부가 약 20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역시 이 같은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업체가 해외 오픈소스를 활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지만, 활용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활용의 범위와 방식, 통제 역량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오픈소스 활용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전 세계 대부분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모델을 만든다”면서도 “국가 차원에서 쓸 때는 가중치 등을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소스를 쓰더라도 핵심 요소를 얼마나 이해하고 수정·대응할 수 있느냐가 기술 주권의 관건이라는 뜻이다.
업계에서는 개방형 생태계를 활용해 ‘한국형 소버린 AI’의 실질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허깅페이스 등에 공개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빠르게 글로벌 수준의 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모델을 다시 공개해 해외가 활용하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기술력을 입증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