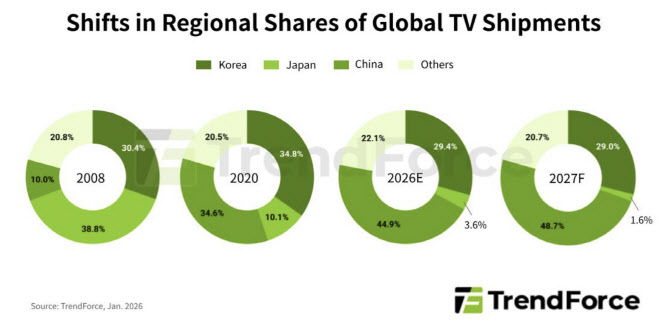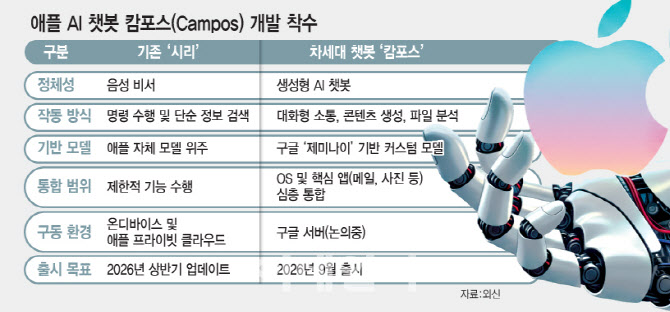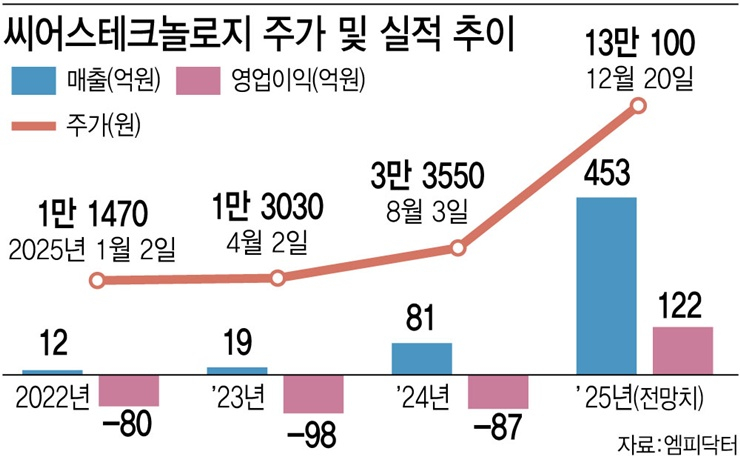챗GPT 생성이미지
문제는 규제의 강도보다 불확실성이다. 규제 수위는 낮다고 설명하지만,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몸을 사리게 된다. 혁신 산업에서 불확실성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규제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규제’를 내걸 만큼 AI 산업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했는지도 의문이다. 미국은 규제보다 속도와 경쟁을 택했고, 중국 역시 공격적인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AI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규제 선도국의 길을 먼저 택한 선택이 적절했는지는 따져볼 대목이다.
‘AI 글로벌 3강’을 목표로 내세운 상황에서, 아직 기술·산업 측면에서 충분한 기반을 다지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를 앞세운 접근은 자칫 국내 기술 생태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산업이 성장하기도 전에 제도가 앞서가는 구조가 된 셈이다.
정부 역시 이런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 부담과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전면 시행을 강행한 배경에는 시민단체와 국회의 압박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공은 던져졌다. 되돌리기 어렵다면 남은 과제는 하나다. AI 기본법이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찾는 것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단계적 적용, 현장 의견을 반영한 유연한 해석 없이는 이 법은 혁신의 기반이 아니라 족쇄로 남을 수 있다.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AI 산업에 제도라는 가지치기가 너무 이른 건 아닌지, 시행 첫날부터 되묻게 된다. AI 기본법이 ‘세계 최초 규제’가 아니라 ‘지혜로운 연착륙 사례’로 남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가 진짜 시험대다.